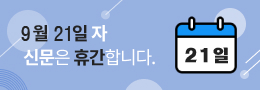[ м—°м§ҖлҸҷнҳңм°Ҫ ]
'мһҠнһҗ к¶ҢлҰ¬(Right to be Forgotten)'к°Җ мөңк·ј мЈјмҡ” мқҙмҠҲлЎң л– мҳӨлҘҙкі мһҲмҠөлӢҲлӢӨ. 2012л…„ 4мӣ” 18мқјмһҗ ліёліҙ(2846нҳё) лҚ°мҠӨнҒ¬ м°Ҫм—җм„ң м ңк°Җ 'мһҠнҳҖм§Ҳ к¶ҢлҰ¬'лқјкі н‘ңкё°н•ҳл©° м“ҙ м№јлҹјмқҙ мһҲм—ҲлҠ”лҚ°пјҢ мөңк·ј 'мһҠнһҲлӢӨ'лҠ” н”јлҸҷмӮ¬мқҙкё° л•Ңл¬ём—җ м—¬кё°м—җ лҳҗ н”јлҸҷмқҳ лң»мқ„ лӮҳнғҖлӮҙлҠ” м ‘мҡ”мӮ¬ '~м–ҙм§Җ~'лҘј л¶ҷмқҙлҠ” кІғмқҖ м–ҙлІ•м—җ л§һм§Җ м•ҠлӢӨ н•ҳм—¬ 'мһҠнһҗ к¶ҢлҰ¬'лЎң н‘ңкё°лҘј нҶөмқјн–ҲлӢӨкі н•©лӢҲлӢӨ.
мһҠнһҗ к¶ҢлҰ¬лһҖ мқён„°л„· мӮ¬мқҙнҠёмҷҖ SNS л“ұм—җ мҳ¬лқјмҷҖ мһҲлҠ” мһҗмӢ кіј кҙҖл Ёлҗң к°Ғмў… м •ліҙмқҳ мӮӯм ңлҘј мҡ”кө¬н• мҲҳ мһҲлҠ” к¶ҢлҰ¬лҘј л§җн•©лӢҲлӢӨ. ліҙлҸ„лҗң мӢңм җмқҙ мҳӨлһҳлҗң мқҙлҘёл°” 'л¬өмқҖ кё°мӮ¬'к°Җ мқён„°л„·м—җм„ң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нҚјлӮҳлҘҙкё°'лҗҳл©ҙм„ң лҸ…мһҗмқҳ кҙҖмӢ¬кіј кё°м–ө мҶҚм—җм„ң мһҗм—°мҠӨлҹҪкІҢ мһҠнҳҖм ё к°ҖлҚҳ кё°мӮ¬к°Җ мӮ¬лқјм§Җм§Җ м•Ҡкі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мң нҶөлҗҳкі мһҲмҠөлӢҲлӢӨ. мҳҲлҘј л“Өл©ҙ кө°м—җм„ң м•„л“Өмқҙ мһҗмӮҙн–ҲлҠ”лҚ°пјҢ мӢ л¬ём—җ 'кө° мқҳл¬ёмӮ¬ мқҳнҳ№'м ңн•ҳмқҳ кё°мӮ¬к°Җ мӢӨл ёмҠөлӢҲлӢӨ. м•„л“Ө мқҙлҰ„мқҙ мқөлӘ…мқҙм§Җл§Ң кё°мӮ¬лҘј ліј л•Ңл§ҲлӢӨ л¶ҖлӘЁлҠ” м•„н”Ҳ кё°м–өмқҙ лҗҳмӮҙм•„лӮңлӢӨл©° кё°мӮ¬ мӮӯм ңлҘј мҡ”мІӯн•©лӢҲлӢӨ.
к·ёлҹ°к°Җ н•ҳл©ҙ н•ң м—°мҳҲмқёмқҖ кіјкұ° м ҠмқҖ мӢңм Ҳ л¶ҲлҜёмҠӨлҹ° мқјлЎң кө¬мҶҚлҗң л°” мһҲлҠ”лҚ° мқҙм ң мҲҳмӢӯл…„мқҙ нқҳлҹ¬ "к°Җм •мқ„ мқҙлЈЁкі мҶҗмһҗлҘј ліј лӮҳмқҙк°Җ лҗҗлҠ”лҚ° м—¬м „нһҲ мЈјнҷҚкёҖм”ЁлЎң лӮЁм•„мһҲлӢӨ"л©° мӮӯм ңлҘј мҡ”мІӯн•ҳкё°лҸ„ н•ңлӢӨкі н•©лӢҲлӢӨ.
мқҙм—җ лҢҖн•ҙ м–ёлЎ кі„лҠ” мӮ¬мӢӨ ліҙлҸ„лЎң л¬ём ңк°Җ м—ҶлҠ” кІҪмҡ°пјҢ кё°мӮ¬нҷ”лҗң м§Җ мҳӨлһң мӢңк°„мқҙ нқҳл ҖлӢӨкі н•ҙм„ң кҙҖл Ёмһҗ мҡ”кө¬лҢҖлЎң л¬ҙмЎ°кұҙ кё°мӮ¬лҘј мӮӯм ңн• мҲҳ м—ҶлӢӨлҠ” мһ…мһҘмһ…лӢҲлӢӨ. к·ёлҹ¬лӮҳ м—¬кё°м—җ л”ңл Ҳл§Ҳк°Җ мһҲмҠөлӢҲлӢӨ. м–ёлЎ кі мң мқҳ м—ӯн• мқё мӮ¬нҡҢк°җмӢң비нҢҗкё°лҠҘкіј к°ңмқёмқҳ н”„лқјмқҙлІ„мӢң мҡ”кө¬к°Җ 충лҸҢн•ҳкё° л•Ңл¬ёмһ…лӢҲлӢӨ.
л°©мҶЎнҶөмӢ мң„мӣҗнҡҢк°Җ м§ҖлӮңлӢ¬ 25мқј мһҗкё° кІҢмӢңл¬јпјҢ мҰү мһҗмӢ мқҙ мқён„°л„·м—җ мҳ¬лҰ° кёҖмқҙлӮҳ лҸҷмҳҒмғҒмқҖ ліёмқёмқҙ мҡ”мІӯн• кІҪмҡ° мӮ¬мӢӨмғҒ мӮӯм ңн• мҲҳ мһҲлӢӨлҠ” мӢңм•Ҳмқ„ лӮҙлҶЁмҠөлӢҲлӢӨ. 'кіөмқө'м—җ мң„л°ҳлҗҳм§Җ м•ҠлҠ” н•ң кІҢмӢңл¬ј кҙҖлҰ¬мһҗлӮҳ кІҖмғүмӮ¬м—…мһҗлҠ” к·ё мҡ”мІӯм—җ л”°лқјмЈјлҠ” мқјмў…мқҳ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қ„ м ңмӢңн•ң кІғмһ…лӢҲлӢӨ.
к·ёлҹ¬лӮҳ мӮ¬мӢӨ н•өмӢ¬мқ„ 비мјңк°”лӢӨлҠ” м§Җм Ғмқҳ мҶҢлҰ¬к°Җ лҶ’мҠөлӢҲлӢӨ. м •мһ‘ лҢҖмӨ‘мқҳ кҙҖмӢ¬мқҖ мқҙлІҲ мӢңм•Ҳм—җм„ лӢӨлЈЁм§Җ м•ҠмқҖ 'мһҗкё° кІҢмӢңл¬ј'мқҙ м•„лӢҢ 'м ңмӮјмһҗк°Җ мһҗмӢ мқ„ м–ёкёүн•ң кІҢмӢңл¬ј'мһ…лӢҲлӢӨ. мӮ¬мғқнҷңмқ„ м№Ён•ҙн•ҳлҠ” кІҢмӢңл¬јмқҖ мӮ¬мӢӨ м ңмӮјмһҗ кІҢмӢңл¬јмқё кІҪмҡ°к°Җ лҢҖл¶Җ분мқҙкё° л•Ңл¬ёмқҙмЈ . м—¬кё°м—җ лҚ” м–ҙл Өмҡҙ л¬ём ңлҠ” мӮӯм ңлҘј кұ°л¶Җн• мҲҳ мһҲлҠ” 'кіөмқөмқҳ нҢҗлӢЁ кё°мӨҖкіј лІ•м Ғ к·јкұ°'лҘј м–ҙл–»кІҢ л§Ҳл Ён•ҳлҠҗлғҗлҠ” кІғмһ…лӢҲлӢӨ.
17м„ёкё° лҜёкөӯ мӢқлҜј мӢңлҢҖ л¶Ғл¶Җ лүҙмһүкёҖлһңл“ңлҘј л°°кІҪмңјлЎң н•ң лӮҳлӢӨлӢҲм—ҳ нҳёмҶҗмқҳ мһҘнҺёмҶҢм„ӨпјҢ мЈјнҷҚкёҖм”Ё. мң л¶Җл…Җ н—ӨмҠӨн„° н”„лҰ°кіј л§Ҳмқ„мқҳ мІӯл…„ лӘ©мӮ¬ л”ӨмҰҲлҚ°мқј мӮ¬мқҙм—җ м•„мқҙк°Җ нғңм–ҙлӮҳл©ҙм„ң мқҙ л§Ҳмқ„мқҖ мҲ л Ғкұ°лҰ¬кё° мӢңмһ‘н•©лӢҲлӢӨ. лӮЁнҺёмқҙ м—ҶлҠ” к°ҖмҡҙлҚ° м—¬мқёмқҙ мһ„мӢ н•ҳм—¬ м¶ңмӮ°мқ„ н–ҲмңјлӢҲ м—„кІ©н•ң мІӯкөҗлҸ„ кі„мңЁмқҙ м§Җл°°н•ҳлҚҳ мӢңлҢҖм—җ к·ёл…ҖлҠ” лҒ”м°Қн•ң нҳ•лІҢмқ„ л°ӣм•„м•ј н–ҲмҠөлӢҲлӢӨ.
к°ҖмҠҙм—җ к°„нҶө(Adultery)мқҳ лЁёлҰҝкёҖмһҗ 'A'лҘј мҲҳлҶ“мқҖ мЈјнҷҚмғү лӮҷмқёмқ„ лӢ¬кі мӮҙм•„м•ј н–ҲлҚҳ кІғмқҙмЈ . к·ёлҹ¬лӮҳ к·ёл…ҖлҠ” лҒқлӮҙ мғҒлҢҖк°Җ лҲ„кө¬мҳҖлҠ”м§Җ л°қнһҲм§Җ м•Ҡм•ҳмҠөлӢҲлӢӨ. к·ёл…ҖлҠ” лӮҳлЁём§Җ мӮ¶мқ„ мқҙмӣғм—җ лҢҖн•ң лҙүмӮ¬мҷҖпјҢ мҶҚмЈ„лҘј нҶөн•ҙ м–»мқҖ н–үліөк°җ мҶҚм—җм„ң мғқм• лҘј л§Ҳм№ҳлҠ” л°ҳл©ҙпјҢ нҡҢк°ңн•ҳкі кі л°ұн• кё°нҡҢлҘј лҶ“м№ң л”ӨмҰҲлҚ°мқјмқҖ м–‘мӢ¬мқҳ к°Җмұ…м—җ мӢңлӢ¬лҰ¬лӢӨ мҮ м•Ҫн•ҙм ё мЈҪкі л§ҷлӢҲлӢӨ.
к°ҖмҠҙм—җ мЈјнҷҚкёҖм”ЁлҘј лӢ¬кі мӮҙм•„лҸ„ мҶҚмЈ„лҘј нҶөн•ҙ мғҲлЎңмҡҙ мӮ¶мқ„ мӮ° м—¬мқёкіј мЈјнҷҚкёҖм”ЁлҠ” лӘём—җ мҲЁкІјм§Җл§Ң м—„мІӯлӮң м–‘мӢ¬мқҳ к°Җмұ…мңјлЎң мҠӨмҠӨлЎң нҢҢл©ён•ҳкі л§Ң м ҠмқҖ м„ұм§Ғмһҗмқҳ мӮ¶мқ„ л°”лқјліҙл©° мһҠнһҗ к¶ҢлҰ¬м—җ лҢҖн•ң л…јмҹҒм—җ м•һм„ң н•ҳлӮҳлӢҳ м•һм—җ(Coram Deo) мҳЁм „н•ҳкІҢ мӮ¬лҠ” кІғмқҙ нӣЁм”¬ лҚ” мӨ‘мҡ”н•Ёмқ„ к№ЁлӢ«кІҢ лҗ©лӢ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