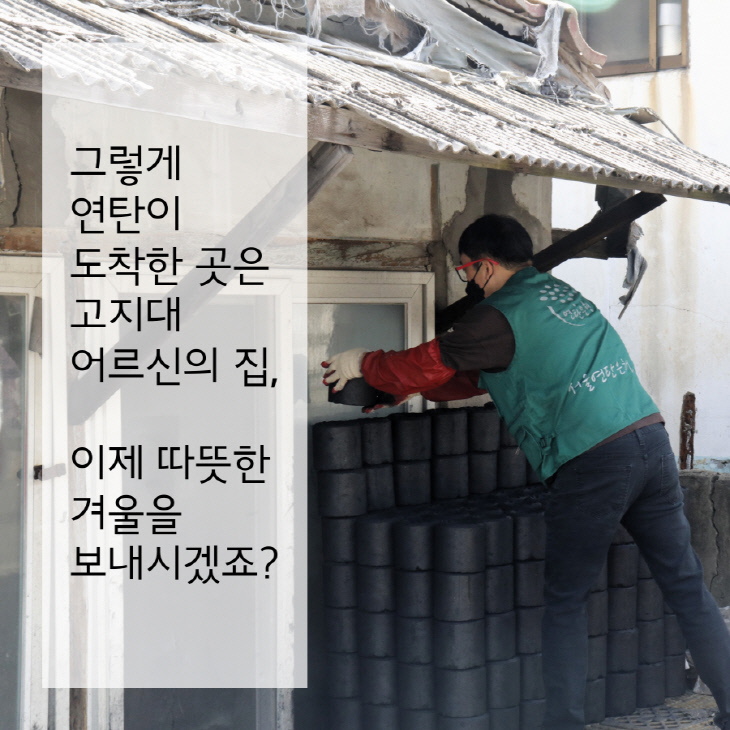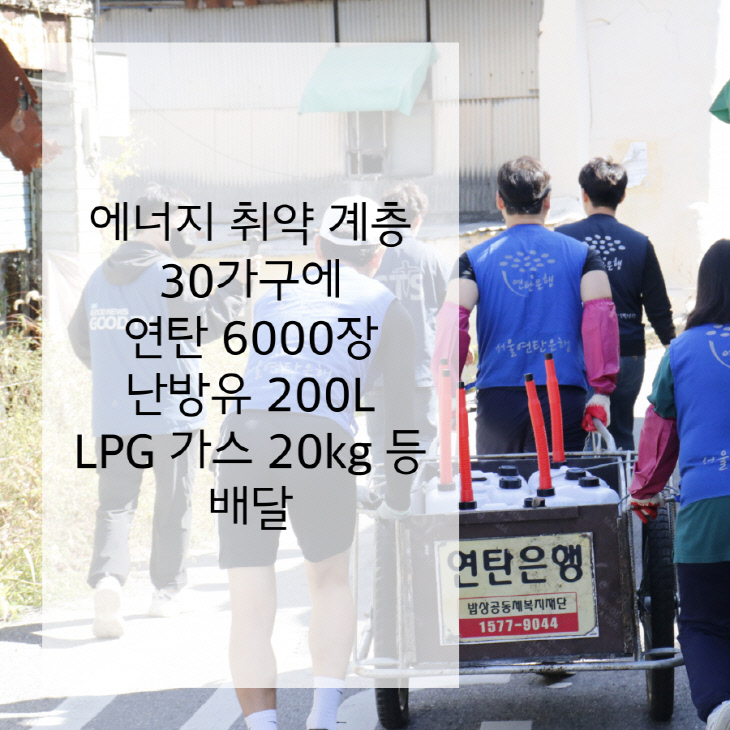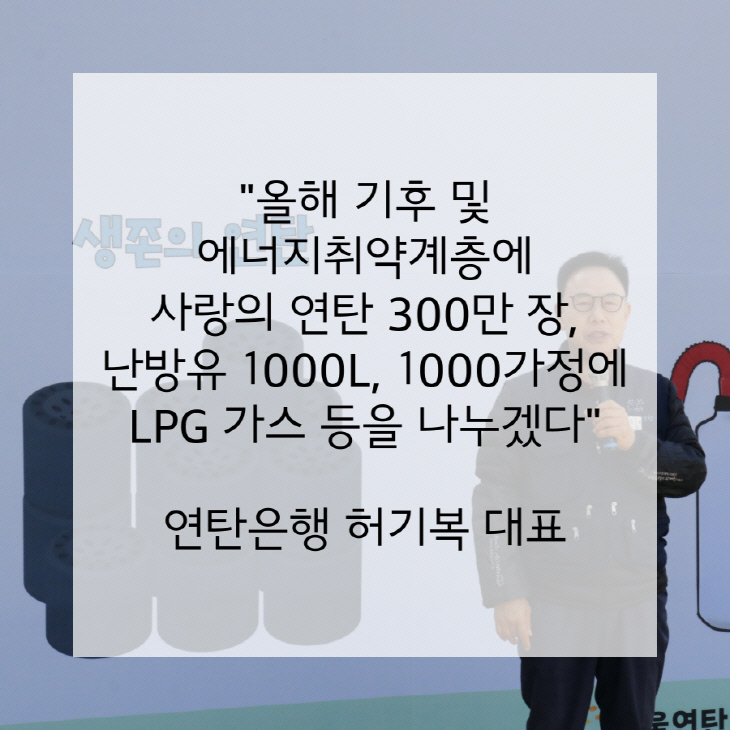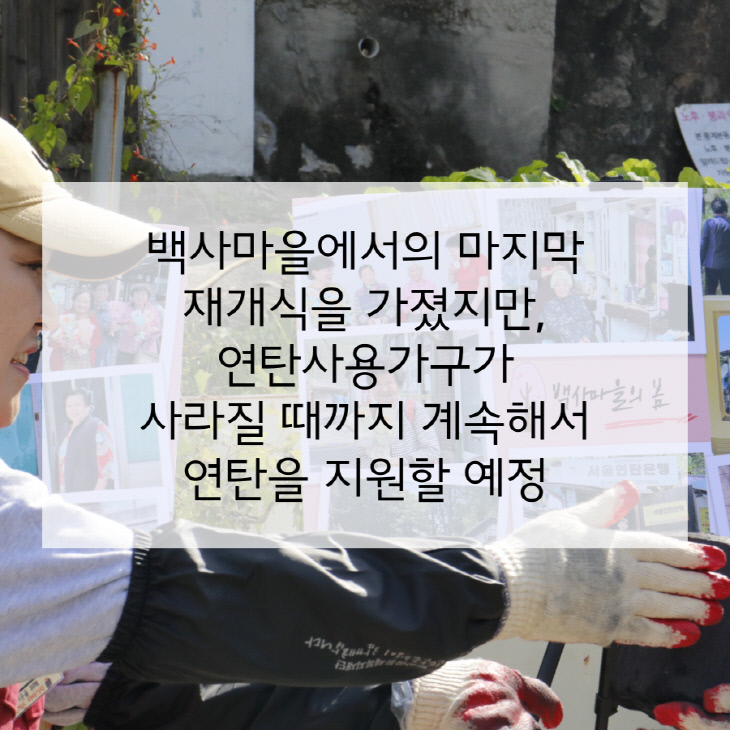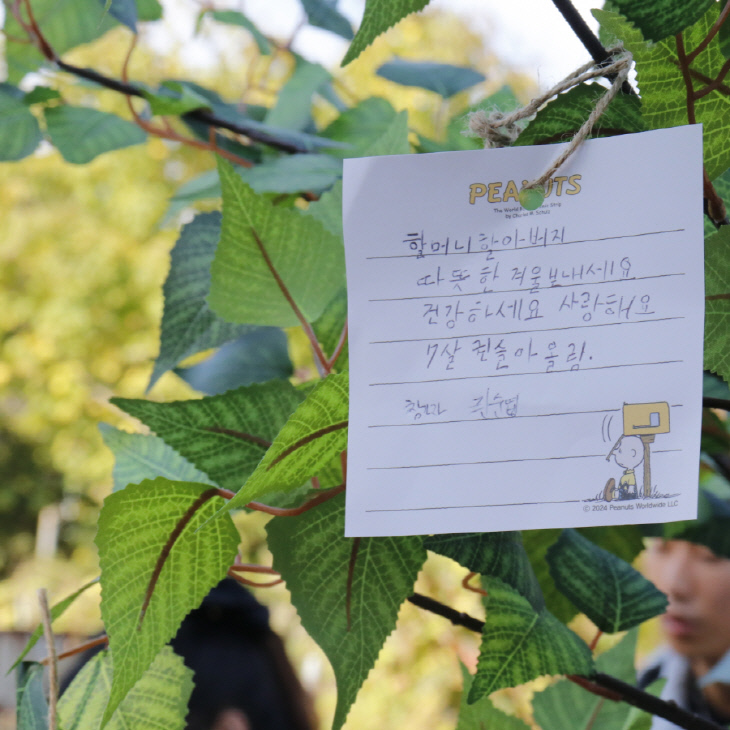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기고 ] 흔적과 여운
최동순교수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7월 09일(월) 16:46
독자투고
언젠가 목회를 하는 동생으로부터 CD 한 장을 받았다. 신학대학 입학 30주년을 맞아 동기들이 은사님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면서 기념음반을 낸 것이다. 찬양음반이 너무도 흔한데다 아마추어들의 노래를 수록했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별 기대감 없이 CD플레이어에 얹었다.
몇 곡이 지나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들어도 틀림없이 그 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가? 동생의 노랫소리는 영락없는 내 소리인 것이다. 같이 듣고 있던 아내도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똑같으냐며 놀라워한다. 평소에는 형제니까 닮았으려니 했지만 기계에서 울려나오는 노랫소리를 듣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음악 교사인 아내는 동생이 노래를 잘 한다며 듣기에 아주 편하단다. 음악적으로 평가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내가 들어도 그냥 편하다. 곡의 흐름이 아주 평범하고 편안하다. 그런데 한 소절,두 소절이 지나가면서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 와도 /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다.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자세와 결연한 다짐이 가슴을 울린다. 어느새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아내가 눈치 챌까 봐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딴 청을 부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둥 같은 울림이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친구들아,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자구나 / 향기나 흔적 따위 남기려 하지 말자 / 어차피 우리 산만큼 역사의 여운이 남을 테니까"
간주 중에 흘러나오는 동생의 내레이션에 난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짧지만 너무도 강력한 임팩트가 나를 뒤흔든다.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자니. 난 아직도 어릴 적 회상을 하며 그저 성에 안 차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영성을 지닌 목사가 되어 있구나. 순간 미안하고 부끄러워 스스로 민망하다. 이어지는 호소는 더 구체적이다. “향기나 흔적 따위 남기려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산만큼 역사의 여운이 남을 테니까.” 감동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결국 삶은 곧 죽음인 셈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의 삶이 아침이슬이나 안개와 같이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하지 않은가? 삶이 무한하다면 소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유한하기에 소중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의미 있게 살면 되는 것이다. 향기나 흔적은 후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향기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오죽하면'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름'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남길 수 없다.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이름을 남기려고 무리를 하다가 오히려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명망가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가슴을 울리는 내레이션이 끝나자 3절이 이어진다.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훔친다. 가난해도,병이 들어도,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결코 떠날 수 없다니. 동생이 아닌 성숙한 성직자가 어른거린다.
며칠 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동의를 구하고 음반을 틀었다. 순간 학생들은 나와 똑같은 목소리에 잠시 놀라더니 이내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다. 소감을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감동적이라 한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물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사실 대답은 필요치 않다. 나도,학생들도 실천하기에는 벅차지만 신선한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난다. 그리고,'흔적'과 '여운'의 차이를 생각한다.
최동순 / 대전동안교회 집사,전주비전대학 명예교수
언젠가 목회를 하는 동생으로부터 CD 한 장을 받았다. 신학대학 입학 30주년을 맞아 동기들이 은사님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면서 기념음반을 낸 것이다. 찬양음반이 너무도 흔한데다 아마추어들의 노래를 수록했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별 기대감 없이 CD플레이어에 얹었다.
몇 곡이 지나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들어도 틀림없이 그 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가? 동생의 노랫소리는 영락없는 내 소리인 것이다. 같이 듣고 있던 아내도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똑같으냐며 놀라워한다. 평소에는 형제니까 닮았으려니 했지만 기계에서 울려나오는 노랫소리를 듣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음악 교사인 아내는 동생이 노래를 잘 한다며 듣기에 아주 편하단다. 음악적으로 평가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내가 들어도 그냥 편하다. 곡의 흐름이 아주 평범하고 편안하다. 그런데 한 소절,두 소절이 지나가면서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 와도 /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다.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자세와 결연한 다짐이 가슴을 울린다. 어느새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아내가 눈치 챌까 봐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딴 청을 부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둥 같은 울림이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친구들아,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자구나 / 향기나 흔적 따위 남기려 하지 말자 / 어차피 우리 산만큼 역사의 여운이 남을 테니까"
간주 중에 흘러나오는 동생의 내레이션에 난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짧지만 너무도 강력한 임팩트가 나를 뒤흔든다.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자니. 난 아직도 어릴 적 회상을 하며 그저 성에 안 차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영성을 지닌 목사가 되어 있구나. 순간 미안하고 부끄러워 스스로 민망하다. 이어지는 호소는 더 구체적이다. “향기나 흔적 따위 남기려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산만큼 역사의 여운이 남을 테니까.” 감동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결국 삶은 곧 죽음인 셈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의 삶이 아침이슬이나 안개와 같이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하지 않은가? 삶이 무한하다면 소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유한하기에 소중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의미 있게 살면 되는 것이다. 향기나 흔적은 후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향기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오죽하면'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름'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남길 수 없다.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이름을 남기려고 무리를 하다가 오히려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명망가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가슴을 울리는 내레이션이 끝나자 3절이 이어진다.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훔친다. 가난해도,병이 들어도,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결코 떠날 수 없다니. 동생이 아닌 성숙한 성직자가 어른거린다.
며칠 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동의를 구하고 음반을 틀었다. 순간 학생들은 나와 똑같은 목소리에 잠시 놀라더니 이내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다. 소감을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감동적이라 한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물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사실 대답은 필요치 않다. 나도,학생들도 실천하기에는 벅차지만 신선한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난다. 그리고,'흔적'과 '여운'의 차이를 생각한다.
최동순 / 대전동안교회 집사,전주비전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