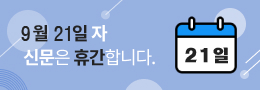[ 데스크창 ] 데스크칼럼
김훈 기자 hkim@kidokongbo.com
2005년 12월 20일(화) 00:00
밤새 내려 소복이 쌓인 눈과 대청마루 한켠에 색종이와 반짝이를 오려 붙여 만든 트리 장식, 그리고 대문 옆에 우두커니 서있는 눈사람. 성탄절 아침 함박눈 펑펑 내리던 들판을 지나 언 손 호호 불며 예배당에 갔던 기억들.
기상청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적이 많지 않았다는 발표를 보면 확실히 그 기억은 특별한 것임에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새삼 그 기억이 떠오른다. 동네마다 흔하디 흔한 소나무를 베어다 마당에 덩그렇게 세워 놓고 대청마루 위에는 종이로 오려 만든 장식과 색종이를 이어 만든 고리장식을 길게 늘어 뜨려 놓았었다. 거기에 한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글자 장식품은 좀 특별히 색칠도 하고 크게 만드느라 준비하는 데도 꽤 정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크리스마스트리가 완성되면 어린 가슴은 뛰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준비는 끝난 것이고 눈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니 그 눈길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달려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해야 맞다. 저녁부터 전구불을 끄고 산타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가실지 궁금해하며 뒤척이다가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 어스름에 눈을 번쩍 뜨고는 못으로 대충 박은 옷걸이에 걸어둔 양말부터 확인하곤 했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은 한참 성장해서도 계속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이브라도 되면 가만히 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혼자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가슴 뜀이 사라졌다. 장삿속으로 입는 흔해 빠진 산타복장에서도, 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럴에서도 좀처럼 가슴은 설레이지 않는다. 그저 덤덤한 일상의 연속은 감성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증거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리라.
매년 이맘때 쯤 먼지를 털고 장식을 하는 인조 크리스마스트리 세트를 올해는 꺼내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귀차니즘에 빠진 것도 있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탓도 있다. 다 커버린 아이들 중 누구도 트리 장식을 하자고 조르지도 않다보니 마루 한켠이 허전하다는 느낌도 잊고 지나게 된다.
5년 전만해도 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는데 아빠 엄마는 왜 선물을 받지못했냐며 꼬치꼬치 따지던 딸아이는 인터넷에 푹 빠져있고 군에서 막 제대한 아들은 제 방에서 삐끔이 얼굴만 비추고는 이내 문을 닫아버린다. 저 애들이 제 아이들에게 산타를 대신할 날이 올른지, 가슴 설레는 성탄절이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다.
기상청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적이 많지 않았다는 발표를 보면 확실히 그 기억은 특별한 것임에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새삼 그 기억이 떠오른다. 동네마다 흔하디 흔한 소나무를 베어다 마당에 덩그렇게 세워 놓고 대청마루 위에는 종이로 오려 만든 장식과 색종이를 이어 만든 고리장식을 길게 늘어 뜨려 놓았었다. 거기에 한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글자 장식품은 좀 특별히 색칠도 하고 크게 만드느라 준비하는 데도 꽤 정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크리스마스트리가 완성되면 어린 가슴은 뛰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준비는 끝난 것이고 눈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니 그 눈길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달려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해야 맞다. 저녁부터 전구불을 끄고 산타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가실지 궁금해하며 뒤척이다가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 어스름에 눈을 번쩍 뜨고는 못으로 대충 박은 옷걸이에 걸어둔 양말부터 확인하곤 했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은 한참 성장해서도 계속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이브라도 되면 가만히 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혼자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가슴 뜀이 사라졌다. 장삿속으로 입는 흔해 빠진 산타복장에서도, 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럴에서도 좀처럼 가슴은 설레이지 않는다. 그저 덤덤한 일상의 연속은 감성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증거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리라.
매년 이맘때 쯤 먼지를 털고 장식을 하는 인조 크리스마스트리 세트를 올해는 꺼내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귀차니즘에 빠진 것도 있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탓도 있다. 다 커버린 아이들 중 누구도 트리 장식을 하자고 조르지도 않다보니 마루 한켠이 허전하다는 느낌도 잊고 지나게 된다.
5년 전만해도 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는데 아빠 엄마는 왜 선물을 받지못했냐며 꼬치꼬치 따지던 딸아이는 인터넷에 푹 빠져있고 군에서 막 제대한 아들은 제 방에서 삐끔이 얼굴만 비추고는 이내 문을 닫아버린다. 저 애들이 제 아이들에게 산타를 대신할 날이 올른지, 가슴 설레는 성탄절이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