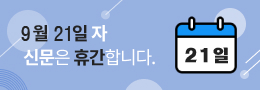[ 동인시선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7월 21일(목) 16:56
|
머뭇거리는 침묵
그녀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머리맡을 맴돌던 숫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키우던 사랑초는 꽃잎 흔들며 젖고 있는데
문을 열고 침대 하나 들어온다
직립을 휩쓸고 간 바람이 울대에 갇혀있는지
입을 열 때마다 쇳소리가 새어 나왔다
서로의 기척만을 어루만지는 숨결
어떤 말은 깊어 꺼내지 못해 침묵이 되는지
꺾인 모음 사이 촛농처럼 굳어갔다
필사적인 몸짓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어미가
꺼져가는 심지에 불씨를 돋우듯 눈을 뜬다
붉어지는 숨이 마주치는 순간
늦봄의 찔레꽃 같은 웃음이 둘 사이에 피어난다
말로써 하지 못할 말이 있어 침묵마저 머뭇거리는데
서로를 새겨 넣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혀끝에 머물던 혼잣말이 멈추고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한 호흡 한 호흡 삶의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가
아들의 눈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공중을 뚫고 따라가는 거친 쇳소리,
나는 그만 고깔모자를 떨어뜨렸다
김휼(본명:김형미/송정제일교회 부목사)
제8회 기독신춘문예 시 가작
그녀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머리맡을 맴돌던 숫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키우던 사랑초는 꽃잎 흔들며 젖고 있는데
문을 열고 침대 하나 들어온다
직립을 휩쓸고 간 바람이 울대에 갇혀있는지
입을 열 때마다 쇳소리가 새어 나왔다
서로의 기척만을 어루만지는 숨결
어떤 말은 깊어 꺼내지 못해 침묵이 되는지
꺾인 모음 사이 촛농처럼 굳어갔다
필사적인 몸짓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어미가
꺼져가는 심지에 불씨를 돋우듯 눈을 뜬다
붉어지는 숨이 마주치는 순간
늦봄의 찔레꽃 같은 웃음이 둘 사이에 피어난다
말로써 하지 못할 말이 있어 침묵마저 머뭇거리는데
서로를 새겨 넣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혀끝에 머물던 혼잣말이 멈추고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한 호흡 한 호흡 삶의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가
아들의 눈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공중을 뚫고 따라가는 거친 쇳소리,
나는 그만 고깔모자를 떨어뜨렸다
김휼(본명:김형미/송정제일교회 부목사)
제8회 기독신춘문예 시 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