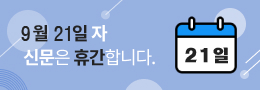[ 아름다운세상 ]
【전남 장성=정보미기자】 기차에서 내리자 풋풋한 봄 내음이 물씬 풍겨온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땅, 장성. 처음 디뎌보는 땅이 어디 이곳 뿐이겠냐만은 생경스러움보단 푸근함이 가슴 언저리에 맴돌았다.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평산리 한마음공동체. 우거진 나무 속에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는데, 전국에서 감 맛이 일품이라는 장성답게 들판에는 봄을 맞아 갓 싹을 틔우고 있는 감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가을에 올 것을 그랬다'는 아쉬움이 문득 밀려왔다. 필시 가을이 되면 노오란 홍시가 감나무 사이마다 매달려 서로 먹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터였다.
 |
||
| 자연에서 뛰놀며 흙집에서 유기농음식을 먹고 자라나는 한마음생태유치원 어린이들.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 /사진 정보미기자 | ||
마치 동화책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벽에 눈과 입 모양의 창이 나있고, 가운데 피노키오같은 삐죽한 코가 통나무로 달려 있었다. 얼마전까지 백운교회를 시무하던 남상도목사가 폐교 땅을 사들여 흙집 마을을 이룬 곳이다. 남 목사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폐끼치기 싫어 원로로 추대받기 1년 전, 목회 19년째에 사임하고 이곳으로 왔다.
"어서와요." 흙집들 사이로 황토 빛깔 옷을 입은 남상도목사가 환한 얼굴로 기자를 반갑게 맞았다. "시장할테니 점심 먼저 먹고 난 뒤에 작업합시다." 이 말이 "먼길 오느라 수고 했다"는 인사보다 더 정겹게 들렸다. 점심 식단에는 농약없이 유기농법으로 농사지은 쌀밥과 유기농 채소들이 푸짐하게 차려있다. 콩나물무침은 약을 뿌려 단시간 내에 급히 키운 일반 콩나물과 달리 아삭 씹히는 자연의 맛이 담겼고, 수년간 땅 속 기운을 받아온 묵은 김치에는 깊은 맛이 배어 있었다.
남 목사는 기자에게 황톳물이 담겨있는 바구니와 넓적한 붓 한자루 쥐어 주며 가리키는 벽을 덧칠하라고 했다. '쓱쓱' 황톳물을 붓에 찍어 흙집 표면에 덧발랐다.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흠 하나 없는 시멘트 벽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흙집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두 세번 씩 같은 곳을 마사지 하듯 어루만져 줘야 했다. 그래야 틈새가 일일이 막아졌다. 또한 황토벽 특성상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계속 덧칠해야 했다. 자연히 작업하는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기자가 처음 작업을 시행한 곳은 남 목사의 실험 장소였다. 지난 8년간 수 십 채의 흙집을 지었건만 아직도 실험할 것이 많단다. 이렇게 황토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벽에 칠한 다음 마른 뒤 물을 뿌려본다. "자연 소재만으로 집을 지어도 몇 백년의 세월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지요. 이미 증명된 것이라면 이러한 작업이 필요가 없지만 확인이 돼야 하니깐." 콘크리트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란다. 지은 흙집은 여태껏 한 채도 무너진 일이 없다고 했다.
간단한 실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투입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지난 3월 28일에는 흙집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었다. 보수작업에 나선 인부들과 함께 황톳물을 벽에 덧발랐다. 한번 해보았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붙었다. 1년에 한 두번 이렇게 바깥벽을 덧칠해주면 별다른 공사없이 튼튼한 흙집속에서 무탈히 지낼수가 있다고 한다.
 |
||
| 흙집 보수에 나선 한마음공동체 대표 남상도목사(뒤쪽)와 기독공보 정보미기자. | ||
작업에 열중하다 보니 잡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각종 스트레스와 머리를 짓누르던 고민들은 더이상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머리에 흐른 땀을 식혀주는 봄바람만 살랑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다. 흙집은 새 황톳물을 흡수하며 숨을 쉬고 있었다. 한마음공동체 사람들이 날마다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남상도목사가 공동체 마을의 강당으로 불러냈다. 보여줄게 있다고 했다. 각종 모임 장소로 쓰이는 이곳의 이름은 '춤추는 흙집'. 한마음공동체 마을에 있는 흙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강당 가운데에는 백송나무가 이 집을 떠받들고 있었다. 기다리기를 잠시, 눈 앞에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입 모양의 유리창 앞에 백색 스크린이 내려지자 화면에 고인이 된 오페라 가수 파바로티의 모습이 나타났다.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던 그의 음색이 '공주는 잠못 이루고'를 연주하고 있었다. 흙집에 울려퍼지는 오페라라, 상추 쌈 위에 치즈를 얹은듯한 엉뚱한 느낌마저 들었다.
"하루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난 뒤 이렇게 오페라를 들으면 온갖 피로가 싹 가셔요. 오페라의 'O'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흙집에서 듣는 음악이 가장 좋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듣기 시작했죠. 이제는 듣기만 해도 무슨 곡인지 누가 부르는지 거의 다 알 정도로 마니아가 됐어요." 사실 파바로티가 옥구슬에 굴러가는 듣한 음색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날 들은 목소리는 가히 몽환적이었다. 마음 속에 피어나는 카타르시스가 몸에 눅적돼 있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흙집의 또다른 묘미인 셈이다. 아궁이 불로 따뜻하게 덥혀진 흙집 바닥 또한 석유나 전기로 덥혀진 것과는 온기가 차원이 달랐다. 흙에서 온 우리들이 흙의 기운 속에서 다시금 회복을 얻는 것이다.
남상도목사는 꿈꾼다. 뒷 산에는 뽕나무를 가득 심어 누에로 실을 뽑아 실크옷을 만들고, 마을에는 백여 채의 황토집을 짓는 것. 유기농법을 넘어 퇴비없이 흙의 힘만으로 농사를 짓는 '자연예술농법'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것. 의식주 모두 자연 속에서 얻는 그 날이 속히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하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멋지게 살다 왔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는 남 목사.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한마음공동체 사람들. 그들은 말한다. 사는 것이 뭐 별거 있느냐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이야 말로 진짜 삶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