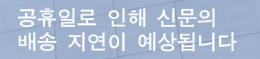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목양칼럼 ] 이진 목사1
이진 목사
2019년 03월 08일(금) 10:17
|
선교지에 도착한 해외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당연한 일, 현지 언어 배우기. 하지만 나는 농촌 목회 30년을 넘긴 지금에야 농촌 어르신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어쩌면 그 동안 욥의 친구들처럼 '목사의 언어'로 거의 독백을 해 온 것이다.
지난 2012년 이른 봄, 오랫 동안 벼르던 일을 저질러 버렸다. 교회 인근 2600㎡(800여 평)의 밭을 임대해 옥수수 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마을 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기로 작심했다.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은 힘든 농사일로 볕에 그을려가며 점점 '목사 때'를 벗는 필자를 매 주일 확인했고, 필자는 그 해가 다 가기 전 설교 시간에 모두가 경청하도록 하는 쾌거를 이뤘다. 분명 그 동안 언어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야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말씀이 육체(σαρξ)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
농사는 결국 보다 못한 어르신들이 가을 수확을 도와주셨고, 필자는 저녁에 태안 읍내 4천 원짜리 한식 뷔페집로 그들을 모셔가고 있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간 큰 아들 손주 일로 근심과 염려가 많은 75세 권사님, 선교비 보내느라 밭농사에 죽을 힘으로 몸을 던지다가 이석증을 앓게 됐는데, 마을 경로당에서 연일 시끄럽다고 투정이다. 삼대 며느리가 사는 집에서 구정물을 얻어 집 된장을 왼손으로 휘휘 풀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부엌칼 딱 삼 세 번씩 내리 꽂아야 낫는다고 말하신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토속말을 못 알아들어 자꾸 되물으며 껴들었더니, 모두들 한 마디씩 거들어 시끌벅적 토론장이 됐다. "먼저 칼을 꽂고 뿌리는 겨!" "어허이, 동서남북에 각각 세 번씩이여!"
필자가 "아이구, 그런 거라두 척척해서, 다들 펄펄 뛰게 해 드리면 좋을 건디. 지는 할 줄 모르니 어떡한대유?"라며 진심으로 말했더니, 다들 손사래 치며 위로해 주신다. "아, 원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유.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
나는 운전하다가 그만 울컥했다. 13년 만에! 이분들은 드디어 나를 허물없이 얘기할 이웃으로 여기게 되신 것 아닌가!
권사님이 벌써 주무시려 누우신 걸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고, 가사를 한 마디씩 여러 번 읽어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곤고한 생계형 농민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분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야 하는 우리는 본래 하루씩만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부엌칼이라도 삼 세 번씩 던져 꽂듯 간곡히 엎드려 아뢰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병든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11)"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마을에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며 오래토록 함께 사는 이웃이 되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도록 일러드리고 조금이나마 내가 그걸 살아 보여드릴 수밖에!
이진 목사 / 한마음교회
지난 2012년 이른 봄, 오랫 동안 벼르던 일을 저질러 버렸다. 교회 인근 2600㎡(800여 평)의 밭을 임대해 옥수수 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마을 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기로 작심했다.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은 힘든 농사일로 볕에 그을려가며 점점 '목사 때'를 벗는 필자를 매 주일 확인했고, 필자는 그 해가 다 가기 전 설교 시간에 모두가 경청하도록 하는 쾌거를 이뤘다. 분명 그 동안 언어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야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말씀이 육체(σαρξ)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
농사는 결국 보다 못한 어르신들이 가을 수확을 도와주셨고, 필자는 저녁에 태안 읍내 4천 원짜리 한식 뷔페집로 그들을 모셔가고 있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간 큰 아들 손주 일로 근심과 염려가 많은 75세 권사님, 선교비 보내느라 밭농사에 죽을 힘으로 몸을 던지다가 이석증을 앓게 됐는데, 마을 경로당에서 연일 시끄럽다고 투정이다. 삼대 며느리가 사는 집에서 구정물을 얻어 집 된장을 왼손으로 휘휘 풀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부엌칼 딱 삼 세 번씩 내리 꽂아야 낫는다고 말하신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토속말을 못 알아들어 자꾸 되물으며 껴들었더니, 모두들 한 마디씩 거들어 시끌벅적 토론장이 됐다. "먼저 칼을 꽂고 뿌리는 겨!" "어허이, 동서남북에 각각 세 번씩이여!"
필자가 "아이구, 그런 거라두 척척해서, 다들 펄펄 뛰게 해 드리면 좋을 건디. 지는 할 줄 모르니 어떡한대유?"라며 진심으로 말했더니, 다들 손사래 치며 위로해 주신다. "아, 원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유.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
나는 운전하다가 그만 울컥했다. 13년 만에! 이분들은 드디어 나를 허물없이 얘기할 이웃으로 여기게 되신 것 아닌가!
권사님이 벌써 주무시려 누우신 걸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고, 가사를 한 마디씩 여러 번 읽어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곤고한 생계형 농민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분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야 하는 우리는 본래 하루씩만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부엌칼이라도 삼 세 번씩 던져 꽂듯 간곡히 엎드려 아뢰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병든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11)"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마을에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며 오래토록 함께 사는 이웃이 되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도록 일러드리고 조금이나마 내가 그걸 살아 보여드릴 수밖에!
이진 목사 / 한마음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