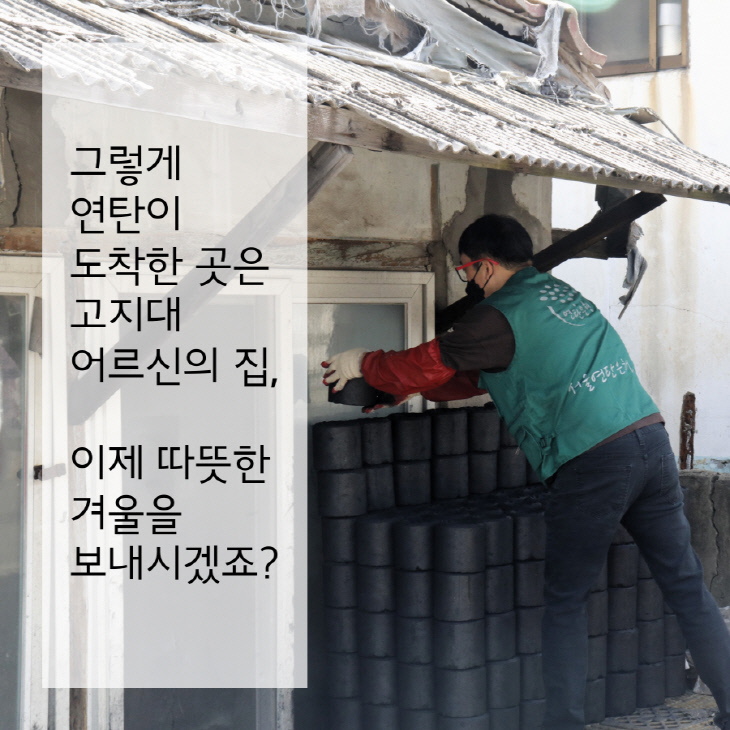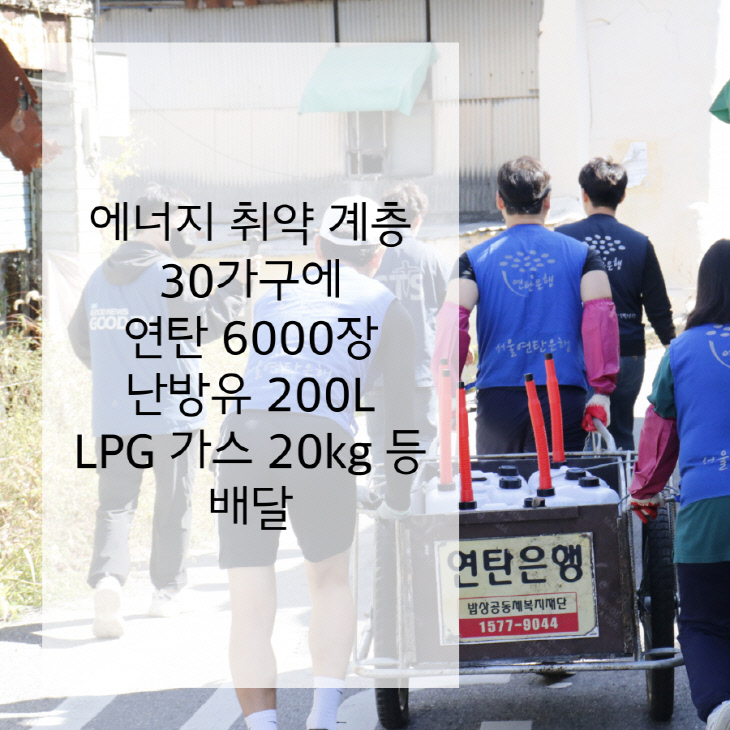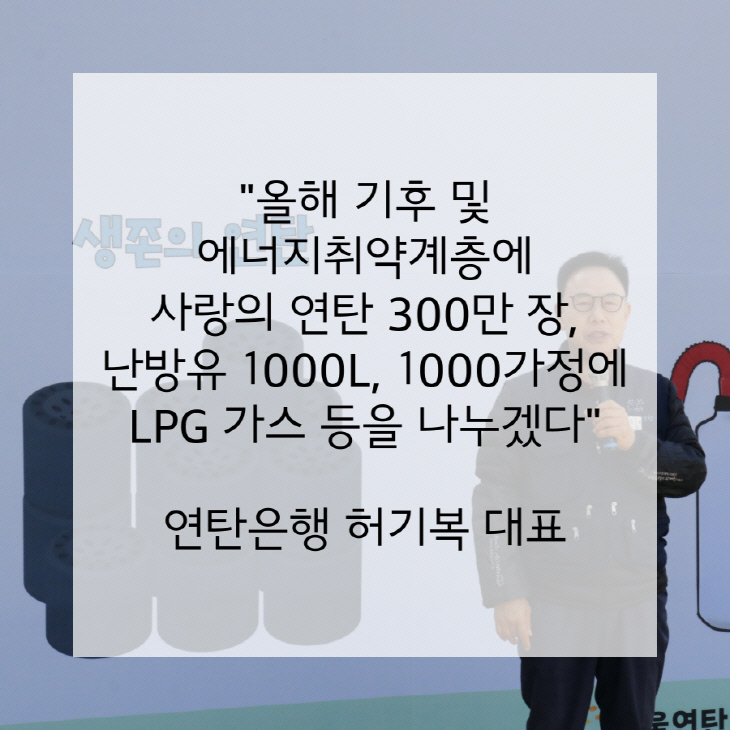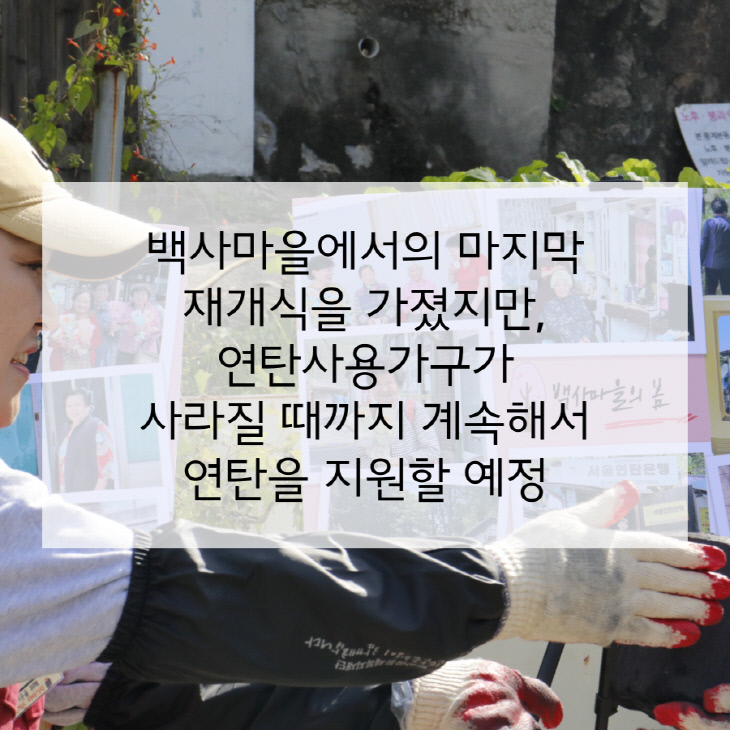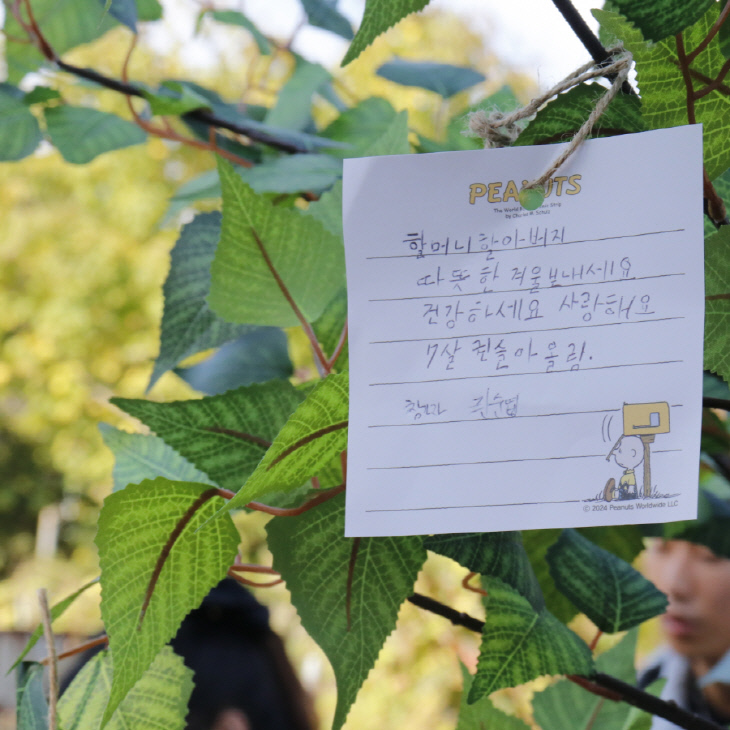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기고 ]
또 음주 측정을 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때에는 하루 저녁에 두 번 까지도 측정한 적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몇 번쯤 될까? 문을 연다. 내 입앞에 음주 측정기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힘껏 불어라 한다. 창문 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교회 차량입니다." 뒤편을 흘깃 처다 보고는 이렇게 정색하여 말한다. "예! 그래도 부세요." "아니,교회 차라니까요?" "예,교회 다녀도 술을 먹던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목사님도 부셔야 합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소곳이 자리 잡은 측정기 앞에 내 입술을 갖다 대고는 힘껏 분다. "예,가십시오."
속이 상한다. 목사라고 해도 안 믿어주니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 어쩌다 이 모양까지 갔나? 어쩌다가 목사의 신뢰지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나? 이 나라 그리스도인이 30% 정도가 된다는데.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나는 음주측정을 받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목사라면 그냥 보내 줄 만큼 신뢰의 사람이 안 된다는데 비애를 느낄 뿐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교회차량이군요. 그냥 가십시오" 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들만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만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저희들도 음주측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에 임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백범 김구 선생이 휘호로 즐겨 사용하셨다던 서산대사의 '답설야(踏雪野)'가 생각난다. 沓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부수호란행) 今日我行蹟(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누가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걸어갔던가? 누가 어찌하여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왜 그들은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길의 발자국을 어지럽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인가? 적어도 기독교의 지도자조차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 희망을 걸어도 장밋빛 미래가 있겠는가 말이다.
나는 목사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주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왜,이렇게 뒷맛이 씁쓸할까? 예절을 갖춘 구도자로서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 일거수 일투족,한 날과 그 날의 삶이 바로 눈 덮인 들판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가? 나는 만인의 목사이고 싶다. 만인의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바로 모든 목사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목사를 대표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눈밭에 길을 어지럽게 낼 수 있다 말인가? 나는 모든 목사를 대표하는 목사이고 싶다.
박정환목사 / 포항바다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