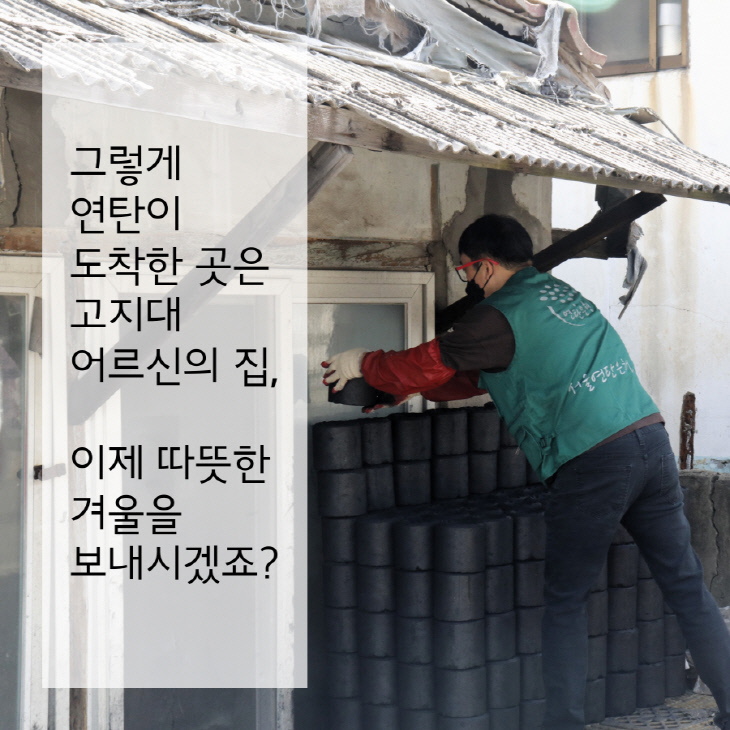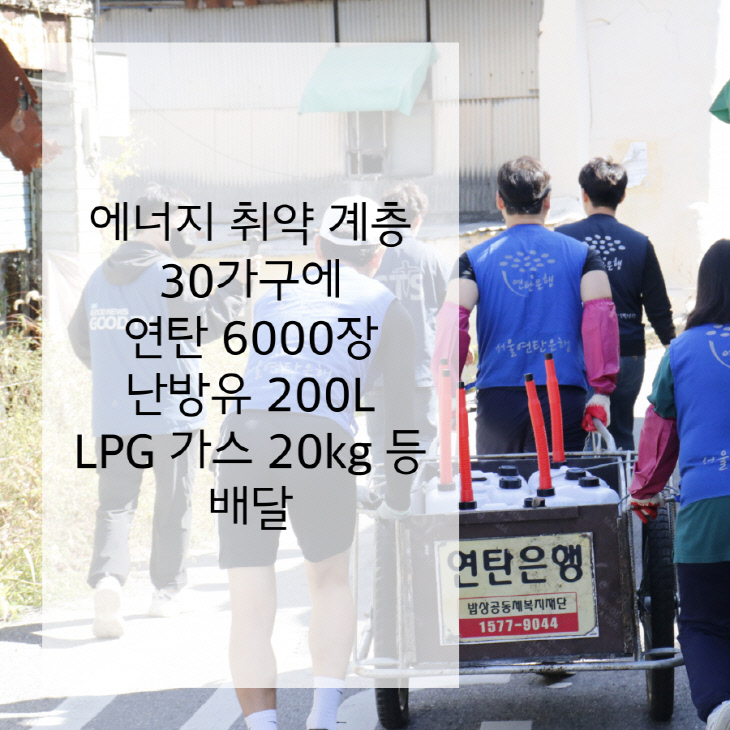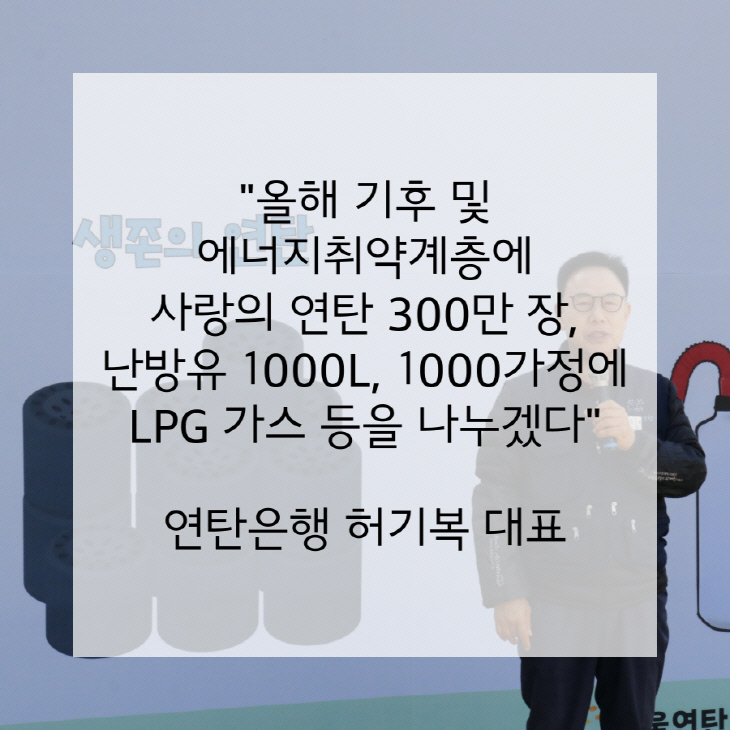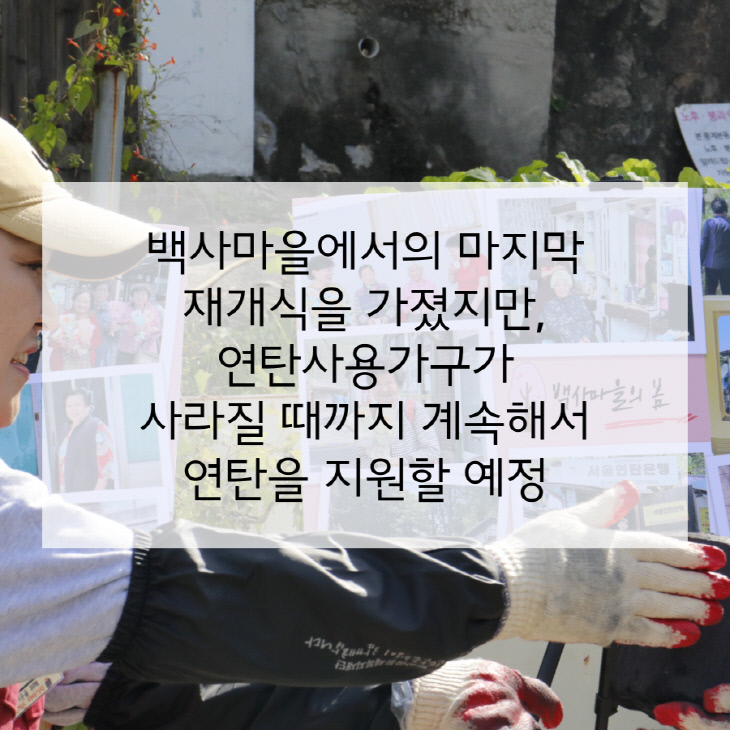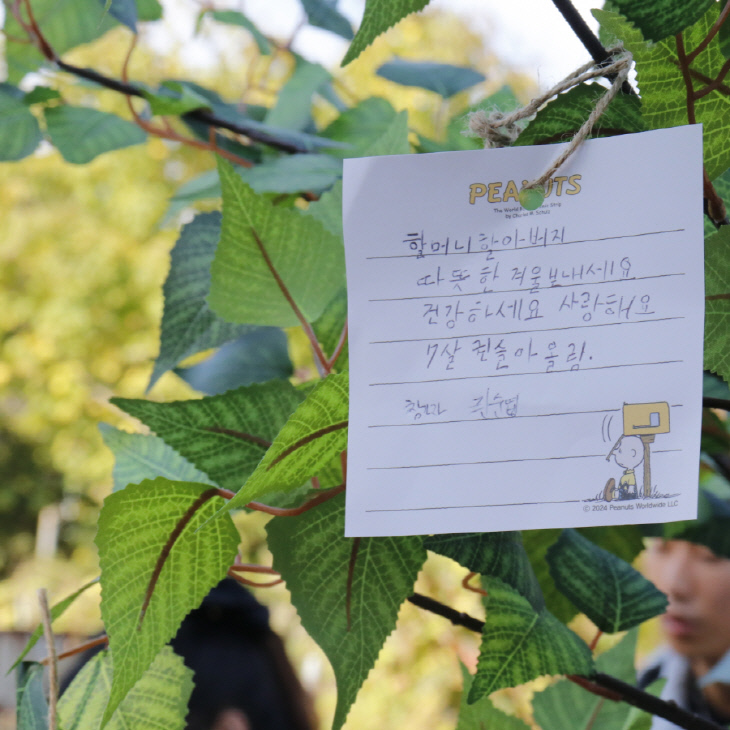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кё°кі ] - м„ңмҡёкё°лҸ…көҗмҳҒнҷ”м ңм—җ м¶ңн’Ҳлҗң мҳҒнҷ” 'мӢ кіј мқёк°„'мқ„ ліҙкі лӮҳм„ң
лӘ©нҡҢ мӮ¬м—ӯмқҳ н•ң к°ҖмҡҙлҚ°м„ң лІҲмһЎн•ҳкІҢ мӮҙлӢӨліҙл©ҙ к°ҖлҒ”мқҖ лӘ©мӮ¬мқҳ мЎҙмһ¬ мқҳлҜёк°Җ л¬ҙм—Үмқёк°ҖлҘј мғқк°Ғн•ҙліҙлҠ” кІҪмҡ°к°Җ мһҲлӢӨ. н•ңм°Ҫ лӯ”к°ҖлҘј н•ҙлӮҙм•ј н•ҳкі л°”мҒҳкІҢ мӮҙм•„к°Җм•ј н•ҳлҠ” мғҒнҷ©м—җм„ң к°‘мһ‘мҠӨлҹҪкІҢ л– мҳӨлҘҙлҠ” мҳҲкё°м№ҳ лӘ»н•ң м§Ҳл¬ёмңјлЎң мһ мӢң л©Ҳм¶°м„ңм•ј н•ҳлҠ” кІғмқҙ лӢ№нҷ©мҠӨлҹҪкІҢ м—¬кІЁм§Җкё°лҸ„ н•ҳм§Җл§ҢпјҢ л•ҢлЎңлҠ” мғҲлЎңмҡҙ м¶ңл°ңмқ„ мң„н•ң мһ¬м¶©м „мқҳ кё°нҡҢлЎң л°ӣм•„л“Өм—¬м§Җкё°лҸ„ н•ңлӢӨ.
мІҳмқҢ мҶҢлӘ…мқ„ л°ӣм•ҳмқ„ л•Ңмқҳ к·ё мҲңмҲҳн•ң м—ҙм •мқҖ мқҙлҜё мҳӨлһҳ м „м—җ мӮ¬лқјм§„ кІғ к°ҷкі пјҢ лӘ©нҡҢмһҗлЎңм„ң н•ҙм•ј н• л§ҺмқҖ мқјл“Өм—җ мқҙлҰ¬ м ҖлҰ¬ 분주н•ҳкІҢ лӢӨлӢҲлӢӨ ліҙл©ҙ лӘ©мӮ¬лҸ„ кІ°көӯ кё°м—…мқҙлқјлҠ” мЎ°м§Ғмқҳ н•ң мқјмӣҗкіј к°ҷмқҖ кІғмқҖ м•„лӢҢм§Җ мһҗмЎ°н•ҳл©° мһҗмұ…н•ҳлҠ” кІҪмҡ°к°Җ мў…мў… л°ңмғқн•ңлӢӨ. кІҢлӢӨк°Җ мҡ”мҰҳ к°ҷмқҙ лҠҘл Ҙмқҙ мӨ‘мӢңлҗҳлҠ” мӮ¬нҡҢм—җм„ңлҠ” лҚ”мҡұ к·ёл ҮлӢӨ. лҠҘл Ҙмқ„ мһ…мҰқ л°ӣм§Җ лӘ»н•ҙ лӘ©нҡҢмһҗлЎң мҙҲл№ҷ л°ӣм§Җ лӘ»н•ҳкі мһҲлҠ” н•ң мӮ¬лһҢмңјлЎңм„ң лӮҳмҷҖ к°ҷмқҖ л§ҺмқҖ лӘ©мӮ¬л“Өмқҙ л§ҺлӢӨлҠ” мӮ¬мӢӨмқ„ м•Ңкі мӢ¬к°Ғн•ҳкІҢ кі лҜјн•ҙліё м Ғмқҙ мһҲм—ҲлӢӨ. лӘ©мӮ¬лЎңм„ң лӮҳлҠ” м–ҙл–Ө мқҳлҜёлҘј к°–лҠ” кІғмқёк°Җ? мқҙлҹ¬лӢӨк°Җ лҸ„нғңлҗҳлҠ” кІғмқҖ м•„лӢҢк°Җ? 3л…„ м•Ҳм—җ мҙҲл№ҷ л°ӣм§Җ лӘ»н•ҳкұ°лӮҳ лӘ©мӮ¬мқҳ мӮ¬м—ӯмқҙлқјкі мқём •л°ӣлҠ” мқјмқ„ н•ҳм§Җ м•ҠкІҢ лҗҳл©ҙ л¬ҙмһ„мңјлЎң мІҳлҰ¬лҗҳкі кІ°көӯ л©ҙм§Ғ мІҳ분лҗҳлҠ” нҳ„ мғҒнҷ©м—җм„ң лӘ©мӮ¬мқҳ м •мІҙм„ұм—җ лҢҖн•ң м§Ҳл¬ёмңјлЎң кҪӨлӮҳ мҳӨлһ«лҸҷм•Ҳ кі лҜјн•ҙліҙм•ҳлҚҳ кІғ к°ҷлӢӨ.
лӘ©нҡҢмһҗлЎңм„ң мӮ¬м—ӯмқҙ мЈјм–ҙм§Җм§Җ м•ҠлҠ” мғҒнҷ©м—җм„ң лӘ©мӮ¬лЎңм„ң кі„мҶҚ лӮЁм•„ мһҲмқ„ мқҙмң к°Җ мһҲлҠ”к°Җ? лӘ©мӮ¬ л§җкі лҠ” н• мқјмқҙ м—Ҷм–ҙм„ң лӮҙк°Җ мқҙ кёёмқ„ нҸ¬кё°н•ҳм§Җ м•ҠлҠ” кІғмқёк°Җ? мң н•ҷмӢңм ҲпјҢ мЈјліҖм—җ лӮҳлҘј лҸ„мҷҖмЈјлҠ” мӮ¬лһҢмқҙ м—ҶлӢӨкі м—¬кІјлҚҳ м–ҙл өкі нһҳл“ л•Ңм—җ м°ЁлқјлҰ¬ лӢӨлҘё кёёмқ„ к°Ҳк№Ң мғқк°Ғн•ң м Ғмқҙ мһҲм—ҲлӢӨ. мӢ н•ҷмғқмқҙлқјлҠ” м •мІҙм„ұмқҙ л¬ҙм—Үмқ„ мқҳлҜён•ҳлҠ”м§Җ кі лҜјн•ҳкІҢ лҗң кІғмқҙлӢӨ. мҶҢлӘ… н•ҳлӮҳ л¶ҷмһЎкі мӮҙм•„к°”лҠ”лҚ°пјҢ м•һмқҙ ліҙмқҙм§Җ м•ҠлҠ” мӢңк°„л“Өмқҙ м—°мҶҚлҗҳл©ҙм„ң к·ёкІғл§Ҳм Җ нһҳкІ№кІҢ лҠҗк»ҙ진 кІғмқҙм—ҲлӢӨ. кІ°көӯ мқҙ лӘЁл“ мғҒнҷ©л“Өмқ„ к·№ліөн•ҳкі мң н•ҷ мғқнҷңмқ„ л§Ҳл¬ҙлҰ¬ н• мҲҳ мһҲм—ҲлҚҳ кІғмқҖ л„Ҳл¬ҙ м•һмқ„ ліҙл Өкі н•ҳм§Җ л§җкі м§ҖкёҲмқҳ мҲңк°„мқ„пјҢ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ҘҙмӢ¬ к°ҖмҡҙлҚ°м„ң н•ҳлЈЁн•ҳлЈЁлҘј мҶҢмӨ‘нһҲ м—¬кё°мһҗлҠ” кІ°лӢЁ л•Ңл¬ёмқҙм—ҲлӢӨ.
мқҙл ҮкІҢ мғқк°Ғн•ҙліҙлӢҲ гҖҖм •мІҙм„ұм—җ лҢҖн•ң кі лҜјмқҖ лҢҖмІҙлЎң мӮ¶м—җ м–ҙл ӨмӣҖмқҙ лӢҘміӨмқ„ л•ҢпјҢ нҠ№нһҲ лӮҳмқҳ мЎҙмһ¬ к°Җм№ҳлӮҳ мқҳлҜём—җ лҢҖн•ҙ нҷ•мӢ н•ҳм§Җ лӘ»н• л•Ң м–ём ңлӮҳ м°ҫм•„мҷ”лҚҳ кІғ к°ҷлӢӨ. мӮ¬м¶ҳкё° мӢңм Ҳм—җлҸ„ к·ёлһ¬кі пјҢ кө°лҢҖм—җм„ңлҸ„ к·ёлһ¬кі пјҢ лҢҖн•ҷ мӢңм ҲмқҙлӮҳ мң н•ҷмӢңм Ҳм—җлҸ„ к·ёлһ¬кі пјҢ к·ёлҰ¬кі лӘ©мӮ¬лЎңм„ң мӮҙм•„к°ҖлҠ” м§ҖкёҲлҸ„ к·ёл ҮлӢӨ. лӢӨлҘё мӮ¬лһҢл“Өм—җкІҢ мң„лЎңмҷҖ нһҳмқҙ лҗҳм–ҙмЈјм–ҙм•ј н• лӘ©мӮ¬лЎңм„ң н•ңм—Ҷмқҙ л¶ҖлҒ„лҹҪкІҢ лҠҗк»ҙм§ҖлҠ” мҲңк°„мқҙм—Ҳ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Ҡ” мІҳмқҢмңјлЎң м ң8нҡҢ м„ңмҡёкё°лҸ…мҳҒнҷ”м ңм—җм„ң мғҒмҳҒлҗң 'мӢ кіј мқёк°„'(мһҗ비м—җ ліҙл¶Җм•„пјҢ 2010)мқҖ м№ё мҳҒнҷ”м ңм—җм„ң мӢ¬мӮ¬мң„мӣҗ лҢҖмғҒмқ„ л°ӣм•ҳлӢӨлҠ” ліҙлҸ„мҷҖ н•Ёк»ҳ мҶҢл¬ёмңјлЎң л“Өм—Ҳмқ„ л•ҢлҠ” мӮ¬м ңл“Өмқҳ мҲңкөҗмқҙм•јкё°лЎңл§Ң м—¬кІЁмЎҢлӢӨ. к·ёлҹ¬лӮҳ м§Ғм ‘ мҳҒнҷ”лҘј ліҙл©ҙм„ң лӢЁмҲңн•ң мҲңкөҗмқҙм•јкё°к°Җ м•„лӢҳмқ„ м•Ңм•ҳлӢӨ. 'мӢ кіј мқёк°„'мқ„ нҶөн•ҙ н•„мһҗлҠ” лӘ©мӮ¬лЎңм„ң л¬ҙм—Үмқ„ н• мҲҳ мһҲкё°лҘј мҡ”кө¬л°ӣлҠ” мқҙ мӢңлҢҖм—җ лӢӨмӢң н•ң лІҲ лӘ©мӮ¬лЎңм„ң мқҳлҜёлҘј л°ҳ추н•ҙліј мҲҳ мһҲлҠ” кё°нҡҢлҘј к°–кІҢ лҗҳм—ҲлӢӨ.
мҳҒнҷ”лҠ” н…Ңлҹ¬мқҳ мң„нҳ‘мңјлЎң кіөнҸ¬м—җ нң©мӢёмқё 1996л…„ м•Ңм ңлҰ¬ м–ҙлҠҗ л§Ҳмқ„мқҳ м•„нӢҖлқјмҠӨ мҲҳлҸ„мӣҗмқ„ л°°кІҪмңјлЎң н•ңлӢӨ. мЈҪмқҢмқҳ л‘җл ӨмӣҖм—җм„ң кІ°мҪ” мһҗмң лЎңмҡё мҲҳ м—ҶлҠ” мқёк°„мңјлЎңм„ң лӮҳм•Ҫн•Ёмқ„ л“ңлҹ¬лӮј мҲҳл°–м—җ м—Ҷм—ҲлҚҳ мҲҳлҸ„мӣҗ мӮ¬лһҢл“ӨпјҢ мҳҒнҷ”лҠ” л°”лЎң к·ёлҹ° лӘЁмҠөмқҳ мҲҳлҸ„мӣҗ нҳ•м ңл“Өмқ„ ліҙм—¬мЈјл©ҙм„ң к·ёл“Өмқҙ мң„кё°лҘј м–ҙл–»кІҢ лҢҖмІҳн•ҙ лӮҳк°”лҠ”м§ҖлҘј л§Ҳм№ҳ н•ңнҺёмқҳ лӢӨнҒҗл©ҳн„°лҰ¬лҘј ліҙлҠ” л“Ҝмқҙ ліҙм—¬мӨҖлӢӨ.
мһҗмӢ мқҳ мғқлӘ…мқ„ ліҙмЎҙн•ҳкё° мң„н•ҙ л– лӮ л§Ңн•ң 충분н•ң лӘ…분мқҙ лӘЁл‘җм—җкІҢ мһҲм—Ҳм§Җл§ҢпјҢ к·ёл“ӨмқҖ лӘҮ м°ЁлЎҖмқҳ мқҳмӮ¬көҗнҷҳмқ„ нҶөн•ҙ мӮ¬лһҢл“Өмқҙ мһҗмӢ л“Өмқ„ н•„мҡ”лЎң н•ҳкі к·ёкІғмқҙ л¶ҖлҘҙмӢ¬мқҳ мқҙмң лқјкі мғқк°Ғн•ҙм„ң лӘЁл‘җк°Җ лӮЁм•„ мһҲкё°лЎң кІ°м •н•ңлӢӨ. к·ёл“ӨмқҖ мЈҪмқҢмқ„ л‘җл ӨмӣҢн–Ҳкі пјҢ л¬ҙм—Үмқ„ н•ҙм•ј н•ҳлҠ” м§ҖлҘј кі лҜјн–Ҳмңјл©°пјҢ м„ңлЎңмқҳ мқҳкІ¬мқ„ л¬»кі лҢҖлӢөн•ҳл©ҙм„ң к°Ғмһҗмқҳ мғқк°Ғкіј кІ°м •л“Өмқ„ мҶҢнҶөн•ҳлҠ” к°ҖмҡҙлҚ° кІ°көӯм—җлҠ”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ҘҙмӢ¬мңјлЎң лҸҢм•„к°Ҳ мҲҳ мһҲм—ҲлӢӨ. мқҳмӮ¬лҠ” мқҳмӮ¬лЎңм„ң лҒқк№Ңм§Җ лӮЁм•„ мһҲм–ҙм•ј н• мқҙмң к°Җ мһҲлҠ” кІғмқҙкі пјҢ мҲҳлҸ„мӮ¬лҠ” мҲҳлҸ„н•ҳлҠ” мӮ¬лһҢмңјлЎңм„ң н• мқјмқҙ мһҲм—Ҳмңјл©°пјҢ лҳҗн•ң мӮ¬м ңлҠ” мӮ¬м ңлЎңм„ң лӮЁм•„ мһҲм–ҙм•ј н• мқҙмң к°Җ мһҲ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к·ё л°ңкІ¬мқҳ кіјм •мқҙ мҳӨлһң мӢңк°„ лҸҷм•Ҳ м§ҖмҶҚлҗҳм—Ҳкі пјҢ л§Ҳм№ҳ н•ң нҺёмқҳ лӢӨнҒҗл©ҳн„°лҰ¬лҘј ліҙлҠ” л“Ҝ мӮ¬мӢӨм ҒмңјлЎң н‘ңнҳ„н•ҳкі мһҲм–ҙ кҙҖк°қмқҖ мҲҳлҸ„мӣҗ мӮ¬лһҢл“Өмқҳ кі лҜјкіј лІҲлҮҢлҘј кіөмң н• мҲҳ мһҲм—Ҳкі пјҢ л§Ҳм№ҳ лӮҙк°Җ к·ё нҳ„мһҘм—җ мһҲлҠ” л“ҜпјҢ к·ёл“Өмқҳ л…јмқҳ кіјм •м—җ м°ём—¬н•ң н•ң мӮ¬лһҢмңјлЎңм„ң лӮҳмқҳ мғқк°ҒлҸ„ лӮҳлҲҢ мҲҳ мһҲм—ҲлӢӨ.
к·ёл“Өмқҙ лӮЁкё°лЎң н•ң лҳҗлӢӨлҘё мқҙмң лҠ” к·ёл“Өмқҳ мЎҙмһ¬ мқҙмң лҘј м°ҫлҠ” кіјм •м—җм„ң м–ёкёүлҗң лӮҳлӯҮк°Җм§ҖмҷҖ мғҲмқҳ 비мң мқҙлӢӨ. мӮ°мұ… мӨ‘м—җ ліҙкІҢ лҗң лӮ м•„к°ҖлҠ” мІ мғҲл“Өмқ„ л№—лҢҖм–ҙ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ҘҙмӢ¬м—җ л”°лқј-лӢӨмӢң л§җн•ҙм„ң мғҒнҷ©м—җ л”°лқј-мқҙкіім Җкіімқ„ мҳ®кІЁ лӢӨлӢҲлҠ” мЎҙмһ¬лЎңм„ң мҠӨмҠӨлЎңлҘј к·ёл ҮкІҢ мғқк°Ғн–ҲлҚҳ мӮ¬м ңлҠ” л§Ҳмқ„ мӮ¬лһҢл“ӨлЎңл¶Җн„° м „нҳҖ лӢӨлҘҙкІҢ мқҙн•ҙлҗң л§җмқ„ л“ЈкІҢ лҗңлӢӨ. лӢ№мӢ л“ӨмқҖ к°Җм§Җмқҙкі л§Ҳмқ„ мӮ¬лһҢл“ӨмқҖ мғҲл“ӨмқёлҚ°пјҢ лӢ№мӢ л“Өмқҙ л– лӮҳл©ҙ мҡ°лҰ¬лҠ” м–ҙл””м—җ к№ғл“Ө мҲҳ мһҲлҠҗлғҗлҠ” м§Ҳл¬ёмқҙм—ҲлӢӨ. л§Ҳмқ„ мӮ¬лһҢл“Өм—җкІҢ мҲҳлҸ„мӣҗ мӮ¬лһҢл“Өмқҳ мЎҙмһ¬лҠ” лӢЁмҲңнһҲ к·ёл“Өмқҙ л¬ҙм—Үмқ„ н•ҳлҠҗлғҗмқҳ л¬ём ңк°Җ м•„лӢҲ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к·ёл“Өмқҳ мЎҙмһ¬ мһҗмІҙк°Җ л§Ҳмқ„ мӮ¬лһҢл“Өм—җкІҢлҠ” н•ҳлӮҳмқҳ мӮ¶мқҳ кіөк°„мқҙ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л¬ҙм—Үмқ„ н•ЁмңјлЎңмҚЁк°Җ м•„лӢҲлқј мЎҙмһ¬ мһҗмІҙк°Җ мқҳлҜёк°Җ мһҲм—ҲлӢӨлҠ” л§җмқҙм—ҲлӢӨ.
лӘ©мӮ¬лЎңм„ң мЎҙмһ¬ мқҙмң лҠ” л¬ҙм—Үмқҙкі пјҢ м–ҙл””м„ң к·ё лҢҖлӢөмқ„ м°ҫмқ„ мҲҳ мһҲмқ„ кІғмқёк°Җ? мқҙлҹ° кі лҜјмқ„ н•ҳлҚҳ н•„мһҗлҠ” мҳҒнҷ”лҘј ліҙкі лӢӨмқҢкіј к°ҷмқҖ мғқк°Ғмқҳ ліҖнҷ”лҘј кІҪн—ҳн• мҲҳ мһҲм—ҲлӢӨ. лӘ©мӮ¬лҠ”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ҘҙмӢ¬мңјлЎң мЎҙмһ¬н•ҳлҠ” кІғмқҙл©°пјҢ к·ёлҰ¬мҠӨлҸ„мқёл“Өмқҙ к№ғл“Ө мҲҳ мһҲлҠ” лӮҳлӯҮк°Җм§ҖмқҙлӢӨ. к·ёл“Өкіј кө¬лі„лҗң мЎҙмһ¬к°Җ кІ°мҪ” м•„лӢҲл©°пјҢ к·ёл“Өмқҳ мӮ¶ н•ң к°ҖмҡҙлҚ°м„ң мқёк°„мңјлЎңм„ң н•Ёк»ҳ мӮҙм•„к°Җл©ҙм„ң н•Ёк»ҳ мғқк°Ғн•ҳкі лҳҗ н•Ёк»ҳ кі лҜјн•ҳл©ҙм„ңлҸ„ к·ёл“Өмқҙ нһҳл“Өкі м§Җм№ л•Ң кё°лҢҲ мҲҳ мһҲлҠ” л“ұл°ӣмқҙлӢӨ. к·ёлҰ¬кі лӘ©мӮ¬к°Җ кё°лҢҲ 분мқҖ л°”лЎң н•ҳлӮҳлӢҳмқҙлӢӨ. лӘ©мӮ¬мқҳ м•ҲмӢқкіј нҸүм•ҲмқҖ мӮ¬лһҢмқҙ м•„лӢҲлқј н•ҳлӮҳлӢҳмқҙл©°пјҢ мқҙ л•…мқҙ м•„лӢҲлқј н•ҳлӮҳлӢҳ лӮҳлқјмқҙлӢӨ.
мқҙкІғмқҖ 비лӢЁ лӘ©мӮ¬м—җкІҢл§Ң н•ҙлӢ№лҗҳм§Җ м•ҠлҠ”лӢӨ. лӘЁл“ м„ұлҸ„л“Ө м—ӯмӢң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Ұ„мқ„ л°ӣмқҖ мӮ¬лһҢ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м„ұлҸ„лҠ” лҳҗ лӢӨлҘё мӮ¬лһҢл“Өмқҙ к№ғл“Ө мҲҳ мһҲлҠ” лӮҳлӯҮк°Җм§Җмқҙл©°пјҢ мӮ¬лһҢл“Өкіј н•Ёк»ҳ мӮҙм•„к°Җл©ҙм„ң к·ёл“Өмқҙ м§Җм№ҳкі нһҳл“Ө л•Ң л“ұл°ӣмқҙмқё кІғмқҙлӢӨ. мқёк°„мқҖ м—°м•Ҫн•ҳм§Җл§ҢпјҢ н•ҳлӮҳлӢҳмқҳ л¶ҖлҘҙмӢ¬ м•һм—җм„ңлҠ” л¶Җнҷңмқ„ мҶҢл§қн•ҳл©° мЈҪмқҢ м•һм—җм„ңлҸ„ м§Җк·№н•ң нҸүм•Ҳмқ„ лҲ„лҰҙ мҲҳ мһҲлҠ” мӮ¬лһҢл“ӨпјҢ к·ёл“Өмқҙ л°”лЎң к·ёлҰ¬мҠӨлҸ„мқёмқҙлӢӨ.
мөңм„ұмҲҳ / лӘ©мӮ¬ гҶҚ мһҘмӢ лҢҖ м¶ң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