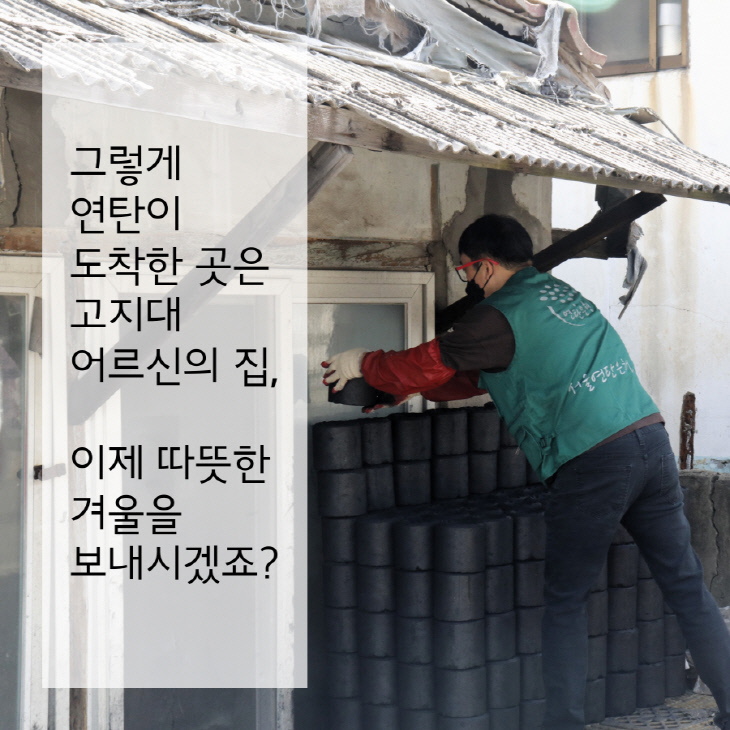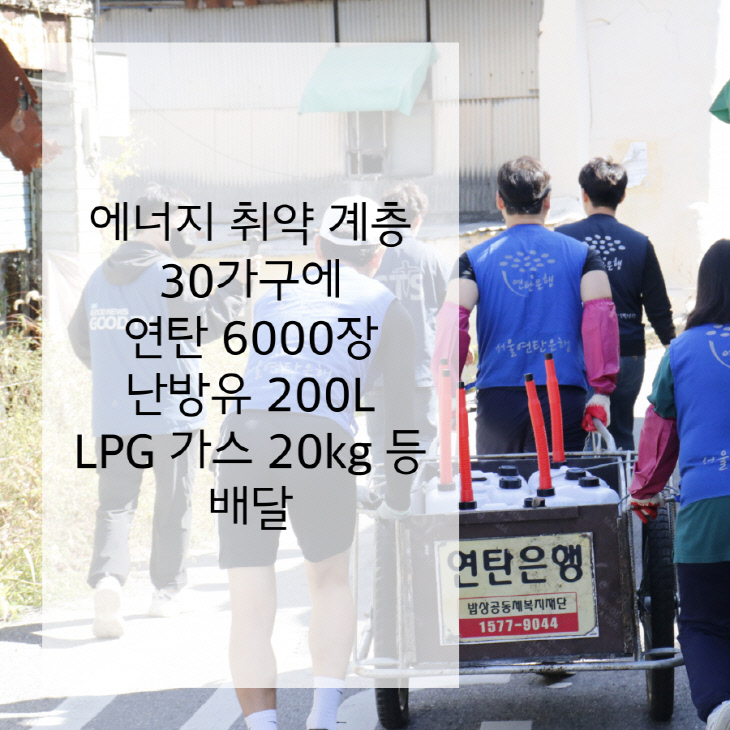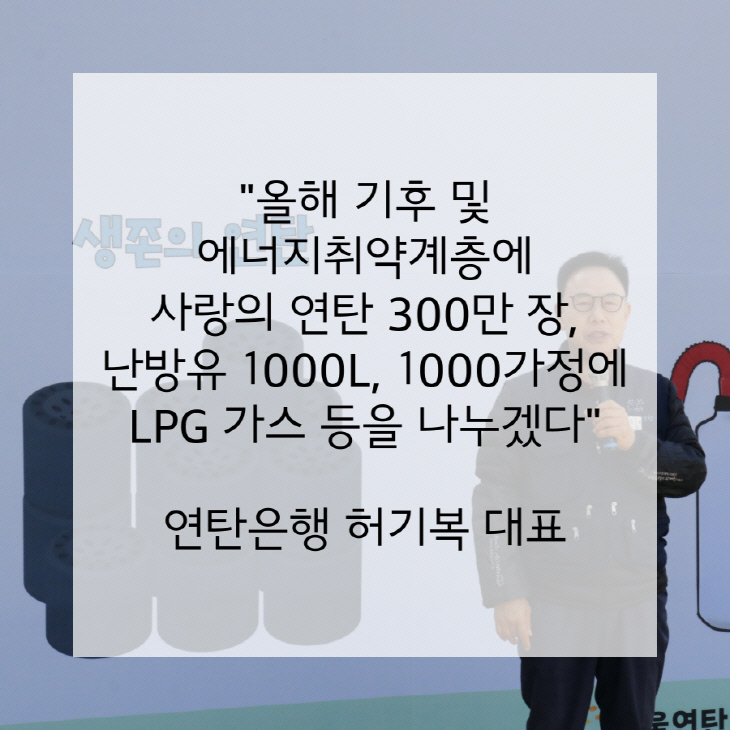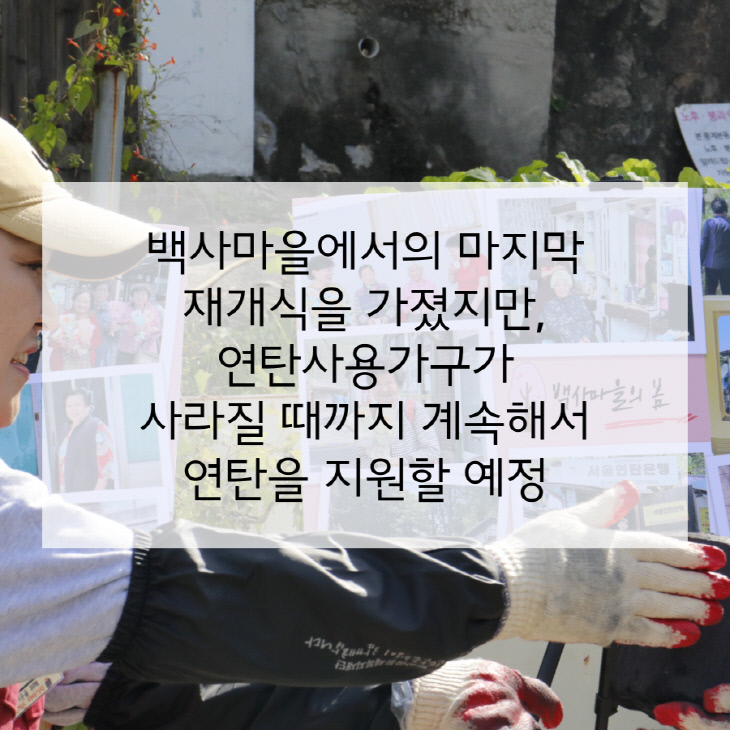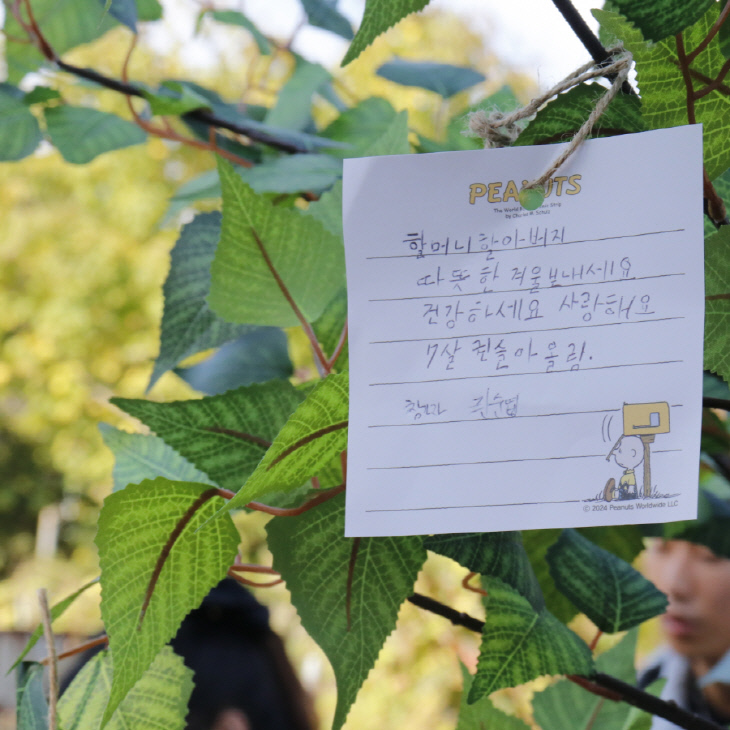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교계 ] [마이너리티리포트] 배고픈 기독 예술가들.
"글쎄요... 그냥 가만 두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잘 못 건드리면 괜히 상처만 더 깊어질테니까요."
기독교인이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음악가에게 "기독 뮤지션들이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요. 저는 꼭 기독 음악인이라고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음악이든 불교 음악이든 '종교성'이 묻어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서기가 어려운게 당연하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신앙을 지키면서 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우리는 전문가다.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전문성은 무시하고,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한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사람들인데…"라며 말문을 닫았다. 그는 "자칫 일회성 관심으로 기독 음악인들의 아픔이 가볍게 치부되는 것이 아쉬워 말을 아끼고 싶다"고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다.
재즈피아니스트 서은미씨는 데뷔 초 트리오를 결성하고 CCM 연주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즈에 대한 편견과 예배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 문화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을 위해 일반재즈로 방향을 틀었다. "일반 연주자들도 연주만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차비와 식대가 전부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인색하고 연주할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신앙을 지키려니 배고 고프고, 배를 채우려니 신앙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 이는 비단 기독 음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김은희사무국장은 "신앙이라는 소재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면서 "그림을 그려도 전시할 곳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협회 회원 이○○ 씨가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종교 색채가 너무 짙다"면서 거절당했다. 전시회를 열어도 관람객이 없다는 게 이유다.
"기독미술이 교회에서도 외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바로 설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김 사무국장은 "기독 미술관이 만들어져야 기독 작가들이 마음 놓고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할 수 있다"면서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기독 작가들의 삶은 계속 위태로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독미술인협회에는 2백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등 기독단체에서 3백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연계도 마찬가지다. 성극 배우로 활동하는 박○○ 씨는 스스로를 "비정규직"이라고 소개했다. 성극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1년에 한번도 무대에 서지 못할 때가 많다. 그나마 운이 좋게 무대에 섰더라고 출연비를 받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배우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사명이 있다"는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무능력한 가장'이다. 박 씨를 비롯해 동료들은 건물 청소, 식당, PC방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내에게 이혼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그는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다.
극단예맥의 정정호사무국장은 "말한들 무슨 소용이냐?"면서 "성극은 흥행이 아니라 복음전파가 목적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 교회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극은 거의 배우들의 자비량으로 진행된다"는 정 사무국장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티켓을 판매하지만 한장도 판매하기 어렵다"면서 "혹시라고 교회에 홍보차 티켓을 무료로 제공해도 대부분 쓰레기가 된다"고 했다.
배우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후원사를 모집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이들의 생활을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배우들은 TV에 단역으로 출연하거나 일반 무대에서 연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금을 떼면 3~4만 원이 고작, 한 사극 드라마의 단역들이 밀린 출연료를 요구하며 "받아야할 출연료를 보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된 것도 그들의 열악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정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배우들이 '빚잔치' 중"이라며 "열악한 극단일 경우는 배우들에게 출연비도 못준다"고 전했다. 임동진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맥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20여년 동안 성극 극단으로 잔뼈가 굵은 예맥은 1년에 한두번은 무대를 올리고, 배우들 출연료를 가장 잘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정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유료 관객은 20%를 넘기 힘들고 극장 대관도 까다롭다"면서 "어디든 성극 배우들은 연기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귀띔한다.
그 또한 "교회가 1년에 한번 성극은 물론 기독 공연을 관람해야 기독문화가 훨씬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예술가들이 힘을 얻고 좋은 작품도 만들도 있다"고 피력했다. 성극 전문 극단은 아니지만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를 기획했던 아웃리치코리아 강현철대표는 "공연계는 어디든 힘든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기독교는 상상력에 제한을 받고 보수적이라 접근이 더 어렵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술가'라는 사실을 교회가 인식하고 그들이 마음껏 창작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가는 춥고 배고프다"는 말은 사실일까. 실제로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학과 미술 사진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63%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월평균 수입이 아예 없거나 1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악과 대중예술은 각각 10.5%와 5%, 음악과 무용, 영화는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이상이 평균 53%인 반면 수입이 없는 경우도 25%로 적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일반 문화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독문화계는 상황이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주 무대가 '교회'로 한정 되어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인식도 예술가이기 전에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藝術家)'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1차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신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를 놓고 갈등하기 전에 충분한 사례를 해야 한다. 교회문화가 세상 속에서 더이상 어색하고 부끄럽지 않게 성장하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