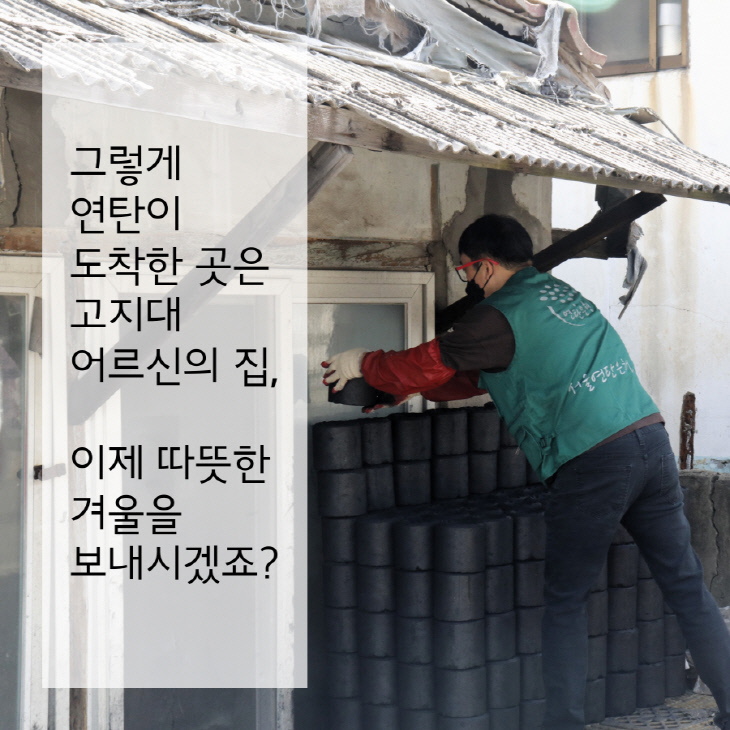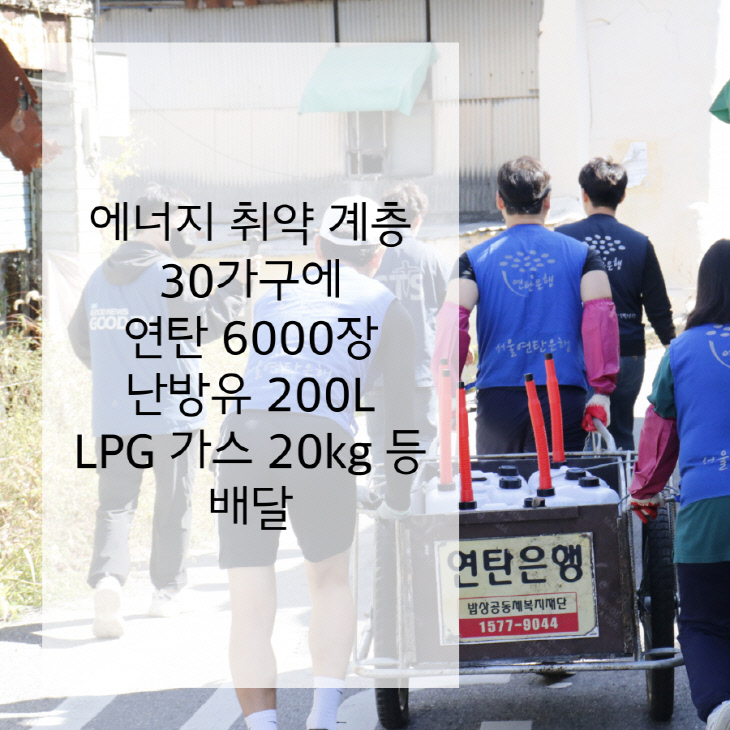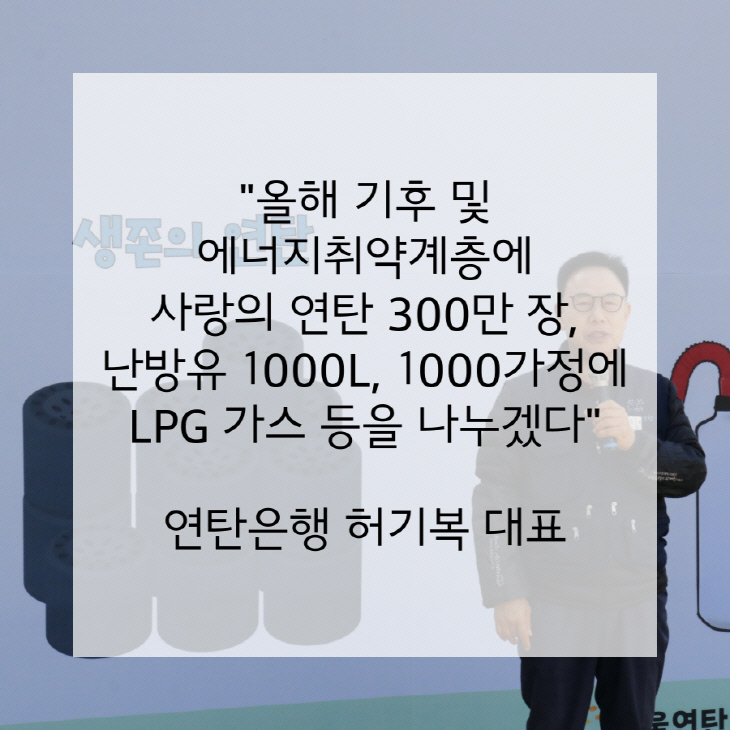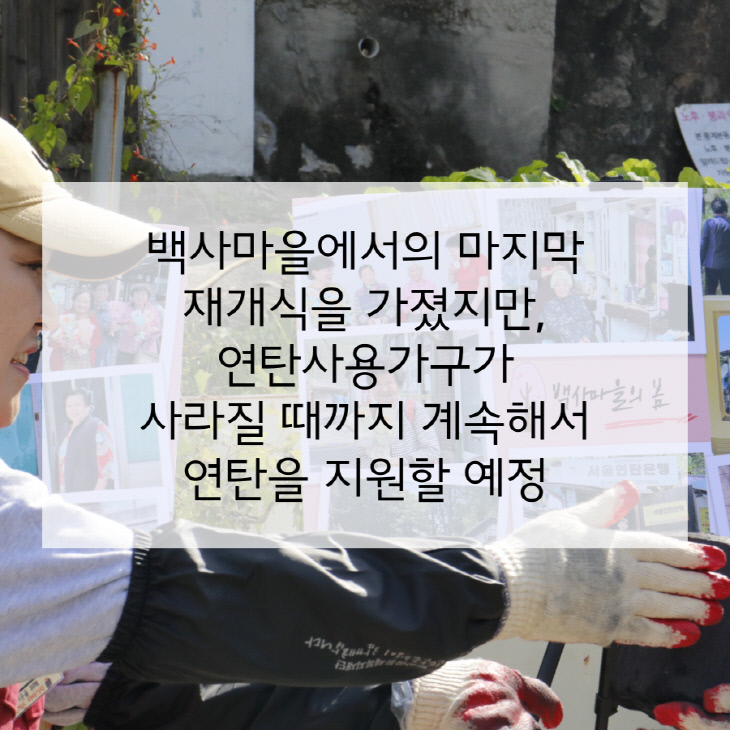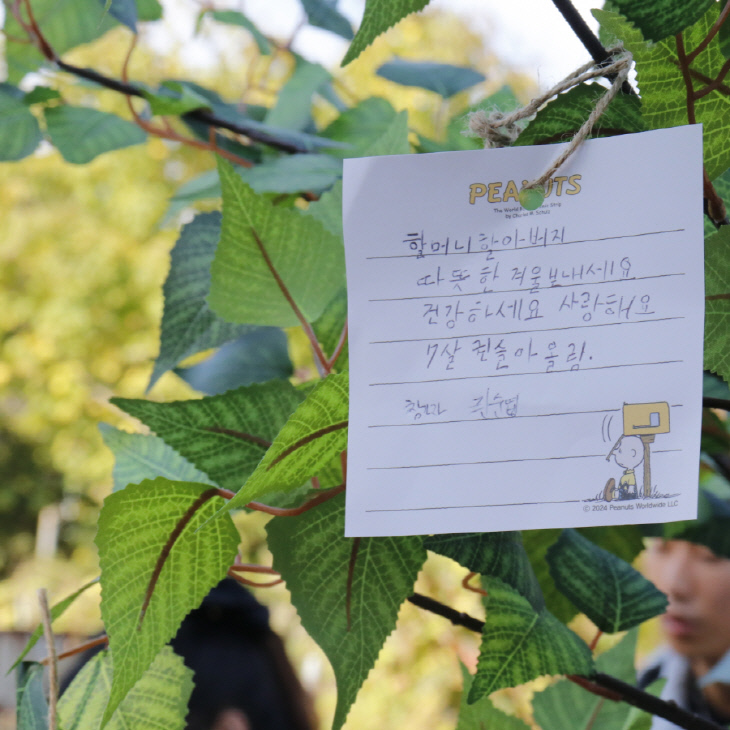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목양칼럼 ]
지난 3년 2개월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음'을 둘러싼 신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교인 가운데 70세 이상이 4백40여 명이 되다보니 병원을 찾는 일이 잦게 되고,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횟수가 많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회가 동산병원과 인접해 있다 보니 타 교회 교인들의 입원 소식과 별세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장신대 교수로 재직 중에는 매일 강의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요즘은 새벽기도 후나 아침 직원기도회 후 먼저 찾는 곳이 병원이 되어 버렸다. 새벽마다 환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아졌다. 묵상의 제목 역시 삶과 직결된 '죽음'이라는 실존의 명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성찰하게 된다.
삶이란 분명히 죽음과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도 신앙인들마저도 삶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 불치병 환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품위 있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 보다는 치유의 기적을 바라거나 불필요한 치료에 아직도 매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인생길을 힘들게 견디고 잘 살아온 분이 죽을 때에는 중환자실에서 약물에 취하거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기구에 의지해서 혼수상태로 격리되어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도 제대로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는 치료(cure) 보다는 요양(care)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말이다.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에서 김열규씨는 "죽음을 잊으면 삶도 덩달아 잊혀진다"고 썼다. 이 말은 죽음을 우습게 여기면, 삶도 우스워 진다는 의미로도 들려진다. 인간은 살 때에도 인간답게 잘 살아야 하지만 죽을 때는 더더욱 행복하고 품위 있게 죽어야(well-dying) 한다. 품위 있는 죽음이 없으면 품위 있는 삶도 살 수 없다. 따라서 '생명목회'를 지향하는 목자라면, 죽음에 직면한 실존현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가져오는 목회적인 돌봄이 꼭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사건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리는 계시사건이요, 동시에 새로운 완전한 삶의 과정으로 나가는 '변화의 문'을 열어준 복음이다.
죽음 앞에 맞닥뜨린 인간실존의 연약함 속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죽음에 직면한 성도에게 죽음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시켜야 한다. 영생의 복음(요11:25~26)을 믿음으로 고백케 해서, 품위 있는 행복한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작별을 맞도록 지원하는 목회적인 돌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온 관광객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랑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지니고 지구촌에 태어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철저히 순례자의 삶을 살고 떠나야 한다.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될 순례자의 흔적을 남기고 즐겁게 떠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생관을 확고히 세워 주어야 한다.
고용수 /목사 ㆍ 대구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