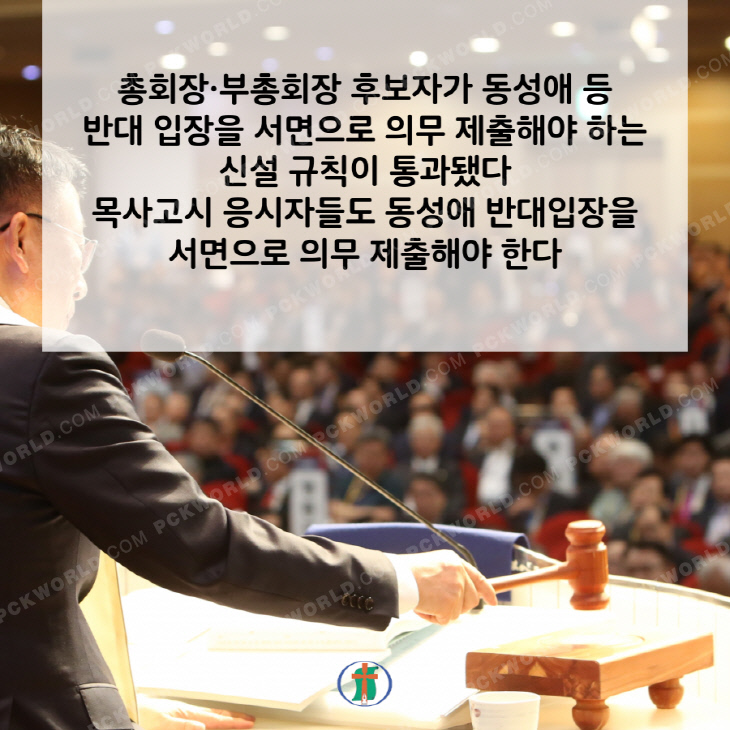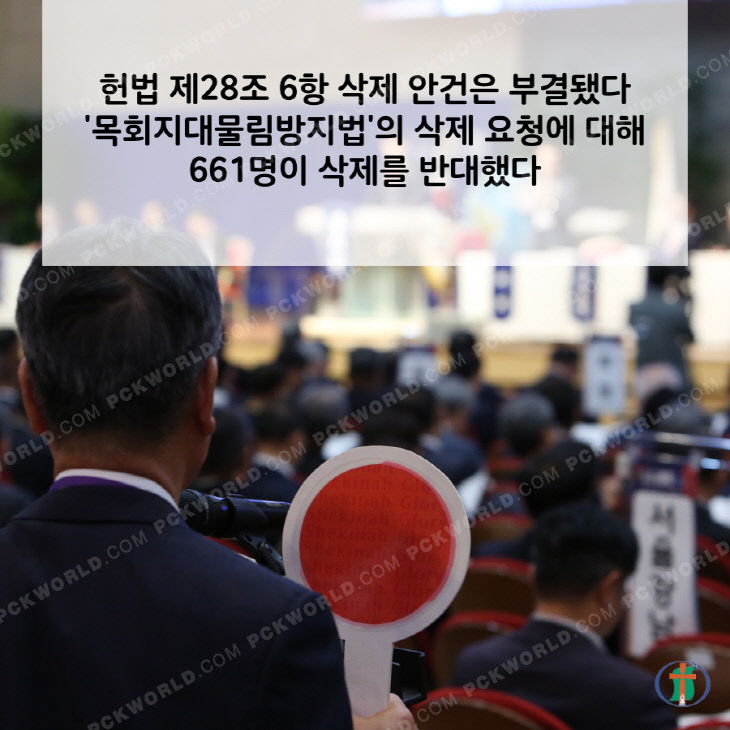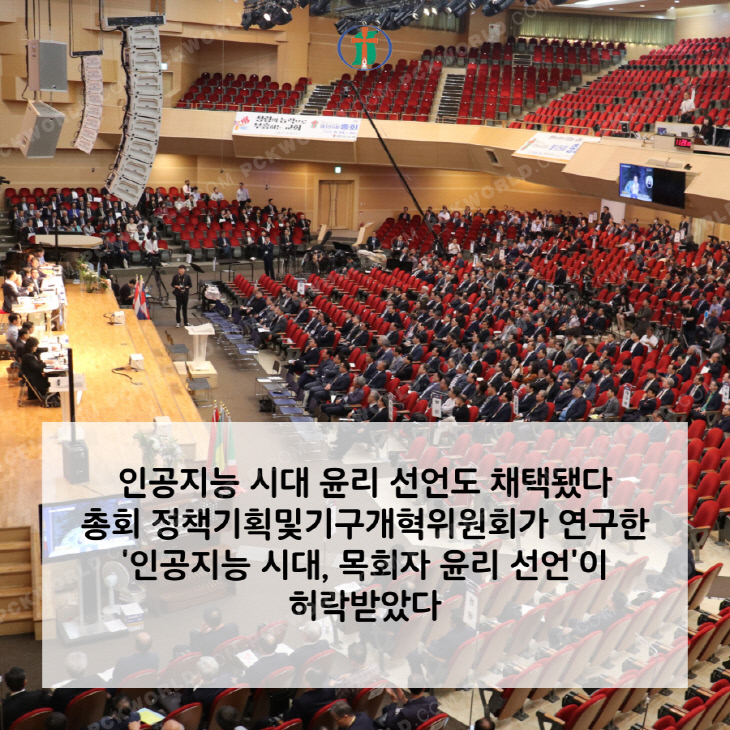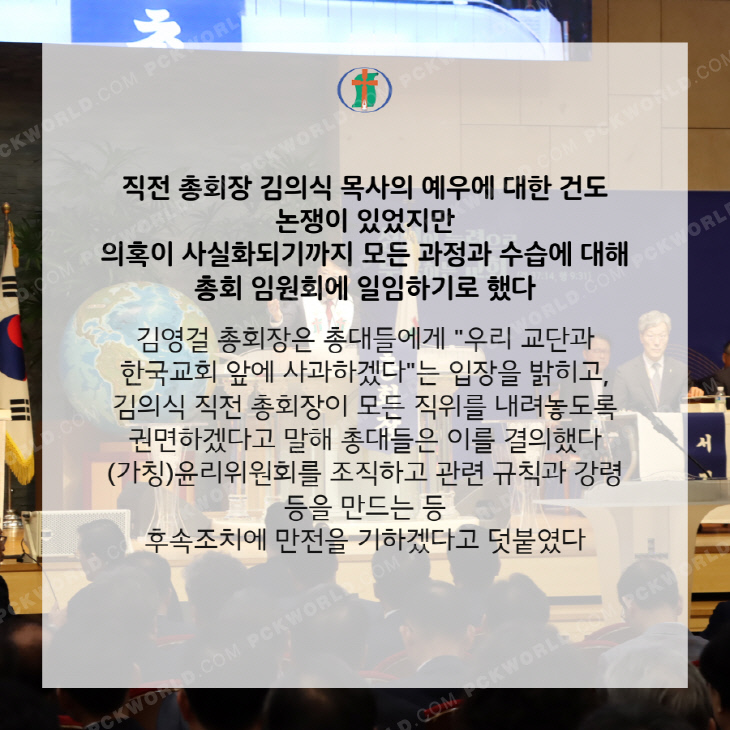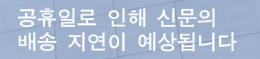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목양칼럼 ]
나는 지체장애 4급이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몸으로 체험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중증 장애는 아니었음에도 힘들었다. 왼쪽 다리가 오른 쪽보다 7센티 정도 짧다. 아픈 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힘들었다. 장애로 인해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병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씀)지만 그럼에도 사회는 나를 장애인으로 인식했다.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내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장애를 입은지 5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은 아직 15년이 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지금 나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130명이 넘는 장애인들과 70여 명의 비장애인들이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1994년에 개척을 했으니 24년이 지났다. 나는 목사이지만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이 보면 비장애인으로 보이고 비장애인들이 나를 보면 장애인이다. 나의 위치가 늘 경계인이다. 나는 경증장애인이지만 장애인으로 살아왔으며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은 알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보면 나는 아주 경미한 장애인이다. 때로 중증장애인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계인의 삶이 나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경계인이기에 나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고 비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어린 시절 장애 때문에 반항하고 장애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는데, 심지어 부모님께 "나 같은 병신을 왜 낳으셨냐?"고 원망하며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감사할 따름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80%이상은 장애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다. 가끔 중증장애인들이 나에게 치명적인 한 마디를 날린다. '목사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 아니 말할 힘이 없어진다. 그래도 행복하다. 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중증장애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감사하다.
폴 트루니에의 책 중에 '고통보다 깊은'의 240쪽에 이런 글이 있다. '확실한 것은 인생의 모든 시련이 밭을 가는 것처럼 씨를 뿌릴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시련만이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굳은 껍질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계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포용하는 접점이 되었다. 오늘도 어제처럼 경계인이지만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