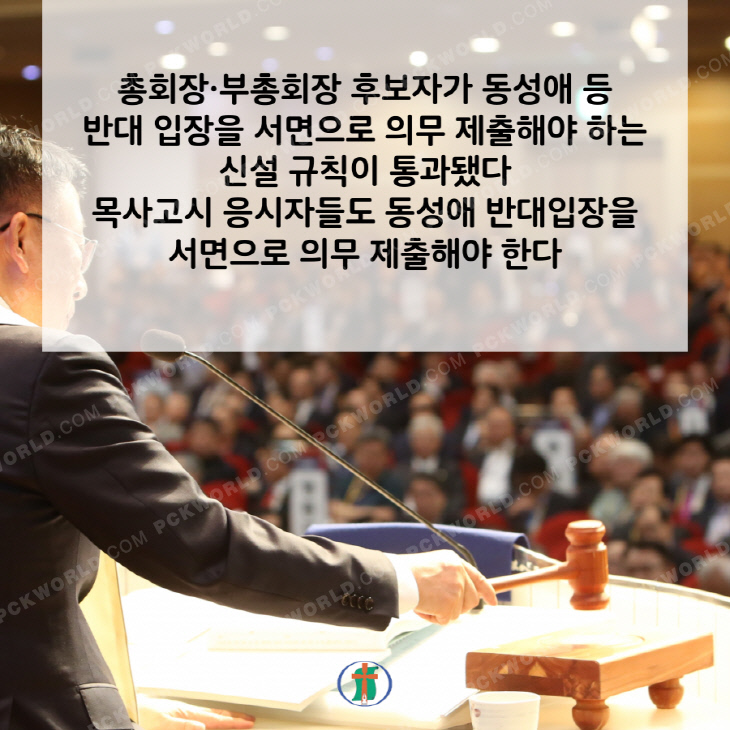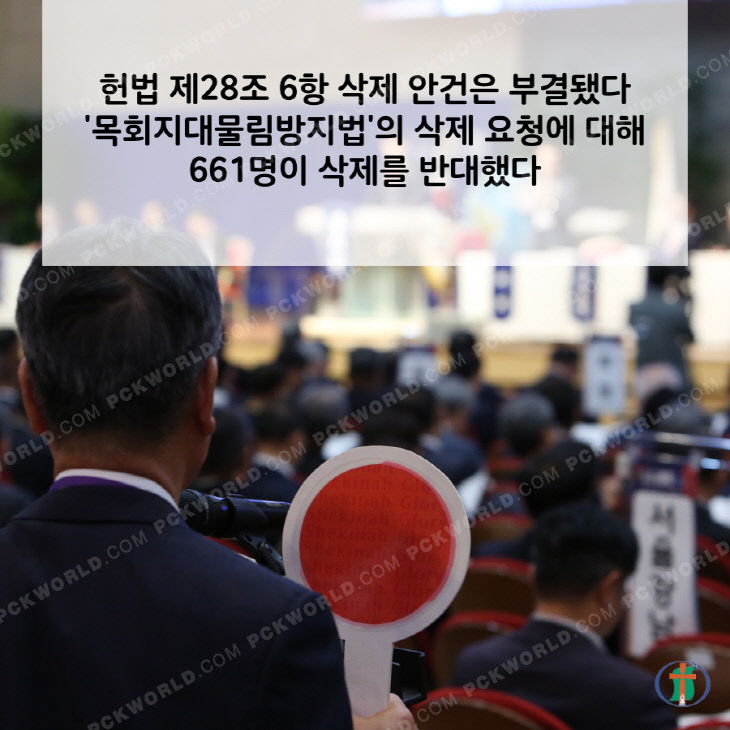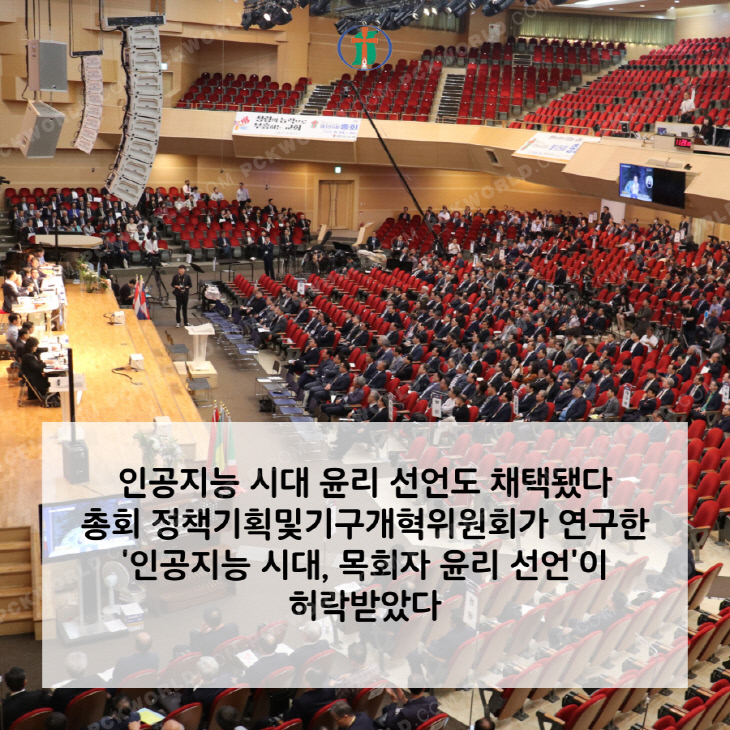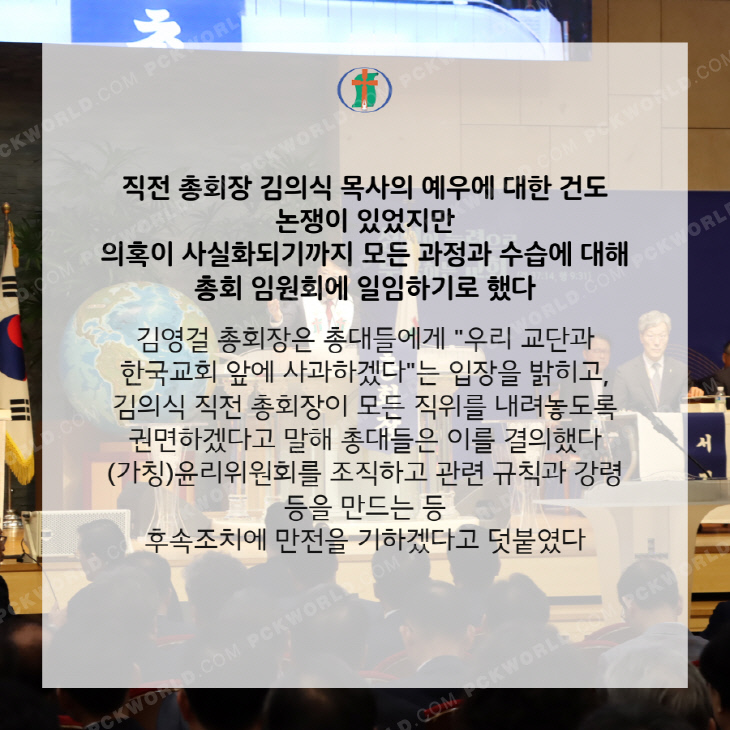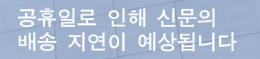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목양칼럼 ]
요즘 우리 마을은 논쟁이 뜨겁다. 내가 우리 마을에 이사 온지 27년이 넘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외지인'이다. 내가 처음 정착했을 때 만해도 우리 마을의 인구구성은 주로 원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비록 '서울'에서 이사 온 외지인이지만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생활습관, 연령,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겉돌지 않고 서로 이웃이 되어 살기 위해 애썼다.
이사 온지 10여 년이 지난 후, 나는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소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요즘이야 유행처럼 회자되는 개념이지만 2002년도 만해도 처음 도입되는 내용이었다.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장년회장 등 마을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많은 일들을 했다.
마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계곡청소와 마을가꾸기 사업,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 마을의 전통을 복원하는 사업,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 사업,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짚풀공예와 예술작업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 원주민들과 이사 온 외지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소위 일부 불만세력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주축이 되어 여러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또 흘렀다. 이제 마을의 구성원은 외지인과 원주민의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달라졌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각 리더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쌓일 대로 쌓인 불신의 벽은 높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마을회의를 하면 아직도 고성이 나온다. 처음 이의를 제기한 세력은 자신들의 명분을 찾기 위해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해온 세력은 그동안 받아온 고통에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나는 사업을 추진해온 세력에 속해있다. 하지만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을 주장하고 관철할 것인지, 무엇을 양보하고 배려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크기와 내용만 다를 뿐 구조와 형태는 같다. 요즘 마을일을 겪으며 나는 '박근혜식 리더십과 문재인식 리더십'을 생각해 본다. '소통과 협치'라는 단어는 원칙론적 개념에서 옳다. 세상은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렵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나를 공격하고 나와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할 시대적 소명이 내 앞에 있다. 나는 내일 밤 또 마을회의에 나가야 한다. 피하는 길이 상책인 것 같지는 않다. 끝까지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결과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