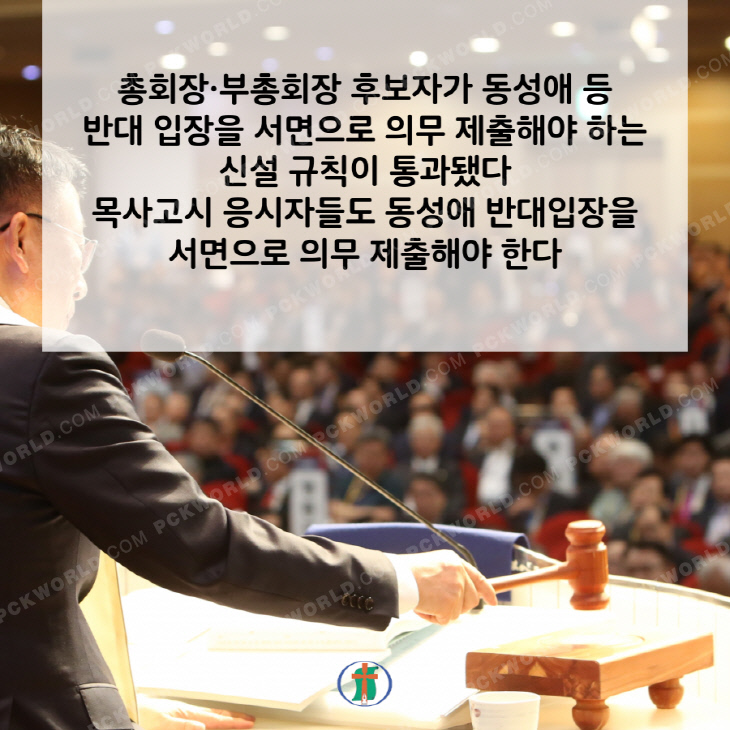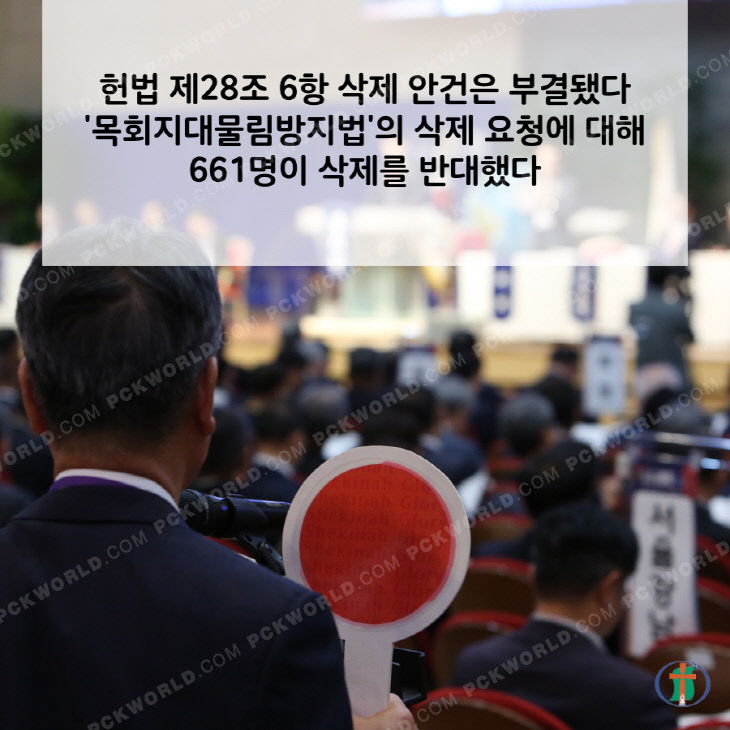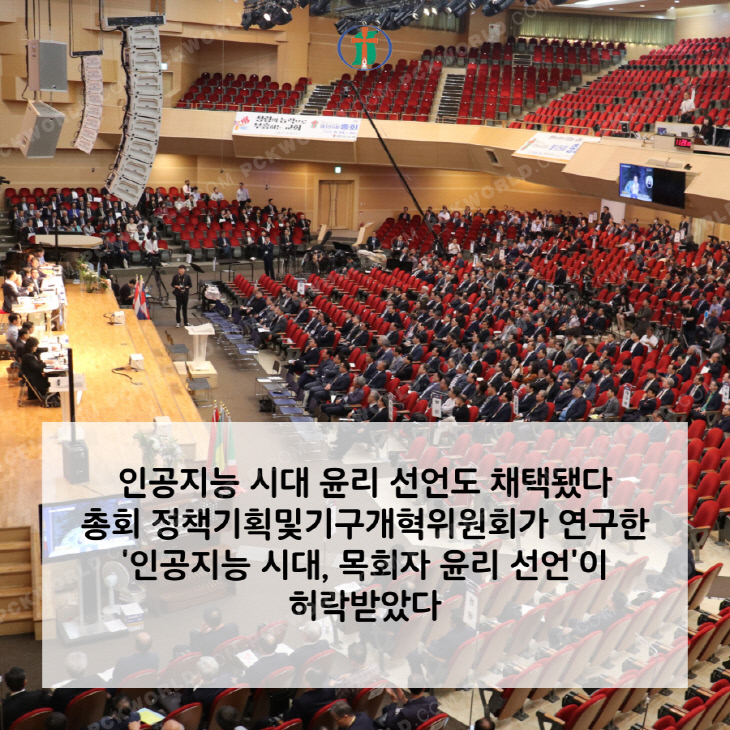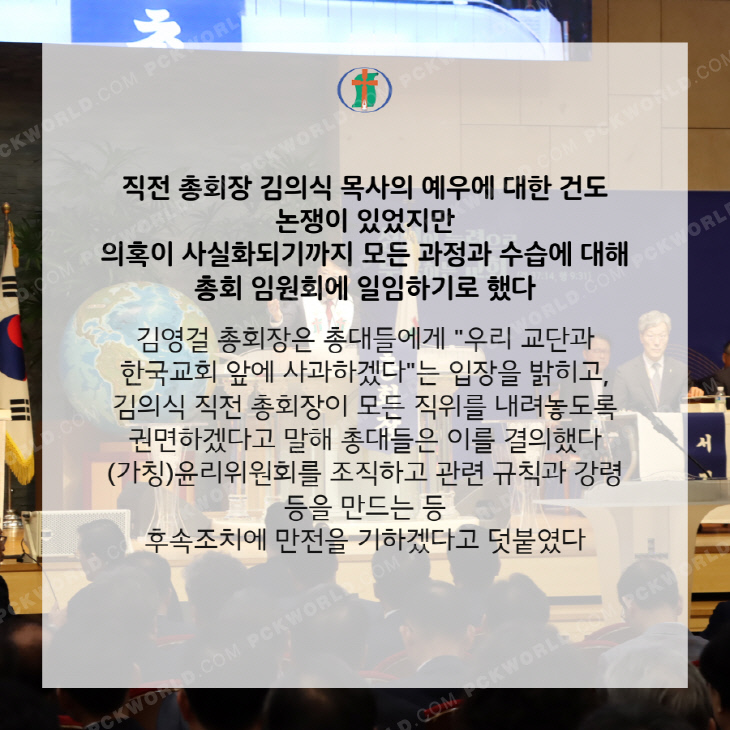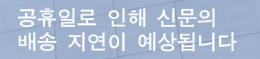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NGO칼럼 ] NGO칼럼
도쿄에서 첼리스트로 일하던 사내가 고향으로 돌아와, 죽은 이들의 몸을 단장해주는 염습사로 일하는 과정을 그린 '굿바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 일을 전수한 스승은 주검을 정성껏 닦고 난 뒤 저녁을 먹으며 주인공에게 말한다. "염을 한 뒤에도 밥을 먹어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음식이 맛있기도 하다네. 우리는 어떤 생명의 죽음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의 죽음인 것은 분명하다.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도 허겁지겁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숨 달린 생명체의 숙명인 것이다.
최근 한살림에서는 유정란 때문에 작은 논쟁이 일었다. 한살림이 정해놓은 유정란 생산 기준에 맞추자면, 닭장은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구조로 지붕에도 창이 나 있어 볕이 잘 들게 해야 한다. 흙 바닥 위에 짚과 풀을 깔고 한 평 당 15마리 이내로 마리 수를 제한하고 산란상자는 지상 45센티미터 가량 높이에 매달아 놓고 암막을 드리워 암탉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암수가 어울려 활개 치면서 생명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닭들의 생체리듬 때문에 산란율이 60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유정란이 현저히 부족해진다. 그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도시 소비자들은 매일 먹다시피 하는 계란을 살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라면 기계를 증설해 생산을 늘리겠지만 그럴 수도 없다. 부족한 유정란을 한살림 생산자가 아닌 외부의 농부들로부터 수급하려고 해도 동일한 사육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들이 더러 있지만 이도 한살림이 정한 기준에는 많이 모자란다. 한살림이 평당 15마리로 밀집사육을 제한한데 비해 동물복지인증 기준은 30마리 이내다. 축사 등 사육 조건이 느슨한 것이다.
한살림은 고육지책으로 닭들이 알을 적게 낳는 동안만이라도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유정란을 구해 별도 표시를 하고 가격에 차등을 두어 공급하자는 논의를 했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자는 입장과 기본 식품인 유정란을 소비량만큼 공급하고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게 하자는 입장이 맞섰지만, 결국 한시적으로 동물복지인증 유정란도 공급한다는 입장이 논란 끝에 수용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년 한 해 1인당 평균 254개씩 계란을 먹었다고 한다. 시중의 계란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인 경우, 좁은 케이지를 칸칸이 쌓아올린 닭장에 갇힌 닭들이 제대로 잠도 잘 수 없게 한 환경에서 생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계가 상품을 찍어내듯 닭들을 내모는 것이다. 상품과 시장의 논리는 명확하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닭이나 계란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모두 생명이라는 생각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 경제적 효율만을 앞세우는 세태가 우리 농업과 밥상을 위태롭게 만들어 왔다, 계란 한 알 앞에서 생명이 생명을 먹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떠올린다.
김성희 상무 / 한살림연합 기획홍보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