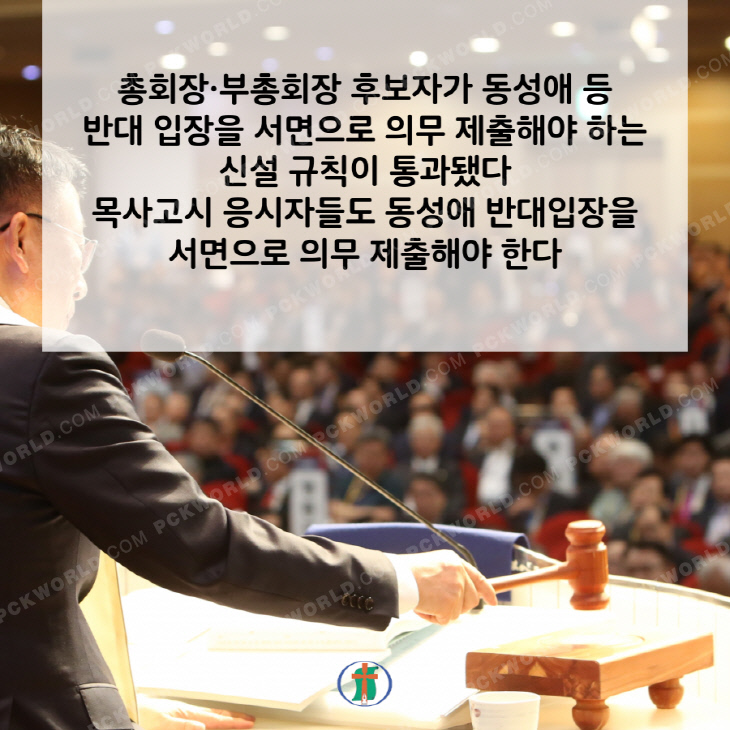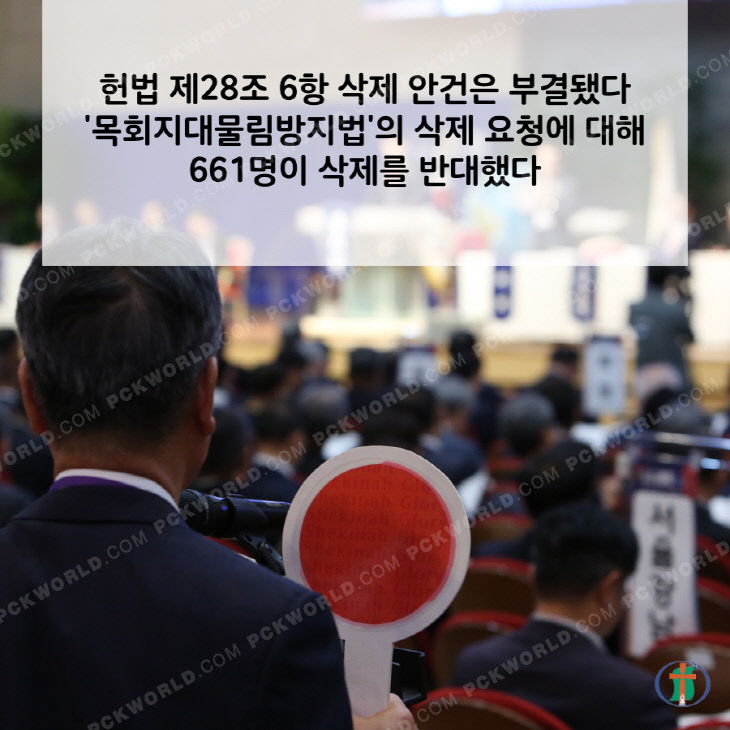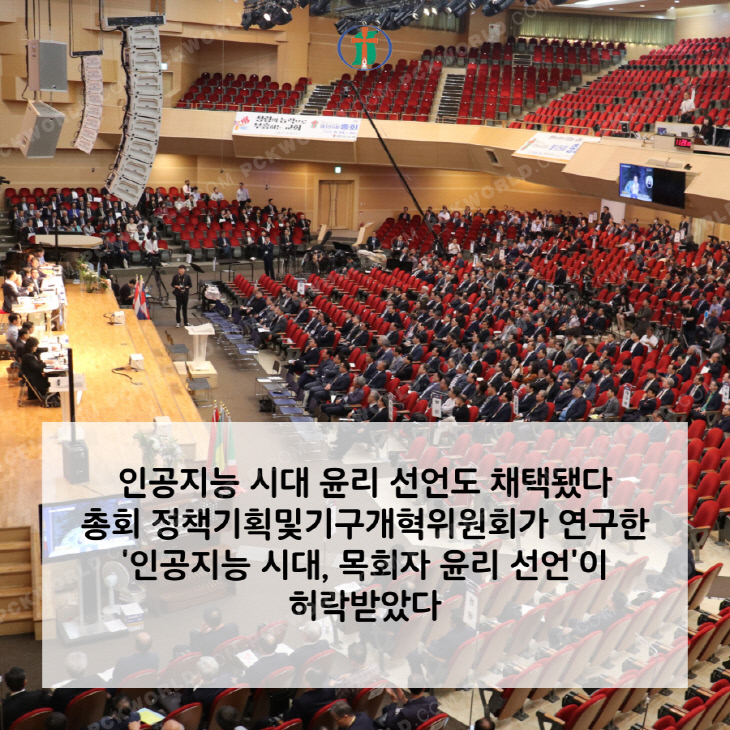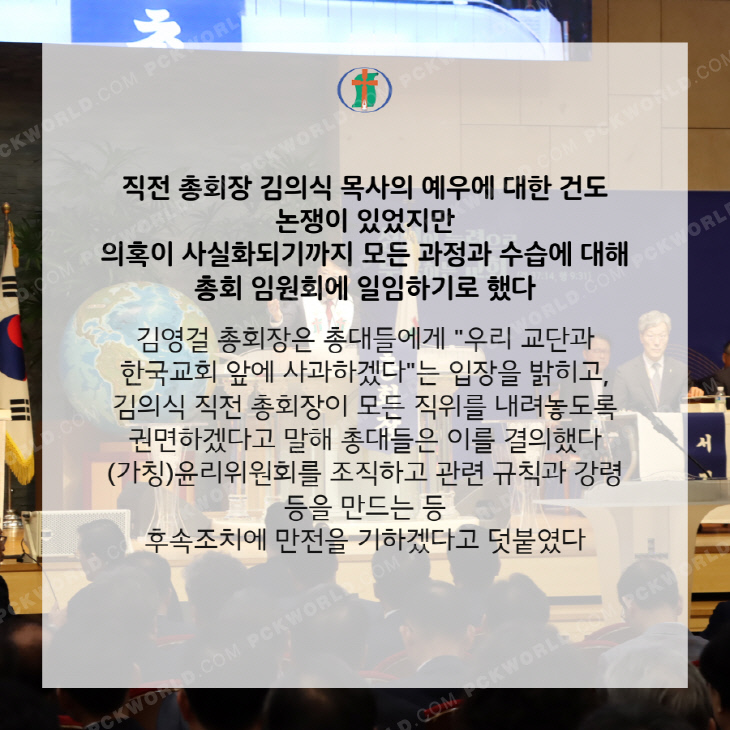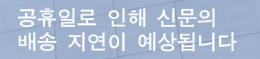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NGOм№јлҹј ] NGOм№јлҹј
мһҘм• мқёл“Өм—җкІҢ м§Ғм—…мқҖ 'м„ нғқн• мҲҳ мһҲлҠ” л¬ҙм—Ү'мқҙ м•„лӢҲлӢӨ. мӢ мІҙм Ғмқё м ңм•Ҫ л•Ңл¬ём—җ 'н•ҳкі мӢ¶мқҖ мқј'ліҙлӢӨлҠ” 'н• мҲҳ мһҲлҠ” мқј'мқ„ м„ нғқн•ҳлҠ” кІҪмҡ°к°Җ л§Һ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ҹјм—җлҸ„ л¶Ҳкө¬н•ҳкі л§ҺмқҖ мһҘм• мқёл“Өмқҙ мқјн„°лЎң лӣ°м–ҙл“ лӢӨ. мӢӨл Ҙмқ„ мҢ“кі м„ұкіөн•ҳкё° мң„н•ҙ мқҙл“ӨмқҖ 비мһҘм• мқёл“ӨліҙлӢӨ мҲҳмӢӯ л°°, нҳ№мқҖ мҲҳл°ұ л°°мқҳ л…ёл Ҙмқ„ кё°мҡёмқёлӢӨ. н•ҳм§Җл§Ң к·ёкІғл§ҢмңјлЎңлҠ” л¶ҖмЎұн•ҳлӢӨ. мқҙл“ӨмқҖ мӮ¬нҡҢ м•Ҳм—җ лҝҢлҰ¬л°•нһҢ м°Ёлі„, нҺёкІ¬кіјлҸ„ л¶Җм§Җлҹ°нһҲ мӢёмӣҢм•ј н•ҳкё° л•Ңл¬ёмқҙлӢӨ.
мҡ°лҰ¬ ліөм§ҖкҙҖмқҖ 1999л…„ к°ңкҙҖ л•Ңл¶Җн„° мҶҚкё°мӮ¬, н…”л Ҳл§ҲмјҖн„° л“ұ мӢңк°ҒмһҘм• мқёл“Өмқҳ мқјмһҗлҰ¬ м°Ҫм¶ңмқ„ мң„н•ҙ л…ёл Ҙн•ҙмҷ”лӢӨ. мқјлЎҖлЎң, мҶҚкё°мӮ¬лҘј м–‘м„ұн•ҙ мӢңк°ҒмһҘм• мқёл“Өмқ„ көӯнҡҢлЎң м·Ём—…мӢңнӮЁ м Ғмқҙ мһҲлӢӨ. н•ҳм§Җл§Ң м–јл§Ҳ м§ҖлӮҳм§Җ м•Ҡм•„ мқјмһҗлҰ¬к°Җ л§Һм§Җ м•ҠлӢӨлҠ” нҳ„мӢӨм—җ л¶Җл”Әнҳ”лӢӨ. н…”л Ҳл§ҲмјҖн„°лқјлҠ” м§Ғм—…кө°м—җлҸ„ лҸ„м „н–Ҳм§Җл§Ң м—‘м…ҖлЎң л§Ңл“Өм–ҙ진 мһҗлЈҢлҘј л№ЁлҰ¬ нҢҢм•…н•ҙм•ј н•ҳлҠ” мқјмқҙ л§Һм•ҳкё°м—җ мӢңк°ҒмһҘм• мқёл“ӨмқҖ м—…л¬ҙ м Ғмқ‘м—җ л§ҺмқҖ м–ҙл ӨмӣҖмқ„ кІӘм—ҲлӢӨ.
к·ёлҹ¬лӢӨ мөңк·ј лҸ„м „н•ҙ м„ұкіөн•ң м§Ғм—…кө°мқҙ мһҲлӢӨ. л°”лЎң м»Өн”јлҘј л§Ңл“ңлҠ” л°”лҰ¬мҠӨнғҖмқҙлӢӨ. 2008л…„, ліөм§ҖкҙҖм—җм„ңлҠ” мӨ‘лҸ„ мӢӨлӘ…н•ң м—¬м„ұмӢңк°ҒмһҘм• мқё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л°”лҰ¬мҠӨнғҖ м–‘м„ұнӣҲл Ёмқ„ мӢңмһ‘н–ҲлӢӨ. к·ё кІ°кіј м§ҖкёҲк№Ңм§Җ 100м—¬ лӘ…мқҳ мӢңк°ҒмһҘм• мқё л°”лҰ¬мҠӨнғҖлҘј л°°м¶ңн–Ҳкі , 4к°ңмқҳ 'м№ҙнҺҳлӘЁм•„' м§Җм җ(лҙүмІңм җ, мҲҷлӘ…м—¬лҢҖм җ, кҙҖм•…кө¬мІӯм җ, мӢӨлЎңм•”м•Ҳкіјлі‘мӣҗм җ)мқ„ м—ҙм–ҙ 10лӘ…мқҙ л„ҳлҠ” мӢңк°ҒмһҘм• мқё л°”лҰ¬мҠӨнғҖл“Өмқҙ мқјн• мҲҳ мһҲлҸ„лЎқ м§Җмӣҗн•ҳкі мһҲлӢӨ.
л¬јлЎ к·ё кіјм •мқҖ мүҪм§Җ м•Ҡм•ҳлӢӨ. л°”лҰ¬мҠӨнғҖлҠ” лңЁкұ°мҡҙ м—ҙмқ„ лӢӨлЈЁлҠ” м§Ғм—…мқҙлқј м•һмқҙ мһҳ ліҙмқҙм§Җ м•ҠлҠ” мӢңк°ҒмһҘм• мқёл“Өмқ„ м„ лң» көҗмңЎмғқмңјлЎң л°ӣм•„мЈјлҠ” көҗмңЎкё°кҙҖмқҙ м—Ҷм—Ҳ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һҳм„ң ліөм§ҖкҙҖ лӢҙлӢ№мһҗл“ӨмқҖ мқҙл“Өмқ„ көҗмңЎмӢңмјңмӨ„ кіімқ„ м°ҫм•„ мқҙлҰ¬м ҖлҰ¬ лӣ°м–ҙлӢӨл…”кі , к·ё кІ°кіј л°©л°°лҸҷмқҳ н•ң м»Өн”јл¬ёнҷ”мӣҗм—җм„ң мқҳлҜё мһҲлҠ” мІ« көҗмңЎмқ„ мӢңмһ‘н• мҲҳ мһҲм—ҲлӢӨ.
мӢңк°ҒмһҘм• мқёл“ӨмқҖ л°”лҰ¬мҠӨнғҖ көҗмңЎм—җм„ң мҙүк°Ғкіј мІӯк°Ғмқ„ мөңлҢҖн•ң л§Һмқҙ нҷңмҡ©н–ҲлӢӨ. мһ¬лЈҢмқҳ 비мңЁмқ„ л§һ추기 мң„н•ҙ м»өмқ„ лҲҲм—җ к°Җк№Ңмқҙ лҢҖлҠ” кІғмқ„ м ңмҷён•ҳкі лҠ” кұ°мқҳ лӘЁл“ мһ‘м—…мқҙ мҙүк°Ғкіј мІӯк°Ғмқ„ мқҳмЎҙн•ҙ мқҙлӨ„мЎҢлӢӨ. л•Ңл¬ём—җ к°Ғк°Ғмқҳ кіјм •мқҙ мҶҗкіј к·Җм—җ мқөмҲҷн•ҙм§Ҳ л•Ңк№Ңм§Җ мҲҳлҸ„ м—Ҷмқҙ м—°мҠөн•ҙм•ј н–ҲлӢӨ. мҳҲлҘј л“Өл©ҙ, мҠӨнҢҖл…ёмҰҗ(мҡ°мң лҘј лҚ°мҡё л•Ң мӮ¬мҡ©н•ҳлҠ” м»Өн”јлЁёмӢ мқҳ н•ң л¶Җ분)м—җм„ң лӮҳмҳӨлҠ” мҰқкё°мҷҖ мҡ°мң н‘ңл©ҙмқҙ л§Ҳм°°н• л•Ң 'м№ҷ' мҶҢлҰ¬к°Җ лӮҳлҠ” лҚ° мқҙ мҶҢлҰ¬к°Җ л‘җ лІҲ лӮҳл©ҙ м№ҙнҺҳлқјл–ј, лӢӨм„Ҝ лІҲ лӮҳл©ҙ м№ҙн‘ём№ҳл…ёлҘј л§Ңл“Өкё°м—җ м ҒлӢ№н•ҳлӢӨлҠ” кІғмқ„ мІҙл“қн• м •лҸ„мҳҖлӢӨ. к·ёлһҳм„ң мҡ°мҠӨк°ҜмҶҢлҰ¬лЎң "м»Өн”јлҠ” м•Ҳ ліҙмқҙм§Җл§Ң м»Өн”ј н–ҘмқҖ ліҙмқёлӢӨ"кі л§җн• м •лҸ„мҳҖлӢӨ. к·ё кІ°кіј мқҙм ңлҠ” 'м№ҷ' мҶҢлҰ¬л§Ң л“Өм–ҙлҸ„ м»Өн”јк°Җ м ңлҢҖлЎң л§Ңл“Өм–ҙм§ҖлҠ”м§Җ м•„лӢҢм§ҖлҘј к°ҖлҠ н• мҲҳ мһҲлҠ” мӢӨл Ҙмһҗк°Җ лҗҳм—ҲлӢӨ.
мқҙл Үл“Ҝ м–ҙл өкІҢ мӢңк°ҒмһҘм• мқё л°”лҰ¬мҠӨнғҖлҘј м–‘м„ұн–Ҳм§Җл§Ң, м •мһ‘ мқҙл“Өмқҙ мқј н• кіімқҖ л„Ҳл¬ҙ л¶ҖмЎұн•ҳлӢӨ. көҗнҡҢм—җм„ң мҡҙмҳҒн•ҳлҠ” л¶Ғ м№ҙнҺҳлӮҳ м»Өн”јмҲҚм—җлҸ„ мҲҳм°ЁлЎҖ м°ҫм•„к°”м§Җл§Ң, мһҗмІҙм ҒмңјлЎң мҡҙмҳҒн•ҳкі мһҲ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мҷ„кіЎн•ҳкІҢ кұ°м Ҳн•ҳлҠ” кіімқҙ л„Ҳл¬ҙ л§Һм•ҳлӢӨ.
мҶҚмғҒн•ң л§ҲмқҢмқҙ м•һм„ лӢӨ. мһҘм• мқёл“Өм—җкІҢлҠ” н•Ёк»ҳ мҳҲл°°лҘј л“ңлҰҙ мҲҳ мһҲлҠ” кё°нҡҢлҝҗ м•„лӢҲлқј, н•Ёк»ҳ мқјн•ҳл©° м„ұлҸ„л“Өмқ„ кё°мҒҳкІҢ 섬길 мҲҳ мһҲлҠ” кё°нҡҢ м—ӯмӢң н•„мҡ”н•ҳлӢӨ. мқҙл“Өм—җкІҢ 진м§ң н•„мҡ”н•ң кұҙ мһҗлҰҪн• мҲҳ мһҲлҠ” 'кё°нҡҢ'мқҙкё° л•Ңл¬ёмһ…лӢҲлӢӨ. мһҘм• к°Җ мһҲ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н•ӯмғҒ мқҙмӣғмқҳ лҸ„мӣҖмқ„ л°ӣм•ҳлҚҳ мқҙл“ӨлҸ„ м„ұлҸ„л“Өмқ„ мң„н•ҙ м»Өн”јлҘј л§Ңл“Өкі лҙүмӮ¬лҘј н•ҳл©° н•„мҡ”лҘј мұ„мӣҢмЈјлҠ” н•ң мӮ¬лһҢмқҙ лҗ мҲҳ мһҲлӢӨлҠ” кІғмқ„ кё°м–өн•ҙмЈјм…Ёмңјл©ҙ н•ңлӢӨ. к·ёлһҳм„ң мҳ¬ н•ҙм—җлҠ” лӢӨлҘё кіімқҙ м•„лӢҢ л°”лЎң н•ңкөӯкөҗнҡҢ м•Ҳм—җ мӢңк°ҒмһҘм• мқё л°”лҰ¬мҠӨнғҖк°Җ мқјн• мҲҳ мһҲлҠ” м№ҙнҺҳлӘЁм•„ 5нҳём җ, 6нҳём җмқҙ мғқкІЁлӮҳкё°лҘј мҶҢл§қн•ң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