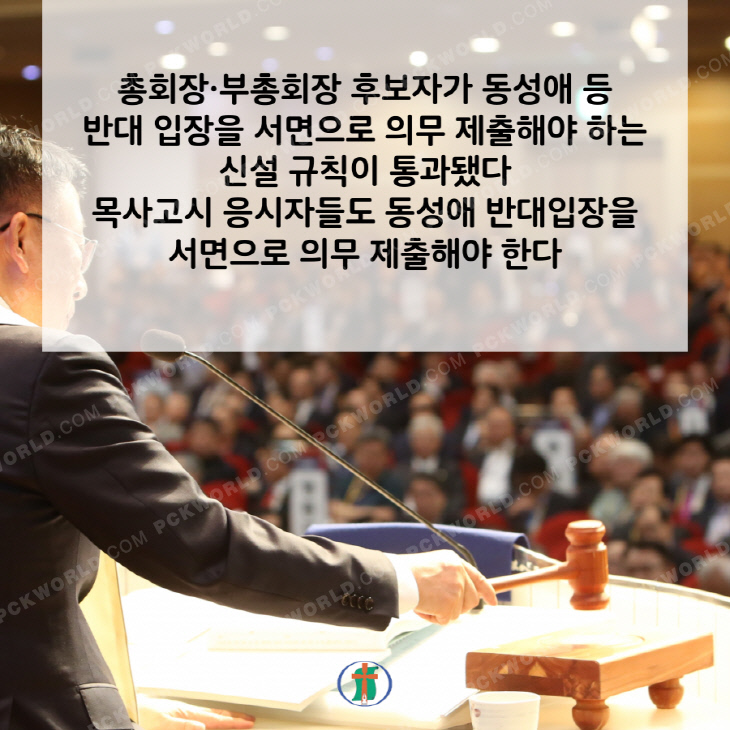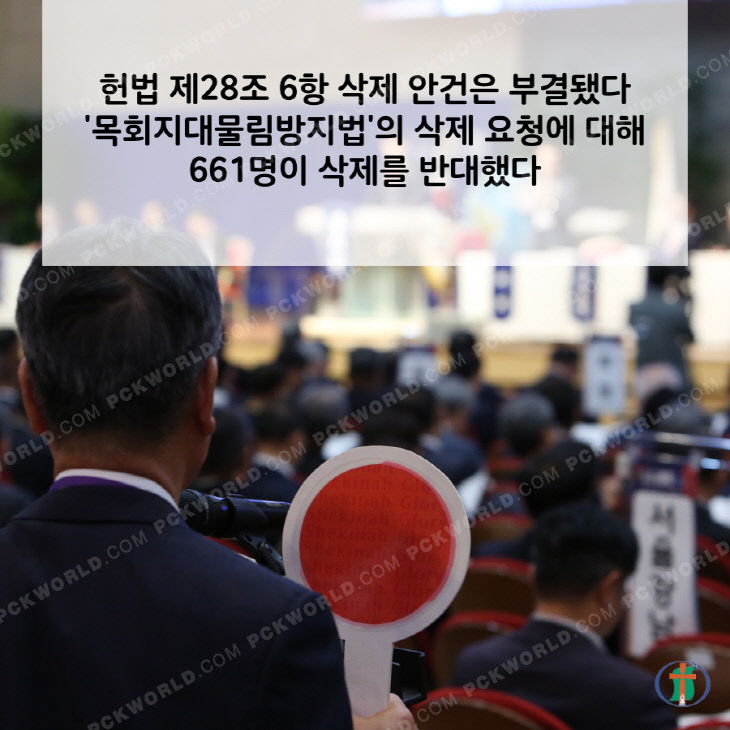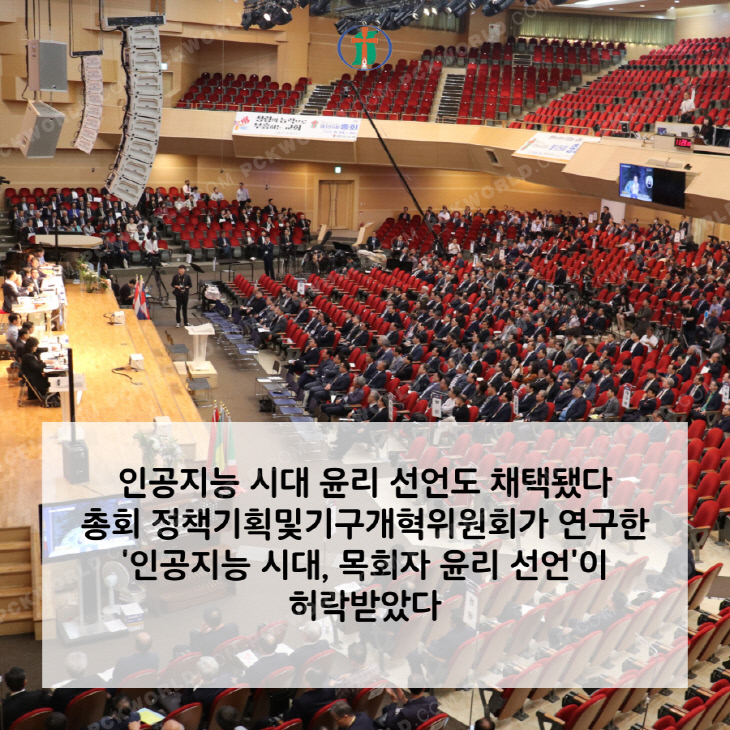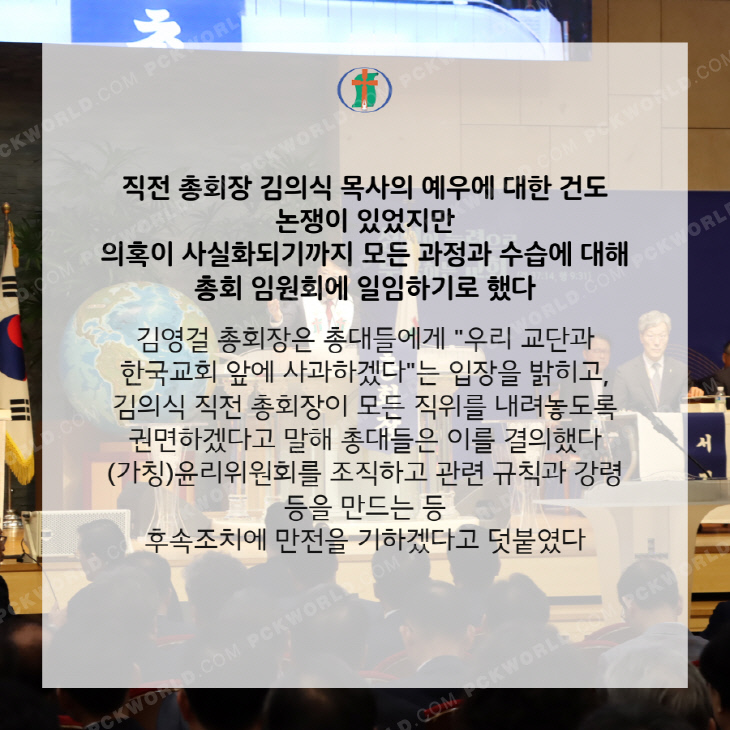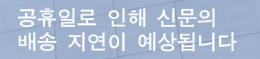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NGO칼럼 ] NGO칼럼
30여 년 전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보다 '사회사업'이라는 단어가 익숙했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때였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왜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몇 명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웃지 못 할 답을 내놓곤 했다.
처음 일했던 현장은 양동(현재의 남대문로5가)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표적인 사창가였다.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었기에 시각장애인 피아노 조율 교육, 여고생 타자교육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함께 공부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선배 사회복지사와 산꼭대기 판자촌을 누볐고, 그로인해 금새 구두 옆구리가 터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 번째로 근무하였던 곳은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던 시흥2동이었다.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밑반찬 등 생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특히 의료보험(현재의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시행되지 않던 1989년 이전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영세민들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는 병이 나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교훈을 얻기도 했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주 1회 무료진료실을 운영했고, 매번 70여 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가끔씩 진료 후 무료로 조제해 주는 약을 찾아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진료비도 무료, 약도 무료다 보니 '이 약이 제대로 된 약일리가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며 또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명령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거져 주는 것만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병을 낫게 할 약이 가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모는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절대 혼자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그 음식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신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가 우리를 신뢰한다면, 모든 말이나 행동을 믿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다. 이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단 사회복지사를 믿어야 자신의 처지 등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신뢰하며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역시 이 믿음을 토대로 복음의 작은 불씨도 전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한국교회도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듯 사회와 신뢰 관계 형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소통과 변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재원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ㆍ새문안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