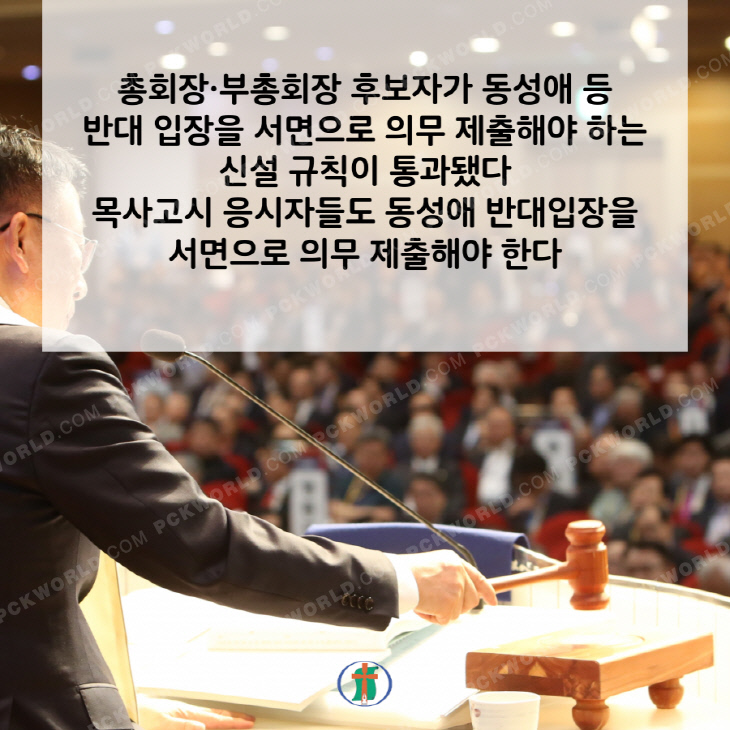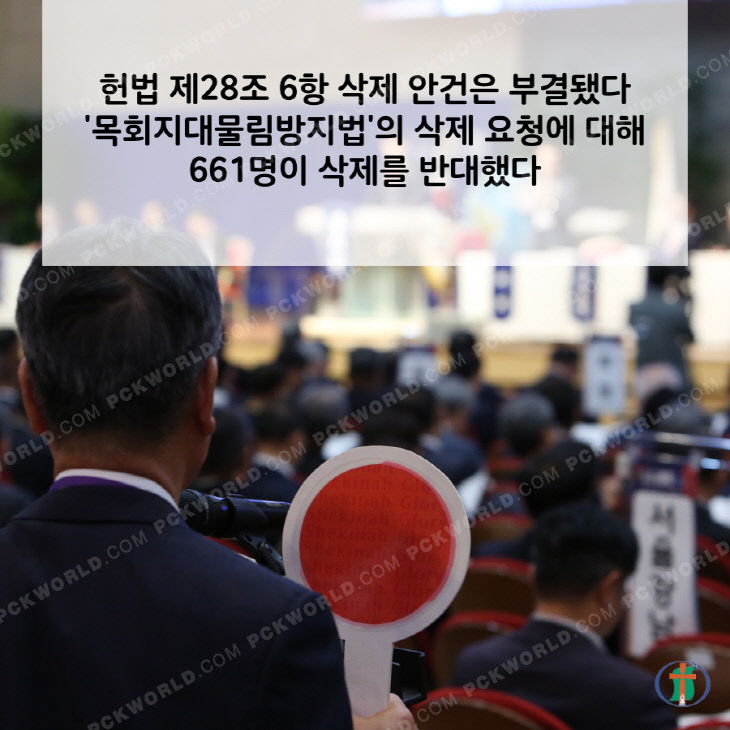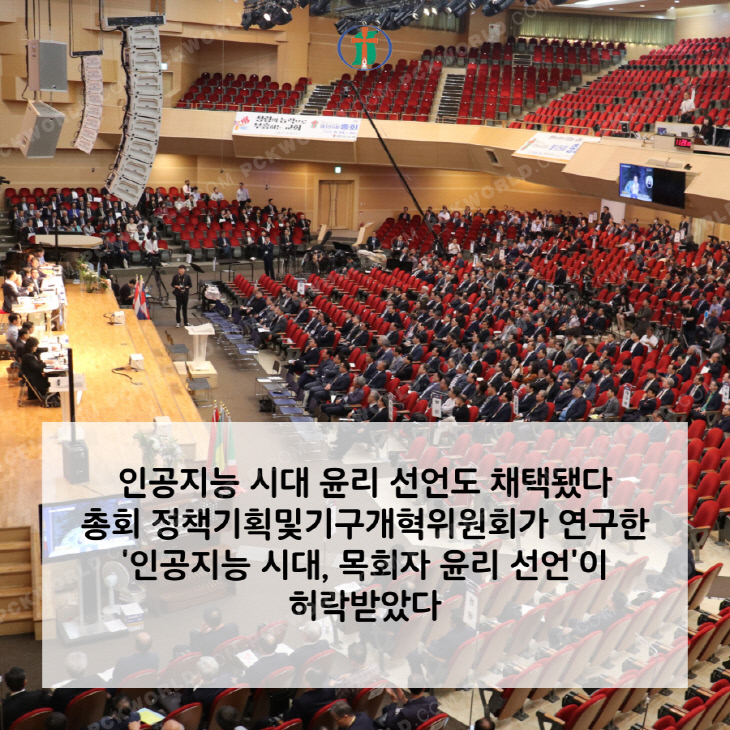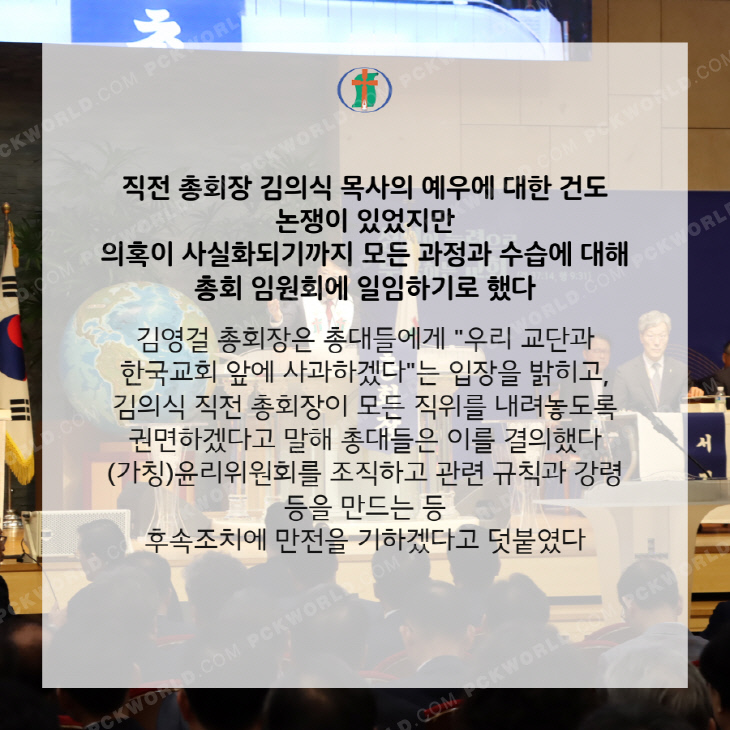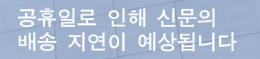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л•…лҒқм—җм„ңмҳЁнҺём§Җ ] л•…лҒқм—җм„ңмҳЁнҺём§Җ
к¶ҢкІҪмҲҷ м„ көҗмӮ¬
2013л…„ 11мӣ” 29мқј(кёҲ) 16:41
 |
||
| в–І к¶ҢкІҪмҲҷ м„ көҗмӮ¬к°Җ мӮ¬м—ӯн•ҳкі мһҲлҠ” лӘЁлҰ¬нғҖлӢҲ мӮ¬л§ү л§Ҳмқ„ | ||
1994л…„ 11мӣ” 27мқј, л§Ҳм№ЁлӮҙ лӮҳлҠ” лӘЁлҰ¬нғҖлӢҲ мқҙмҠ¬лһҢ кіөнҷ”көӯмңјлЎң нҢҢмҶЎлҗҗлӢӨ. к·ё мҲңк°„л¶Җн„° лӮҳлҠ” к¶ҢкІҪмҲҷмқҙ м•„лӢҢ л§ҲмқҙнҒҙмқҙ лҗҳм—ҲлӢӨ. л§Ңм—җ н•ҳлӮҳ лӮҙк°Җ мІҙнҸ¬лҗҳм–ҙ м•„лһҚ мў…көҗлІ•м •м—җ м„ңлҚ”лқјлҸ„ лӮҙ м •мІҙлҘј нҢҢм•…н•ҳлҠ” кұё м§Җм—°мӢңнӮӨл ӨлҠ” мқҳлҸ„м—җм„ңмҳҖлӢӨ. лӘЁлҰ¬нғҖлӢҲк°Җ н•ҳлӮҳлӢҳмқҙ лӮҙкІҢ мЈјмӢ мӢңмҳЁмқҳ л•…мқҙлқјлҠ” лҚ° н•ң м җ мқҳнҳ№мқҙ м—Ҷм—ҲлӢӨ. л¬јлЎ мқҙкіім—җ л°ңмқ„ л”ӣкё° м „к№Ңм§Җ лӮҳлҠ” лӘЁлҰ¬нғҖлӢҲлқјлҠ” лӮҳлқјк°Җ м§Җкө¬мғҒм—җ мһҲлҠ”м§ҖмЎ°м°Ё лӘ°лһҗлӢӨ.
гҖҖ
лӘЁлҰ¬нғҖлӢҲлҘј м•ҢкІҢ лҗң кұҙ 92л…„ 5мӣ”, нӣҢм©Қ л– лӮң мң лҹҪ м—¬н–үм—җм„ңмҳҖлӢӨ. л§Ңмқёмқҳ м—°мқёмқё нҢҢлҰ¬лҠ” лӮҳм—җкІҢ к°җлҸҷмқ„ мЈјм§Җ лӘ»н–ҲлӢӨ. м–ҙл””лЎң к°Ҳк№Ң м§ҖлҸ„лҘј л“Өм—¬лӢӨліҙлҚҳ мӨ‘ л¶Ғм•„н”„лҰ¬м№ҙк°Җ лҲҲм—җ л“Өм–ҙмҷ”лӢӨ. м§ҖмІҙн•ҳм§Җ м•Ҡкі м—¬м •мқ„ м•„н”„лҰ¬м№ҙлЎң л°”кҝ”лІ„л ёлӢӨ. н”„лһ‘мҠӨм—җм„ң лӘЁлҰ¬нғҖлӢҲлЎң лӮ м•„к°”лӢӨ. мӮ¬л§үмқҖ мғҒмғҒн•ң кІғ мқҙмғҒмңјлЎң кҙ‘лҢҖн–ҲлӢӨ. 비н–үкё°м—җм„ң лӮҙл ӨлӢӨліҙлӢҲ л„ҳмӢӨлҢҖлҠ” лӘЁлһҳлҠ” кұ°лҢҖн•ң л№ӣл¬ҙлҰ¬мҳҖлӢӨ. м§ҖнҸүм„ к№Ңм§Җ мҳЁнҶө нқ° лӘЁлһҳк°Җ л„ҳмӢӨлҢҖлҠ” кІғмқ„ лҲҲмқҙ л¶Җм…”м„ң к°җнһҲ л°”лқјліј мҲҳ м—Ҷм—ҲлӢӨ. лӘЁл“ лӘЁлһҳ м•Ңк°ұмқҙ мҶҚм—җм„ң л№ӣмқҙ мғҲм–ҙлӮҳмҳӨлҠ” л“Ҝн–ҲлӢӨ. к·ё мҲңк°„ лҒқмқҙ м—ҶлҠ” кІғмқҙ л¬ҙм—Үмқём§Җ мғқк°Ғн–ҲлӢӨ. лӮҙ лҲҲм•һм—җ нҺјміҗ진 мқҙ мӮ¬л§үмқҙм•јл§җлЎң н•ҳлӮҳлӢҳмқҳ лҒқмқҙ м—ҶлҠ” мқҖнҳңлҘј нҺјміҗлҶ“мқҖ кІғ к°ҷм•ҳлӢӨ. "н•ҳлӮҳлӢҳ, м Җ л•…м—җ мӮ¬лһҢмқҙ мӮҪлӢҲк№Ң? л§Ңм•Ҫм—җ м Җ л•…м—җ мӮ¬лһҢмқҙ мӮҙл©ҙ к·ё мғқлӘ…мқ„ мң„н•ҙ мқјн•ҳкІ мҠөлӢҲлӢӨ." мғқк°Ғм§ҖлҸ„ лӘ»н•ң кё°лҸ„к°Җ м–јл§ҲлӮҳ кі„мҶҚлҗҳм—ҲлҠ”м§Җ лӘЁлҘҙкІ лӢӨ. н•ҳм§Җл§Ң лӘЁлҰ¬нғҖлӢҲм—җ лҸ„м°©н•ң л©°м№ лҸҷм•Ҳ лӮҳлҠ” м§ҖмҳҘкіј мІңкөӯмқ„ мҳӨк°”лӢӨ. л°”лһҢмқҙ л¶Ҳл©ҙ кёёмқҙл©° м°Ёл©° кұҙл¬јмқ„ л¶үмқҖ нҡҢмҳӨлҰ¬к°Җ мӮјмјңлІ„л ёлӢӨ. лҲҲмқ„ к°җм§Җ м•Ҡмңјл©ҙ м•Ҳлҗҳм—ҲлӢӨ. лҲҲмқ„ л– лҸ„ мӢңм•јлҠ” нқҷлЁјм§Җм—җ к°Җл Ө мӢңкі„лҠ” м ңлЎңмҳҖлӢӨ. к°‘мһҗкё° н•ҳлҠҳмқҙ н•ң м№ҳ м•һмқҙ м•Ҳ ліҙмқј м •лҸ„лЎң м»ҙм»ҙн•ҙм§ҖлҚ”лӢҲ мһҘлҢҖ비к°Җ мҸҹм•„м§Җкё°лҸ„ н–ҲлӢӨ. н•ҳлҠҳм—җ мһҲлҠ” мӣ…лҚ©мқҙк°Җ мҸҹ아진 кІғмІҳлҹј нқҷнғ•л¬јмқҙ мҡ”лҸҷміӨлӢӨ. лӮ®м—җлҠ” н•ҳм–Җ нғңм–‘мқҙ, л°Өм—җлҠ” мә„мә„н•ң н•ҳлҠҳм—җ лі„мқҙ мҶҗм—җ мһЎнһҗ л“Ҝ л– мһҲм—ҲлӢӨ. мӮ¬л§үм—җм„ң л°”лқјліҙлҠ” н’ҚкІҪмқҖ лҶҖлқјмӣҖ к·ё мһҗмІҙмҳҖлӢӨ. нҳ№мӢң мқҙ н’ҚкІҪмқҙ нғңмҙҲмқҳ н’ҚкІҪмқҙ м•„лӢҗк№Ң мӢ¶мқ„ м •лҸ„лЎң м–ҙл–Ө лҸ„мӢңм—җм„ңлҸ„ м–»м§Җ лӘ»н•ң кІҪмҷёк°җмқ„ лҠҗкјҲлӢӨ.
гҖҖ
к·ёлһҳм„ңмқём§Җ лӘЁлҰ¬нғҖлӢҲ мҲҳлҸ„м—җ н•ҳлӮҳ л°–м—җ м—ҶлҠ” нҳён…”м—җ л¬јмқҙ лӮҳмҳӨм§Җ м•ҠлҠ” лҚ°лҸ„ л¶ҲнҺён•ң мӨ„ лӘ°лһҗлӢӨ. м”»м§Җ лӘ»н•ҳлҠ” кұҙ л‘ҳм§ём№ҳкі нҷ”мһҘмӢӨлҸ„ к°Ҳ мҲҳ м—Ҷм—ҲлҠ”лҚ°лҸ„ л§җмқҙлӢӨ. нҳён…” м§Ғмӣҗл“ӨмқҖ лӮҳм—җкІҢ м•„м№Ё м җмӢ¬ м Җл…ҒмңјлЎң лҳ‘к°ҷмқҖ л°”кІҢлңЁл№өмқ„ мЈјм—ҲлӢӨ. к·ёл§Ҳм ҖлҸ„ м”№мқ„ л•Ңл§ҲлӢӨ лӘЁлһҳк°Җ м”№нҳҖ л°ҳлҸ„ мұ„ лӘ» лЁ№м—ҲлӢӨ. 50лҸ„лҘј мҳӨлҘҙлӮҙлҰ¬лҠ” лҢҖкё°лҠ” к°Җл§ҢнһҲ м„ң мһҲм–ҙлҸ„ мҲЁмү¬кё° м–ҙл өкІҢ л§Ңл“Өм—ҲлӢӨ. к·ёлҹ¬лӮҳ лӮҳлҠ” нҸүмҶҢмҷҖ лӢ¬лҰ¬ нһҳмқҙ лӮЁм•„ лҸҢм•ҳлӢӨ. кұ°лҰ¬лҘј м–ҙмҠ¬л Ғкұ°лҰ¬л©° кІҖкі нҒ° лҲҲл§Ң л№јкјј лӮҙлҜј мӮ¬лһҢл“Өмқ„ нҳёкё°мӢ¬ м–ҙлҰ° лҲҲмңјлЎң кҙҖм°°н•ҳкё° мӢңмһ‘н–ҲлӢӨ. лӮЁмһҗл“ м—¬мһҗл“ лӘЁл‘җ нӮӨк°Җ м»Ө лӮҳлҠ” к·ёл“Өмқҳ н—ҲлҰ¬к»ҳлӮҳ к°ҖмҠҙк»ҳл°–м—җ мҳӨм§Җ м•Ҡм•ҳлӢӨ. лӘЁл‘җл“Ө нқ° мІңмңјлЎң мҳЁлӘёмқ„ к°җмӢј мұ„ л§Ҳм№ҳ мһҘл§үмІҳлҹј лӮҙ м•һмқ„ л§үм•„м„ңкіӨ н–ҲлӢӨ. н•ҳлӮҳлӢҳмқҖ к°‘мһҗкё° лӮҙ лҲҲм•һм—җ нҷҳмғҒмқ„ ліҙм—¬мЈјм—ҲлӢӨ. мһ‘м—ҙн•ҳлҠ” нқ° мӮ¬л§үмқҙ м –кіј кҝҖмқҙ нқҗлҘҙлҠ” л•…мңјлЎң ліҖн•ҳлҠ” лӘЁмҠөмқҙм—ҲлӢӨ. 'мӮ¬л§үм—җ н•Җ л°ұн•©нҷ”м—¬'лқјкі мҶҢлҰ¬лҘј м§ҖлҘј л»”н–ҲлӢӨ. лҲҲм•һм—җ нҺјміҗ진 кҙ‘кІҪмқҙм•јл§җлЎң лӮҙкІҢ мЈјлҠ” л§җм”Җмқҙ м•„лӢҲм—Ҳмқ„к№Ң. "н• л җлЈЁм•ј! мЈјлӢҳмқҙ м“°мӢңлҠ” лҢҖлЎң мқҙкіім—җм„ң ліөмқҢмқ„ м „нҢҢн•ҳкІ мҠөлӢҲлӢӨ. м•„л©ҳ." л§ҲмқҢмқҙ к·ёл ҮкІҢ нҸүмҳЁн• мҲҳк°Җ м—Ҷм—ҲлӢӨ. лӘЁлҰ¬нғҖлӢҲ мқҙмҠ¬лһҢ кіөнҷ”көӯ. мЈјлӢҳмқҙ м§Җм—ҲмңјлӮҳ мЈјлӢҳмқҳ л§җм”Җмқҙ л“Өм–ҙк°Җм§Җ м•ҠмқҖ мқҙл°©мқҳ л•…м—җм„ң л°ӣмқҖ 축ліөмқҙм—ҲлӢӨ.
гҖҖ
ліёкөҗлӢЁ нҢҢмҶЎ лӘЁлҰ¬нғҖлӢҲ к¶ҢкІҪмҲҷ м„ көҗм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