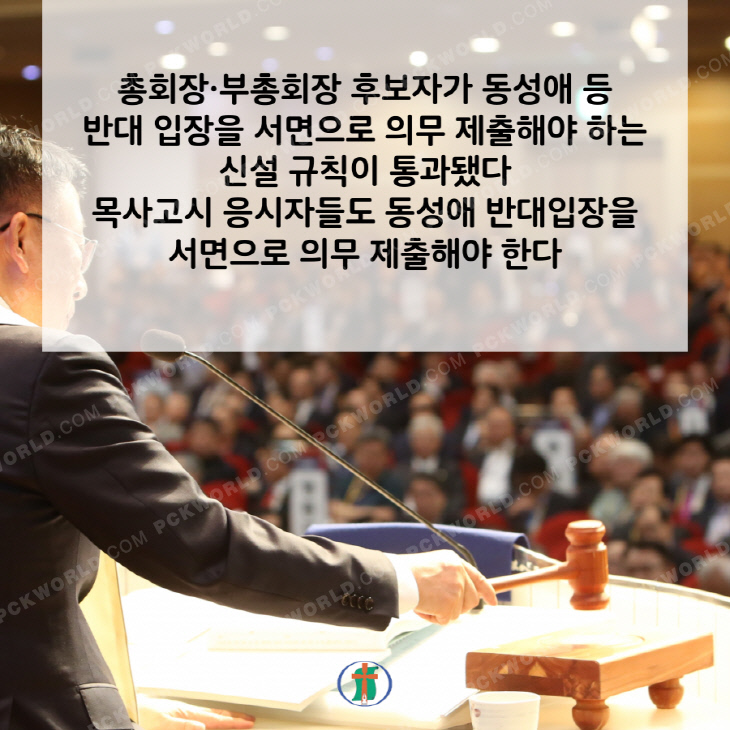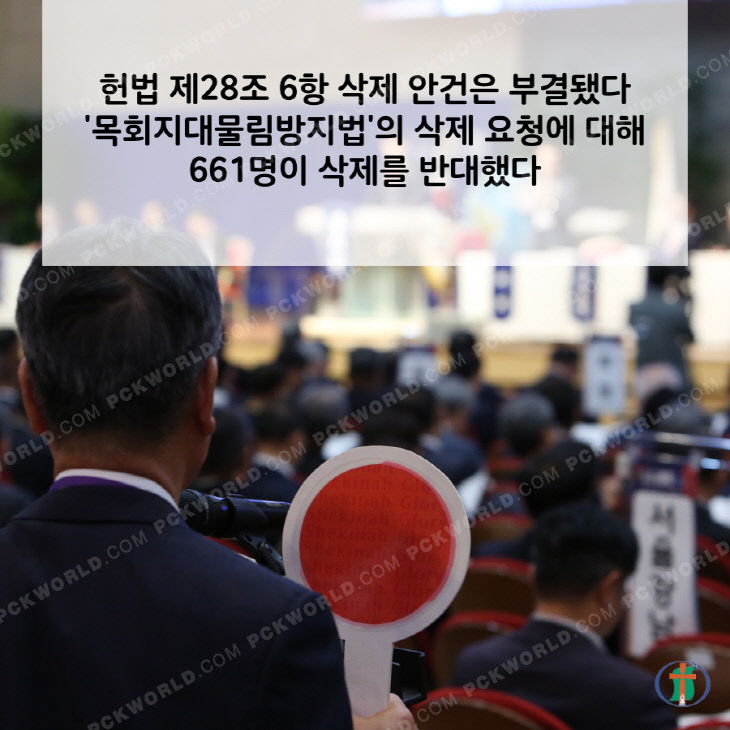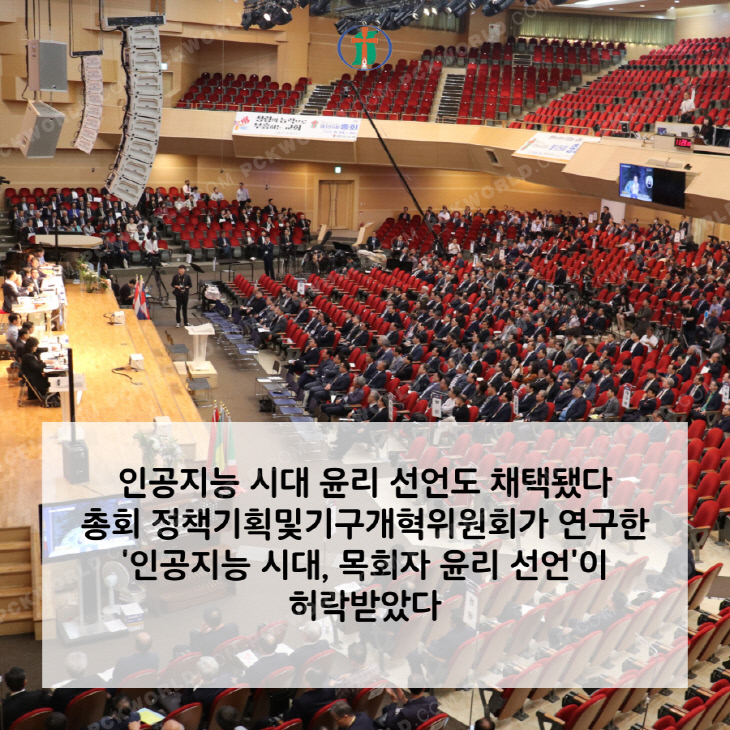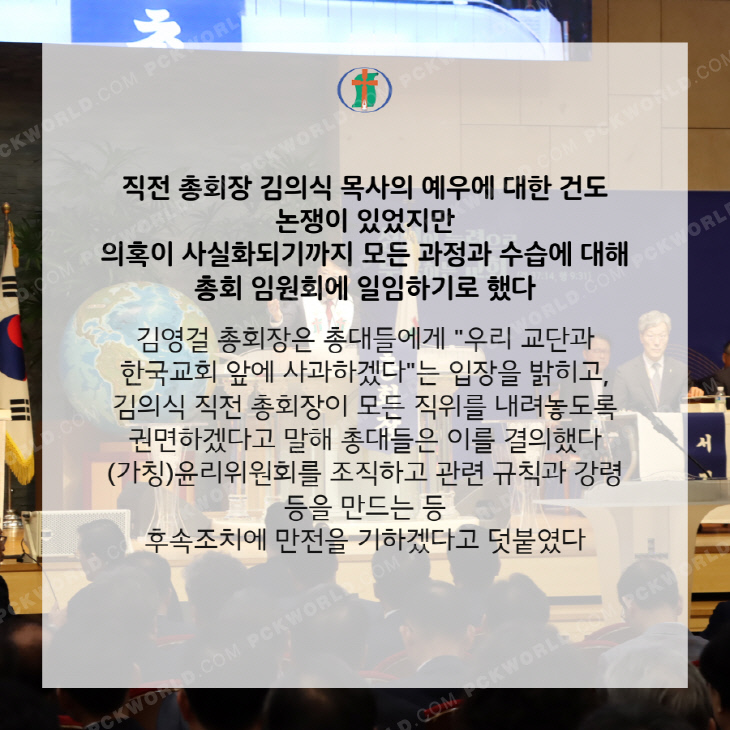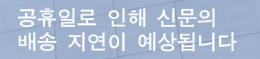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논단 ] 주간논단
법제화 대세지만 부작용도 있어, 합리적 방안 찾았으면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법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한 뒤 올해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 일에 동참했다. 법으로 정했으니 이제 이들 교단에서 담임목사직을 아들 또는 사위에게 넘겨주면 위법이다. 그에 앞서 몇몇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 교단의 세습 금지 법제화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예장 합동측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예장 합동은 '담임 교역자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했으나 법제화는 유보했다. 또한 예장 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세습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교단별로 세습을 보는 시각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습 금지는 명분 싸움에서 앞선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식의 인생이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또는 가난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활력을 앗아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때 수만 명 교인을 둔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이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어간다면 반발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사실 교회가 활기찬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
다만 세습 금지라는 명분에 휩싸여 강제적인 법제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목회자의 아들 또는 사위라고 해서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최상의 선택인지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목회자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품성과 인격을 보고 배운다. 교회 내부 사정에도 정통하다. 성도들의 성향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담임목사와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선택 대상에서 배척하는 것은 이런 노하우를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부적격자에게 중책이 돌아가선 안 된다. 그러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담임목사의 입김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군소리가 없다. 또한 사후에도 급여, 후생, 복지에 대한 특전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교회 재산과 인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투명한 제도의 확립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법제화가 세습을 막는 완벽한 장치도 아니다. 벌써 일부 교회에서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교차세습이 좋은 예다. 이를테면 A교회는 B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을, B교회는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맞교환하는 식이다. 또 일단 후임 목사를 외부에서 영입해 세습 논란을 잠재운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슬쩍 아들이나 사위를 불러오는 징검다리 세습도 있다. 이는 법제화를 통한 세습 금지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연예인 2세, 3세에 흥미를 보인다. TV 또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하면 "아, 그래요?"하면서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정계에서도 2세의 활약은 대단하다. 미국엔 케네디, 부시 가문이 있다. 일본에도 아베 총리를 비롯해 2, 3세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 등 2세 정치인이 꽤 있다. 어느 나라든 대중은 후손을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혈연에 느끼는 친밀감은 인지상정이다.
세습을 무조건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금지보다 좀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격 없는 후손이 부모덕을 보는 것이 잘못이듯 자격 있는 후손이 부모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 역시 잘못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