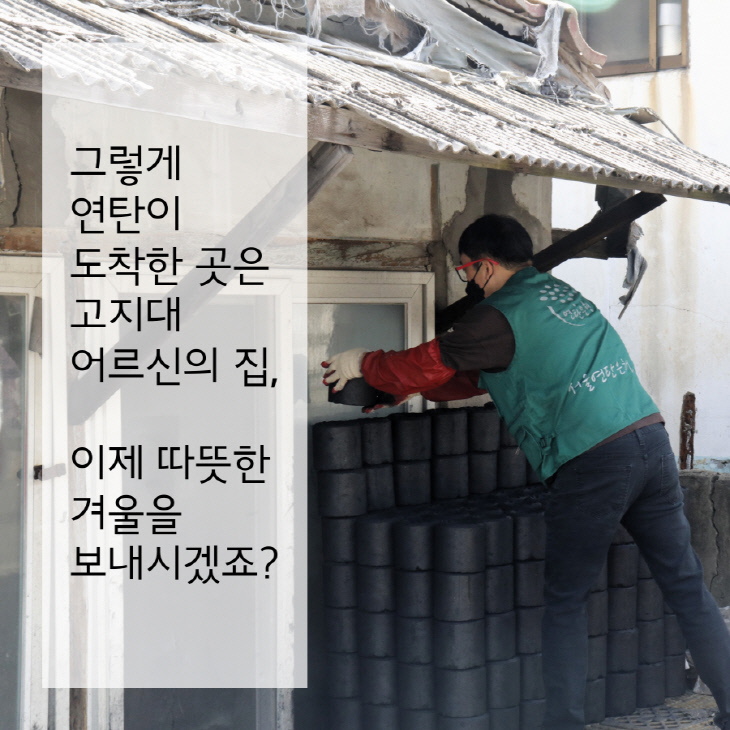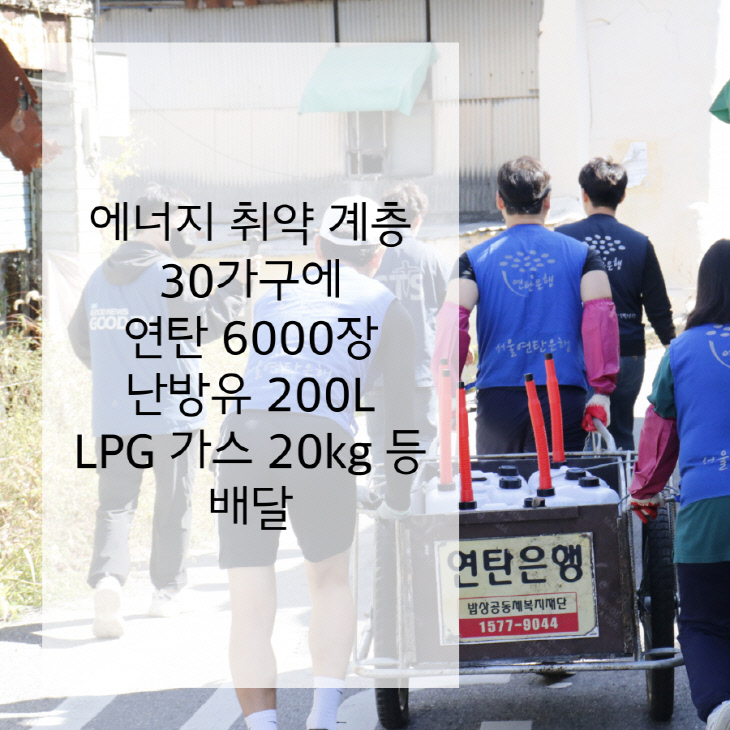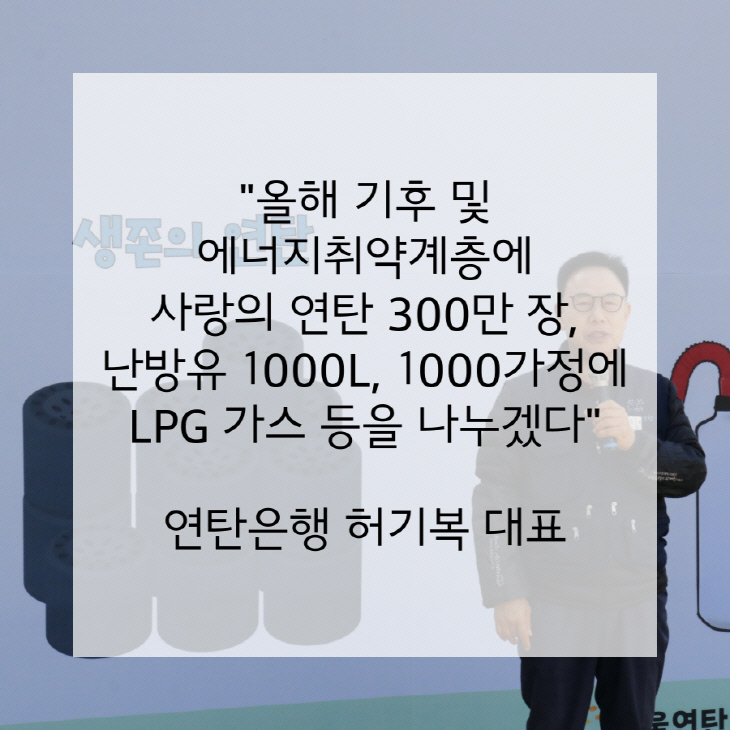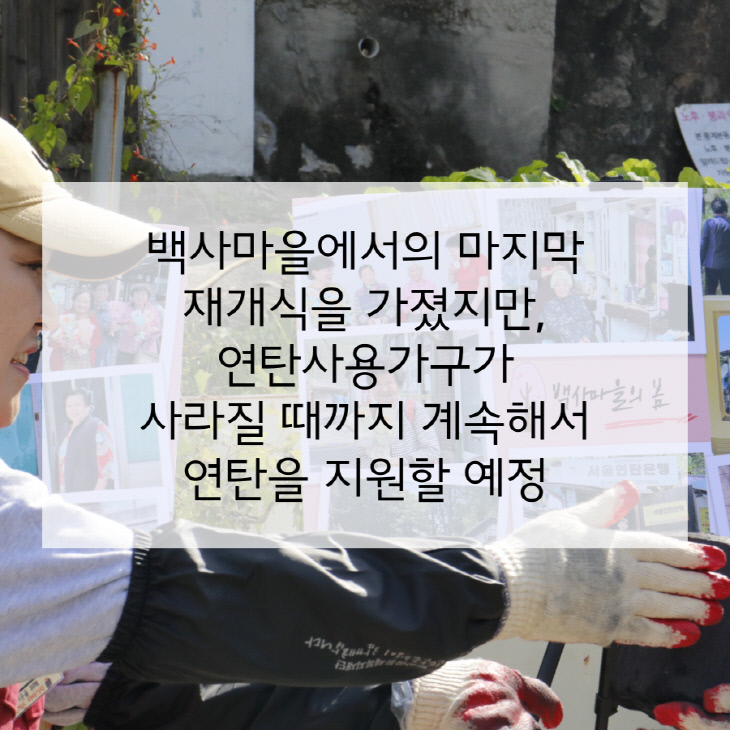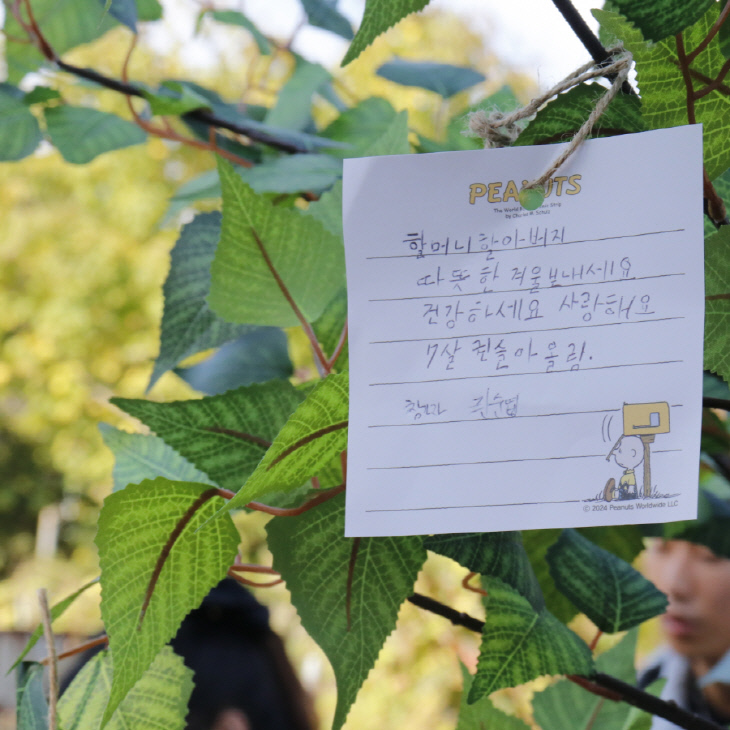[ 말씀&MOVIE ]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도리스 되리 감독, 로맨스/멜로, 드라마, 18세, 2009)
최성수박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4월 24일(화) 14:33
벚꽃 놀이가 한창이다. 벚꽃은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혼과 넋을 빼놓을 정도지만, 사실 가장 덧없는 삶을 상징한다. 순간적으로 흐드러지게 피었다가도 봄철의 실바람에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방으로 흩날리기 때문이다. 다소 역설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럴까, 벚꽃의 아름다움에는 더욱 큰 희소가치가 있다. 제 때를 놓치면 거리 위에 널려 있는 꽃잎을 밟으며 사라진 아름다움을 못내 아쉬워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원제는 '벚나무')은 벚꽃 피는 계절마다 떠올려지는 영화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더욱 생각나는 영화다. 비록 일본 토속적인 세계관이 많이 반영된 영화라 해도 기독교적으로 곱씹을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영화를 이해하는 관건은 벚꽃의 이미지와 부토 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무용에 속하면서도 다른 느낌과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갖는 춤 부토는 1960년대에 등장하여 일본의 패전 이후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며 '그림자 춤'이라 불린다.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과 일치를 표현하는 이 춤에는 표현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허무주의가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온 몸을 희게 칠한 채,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안무는 인간의 공포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한다. 부토는 비록 굿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생각하게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마치 굿과 같은 느낌을 갖기에 '일본 굿'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벚꽃이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준다면, 부토는 빛과 그림자, 삶과 죽음의 공존과 동시성을 표현하면서 또한 양자 관계의 영원성을 환기한다.
원제는 '벚나무'인데 한국에서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것은 아내와 엄마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 간 트루디의 가족 사랑에 포인트를 둔 해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토 무용수가 되고 싶지만 남편의 반대로 꿈을 접었던, 결국 그렇게 원하던 도쿄에도 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내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남편 루디의 회오와 사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르적으로 로맨스나 멜로에 방점을 두고 사랑의 상실감을 부각하기 위해 제목을 그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화 이해를 위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트루디의 사랑은 무엇을 남겨놓은 것이고, 루디와 트루디의 사랑은 무엇을 남겨놓은 것일까?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화가 주는 의미에 제대로 닿질 못한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부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일상이며 간간이 찾아오는 그리움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녀들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스토리가 전혀 예상 밖이다. 사랑의 상실을 말하면서도 영화는 오히려 벚나무와 부토의 이미지를 통해 인생의 허망함과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영화는 생의 한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며,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 힘입어 삶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경험을 다룬다. 트루디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앞서 경험한 것이며, 일상의 삶에서 변화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했던 루디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반성과 함께 일대 변화를 시도해 스스로 거부했던 부토를 추면서 아내와의 일치와 삶의 기쁨을 경험한 것이다.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덧없는 것이 인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는 한,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죽었으나 부활하신 분의 임재를 기대한다. 삶의 한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며, 기억과 희망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비록 죽음은 허망하다해도 기독교인에게 그것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부토 무용수가 그림자와 함께 소통하듯이 그렇게 기독교인은 믿음을 통해 고난 속에서 숨어계신 하나님과 소통한다. 우리가 추도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지 살아있는 자들의 교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즉,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었으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산 자와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일이다.
최성수목사 / 神博ㆍ영화 및 문화평론가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원제는 '벚나무')은 벚꽃 피는 계절마다 떠올려지는 영화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더욱 생각나는 영화다. 비록 일본 토속적인 세계관이 많이 반영된 영화라 해도 기독교적으로 곱씹을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영화를 이해하는 관건은 벚꽃의 이미지와 부토 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무용에 속하면서도 다른 느낌과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갖는 춤 부토는 1960년대에 등장하여 일본의 패전 이후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며 '그림자 춤'이라 불린다.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과 일치를 표현하는 이 춤에는 표현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허무주의가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온 몸을 희게 칠한 채,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안무는 인간의 공포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한다. 부토는 비록 굿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생각하게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마치 굿과 같은 느낌을 갖기에 '일본 굿'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벚꽃이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준다면, 부토는 빛과 그림자, 삶과 죽음의 공존과 동시성을 표현하면서 또한 양자 관계의 영원성을 환기한다.
원제는 '벚나무'인데 한국에서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것은 아내와 엄마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 간 트루디의 가족 사랑에 포인트를 둔 해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토 무용수가 되고 싶지만 남편의 반대로 꿈을 접었던, 결국 그렇게 원하던 도쿄에도 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내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남편 루디의 회오와 사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르적으로 로맨스나 멜로에 방점을 두고 사랑의 상실감을 부각하기 위해 제목을 그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화 이해를 위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트루디의 사랑은 무엇을 남겨놓은 것이고, 루디와 트루디의 사랑은 무엇을 남겨놓은 것일까?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화가 주는 의미에 제대로 닿질 못한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부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일상이며 간간이 찾아오는 그리움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녀들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스토리가 전혀 예상 밖이다. 사랑의 상실을 말하면서도 영화는 오히려 벚나무와 부토의 이미지를 통해 인생의 허망함과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영화는 생의 한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며,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 힘입어 삶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경험을 다룬다. 트루디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앞서 경험한 것이며, 일상의 삶에서 변화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했던 루디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반성과 함께 일대 변화를 시도해 스스로 거부했던 부토를 추면서 아내와의 일치와 삶의 기쁨을 경험한 것이다.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덧없는 것이 인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는 한,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죽었으나 부활하신 분의 임재를 기대한다. 삶의 한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며, 기억과 희망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비록 죽음은 허망하다해도 기독교인에게 그것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부토 무용수가 그림자와 함께 소통하듯이 그렇게 기독교인은 믿음을 통해 고난 속에서 숨어계신 하나님과 소통한다. 우리가 추도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지 살아있는 자들의 교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즉,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었으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산 자와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일이다.
최성수목사 / 神博ㆍ영화 및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