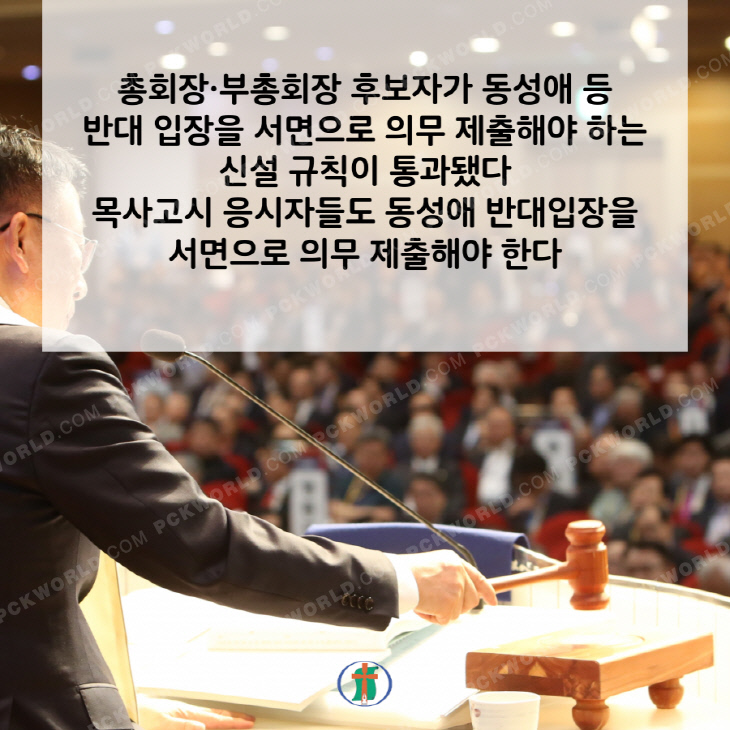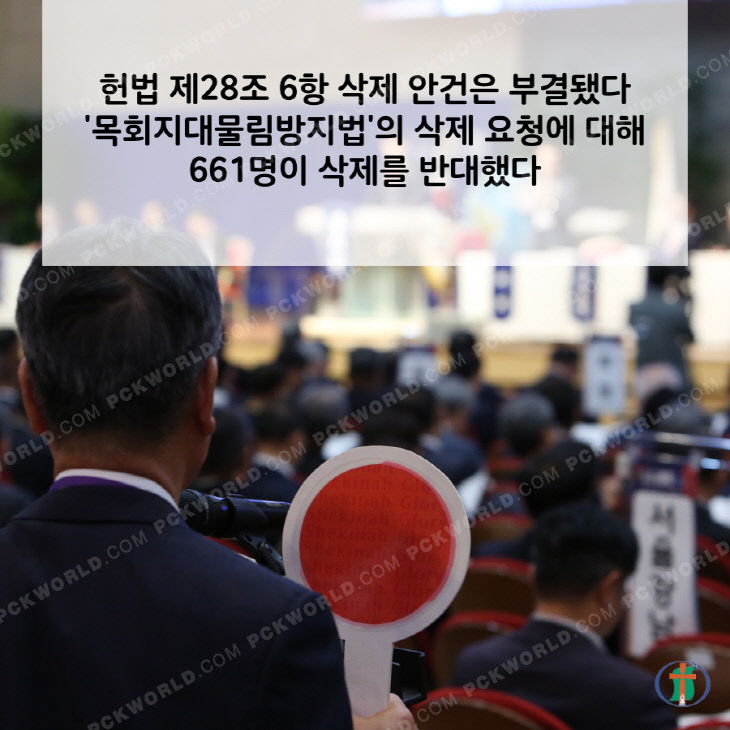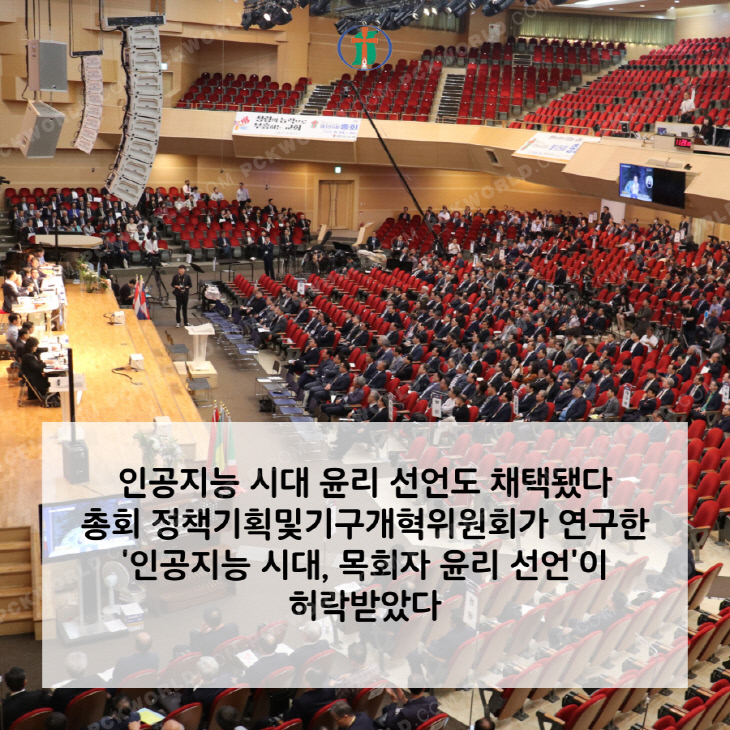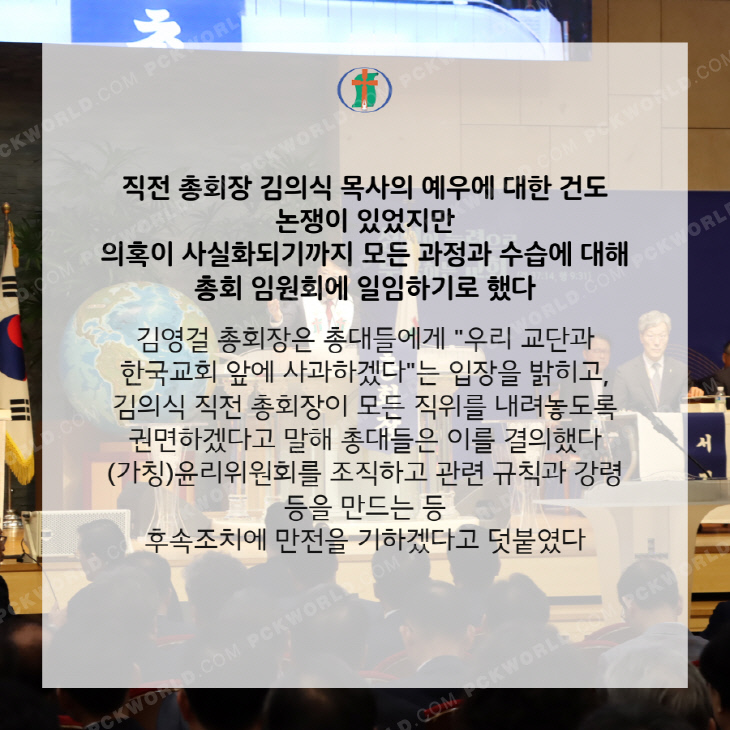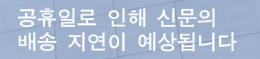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NGO칼럼 ] NGO칼럼
이명신본부장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2월 06일(월) 15:11
작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를 6번이나 다녀왔다. 월드비전에서 해외사업을 맡고 있는데다 아프리카지역 사업지원액 비율이 50%를 넘어서 현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출장은 주로 한 번에 두 국가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임에도 비행고도가 낮아 비행기 창문 밖으로 지상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날씨만 나쁘지 않다면 말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과 숲,사막과 강,호수,밭,흙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구분한 국경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어릴 적 사금파리로 친구들과 땅따먹기를 한 기억이 있다. 내 땅이 넓어지면 승자의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진짜 그 땅이 내 것이라도 된 것처럼. 태초에 없던 국경선은 언젠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금 안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만난 아이들
하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로 40분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때 국물로 까맣게 변한 옷은 목둘레가 헤어져 자꾸 흘러내린다. 맨발은 흡사 코끼리발 같다. 딱지가 앉아 때가 쾌를 얹은 것이다. 얼굴에 왕파리가 달라붙어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었는데도 여전히 파리 떼가 달라붙는다. 아이들에게 신발만 신겨도 아이들이 겪는 질병의 20%는 줄일 수 있다고 의사는 말한다. 신발은 2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둘. 학교를 방문했다. 점심시간이다. 삶은 옥수수 알이 점심식사의 전부다. 학생 중 머리가 조금 올라온 남학생이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다. 다가가보니 밥그릇 안에 옥수수는 없고 손가락으로 물기를 싹싹 쓸어 입으로 가지고 간다. 조금만 더 옥수수를 주면 저 아이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몇 시간씩 걸어서 학교로 모여든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셋. 수년째 방문하는 가난한 마을이다. 주로 혼자된 여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방문 할 때마다 보이는 중학교 1-2학년 또래의 소년. 대낮인데도 집 주변에 있는 걸 보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듯하다.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차창으로 몰려들어 손을 내밀면 그 소년은 아이들을 떼어 말린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의젓한 맏형처럼 행동한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그 소년이 제대로 교육만 받는다면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처럼 의젓하고 똘똘해 보여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년이다.
한국은 60여 년 전 저들보다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나라가 되었고 한국이 부자가 된 이유를 참 궁금해들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러운 시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 이웃은 50억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그어 놓은 금을 지워버리고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을 넘어 굶주리고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때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생명을,물질을,시간을,행복을,고통을,관심을 나눌 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지 않을까.
이명신/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과 숲,사막과 강,호수,밭,흙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구분한 국경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어릴 적 사금파리로 친구들과 땅따먹기를 한 기억이 있다. 내 땅이 넓어지면 승자의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진짜 그 땅이 내 것이라도 된 것처럼. 태초에 없던 국경선은 언젠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금 안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만난 아이들
하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로 40분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때 국물로 까맣게 변한 옷은 목둘레가 헤어져 자꾸 흘러내린다. 맨발은 흡사 코끼리발 같다. 딱지가 앉아 때가 쾌를 얹은 것이다. 얼굴에 왕파리가 달라붙어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었는데도 여전히 파리 떼가 달라붙는다. 아이들에게 신발만 신겨도 아이들이 겪는 질병의 20%는 줄일 수 있다고 의사는 말한다. 신발은 2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둘. 학교를 방문했다. 점심시간이다. 삶은 옥수수 알이 점심식사의 전부다. 학생 중 머리가 조금 올라온 남학생이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다. 다가가보니 밥그릇 안에 옥수수는 없고 손가락으로 물기를 싹싹 쓸어 입으로 가지고 간다. 조금만 더 옥수수를 주면 저 아이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몇 시간씩 걸어서 학교로 모여든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셋. 수년째 방문하는 가난한 마을이다. 주로 혼자된 여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방문 할 때마다 보이는 중학교 1-2학년 또래의 소년. 대낮인데도 집 주변에 있는 걸 보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듯하다.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차창으로 몰려들어 손을 내밀면 그 소년은 아이들을 떼어 말린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의젓한 맏형처럼 행동한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그 소년이 제대로 교육만 받는다면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처럼 의젓하고 똘똘해 보여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년이다.
한국은 60여 년 전 저들보다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나라가 되었고 한국이 부자가 된 이유를 참 궁금해들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러운 시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 이웃은 50억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그어 놓은 금을 지워버리고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을 넘어 굶주리고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때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생명을,물질을,시간을,행복을,고통을,관심을 나눌 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지 않을까.
이명신/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