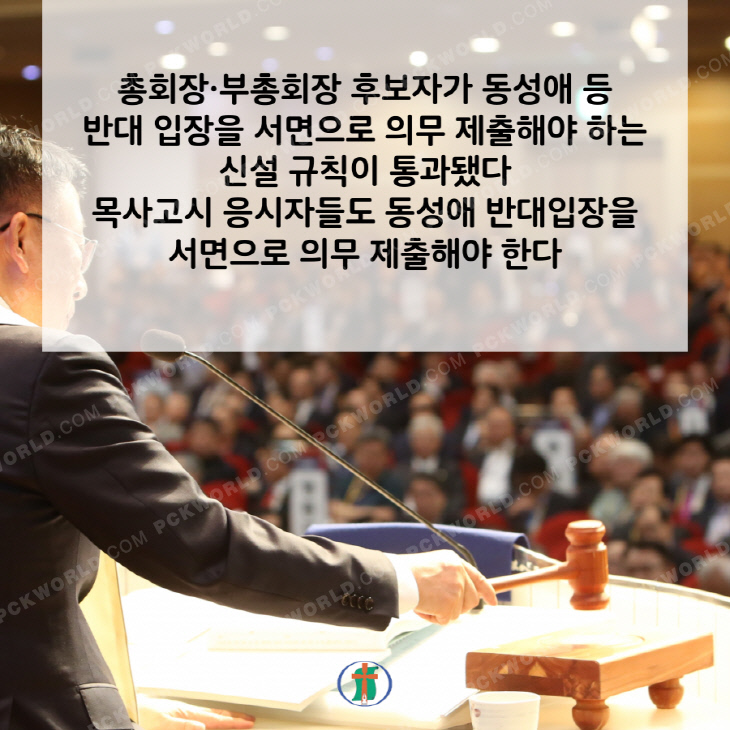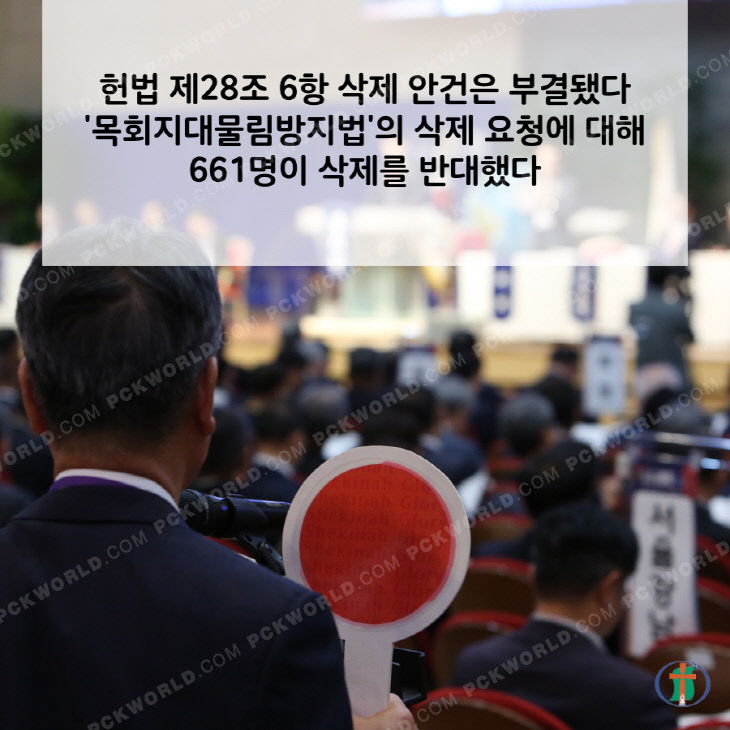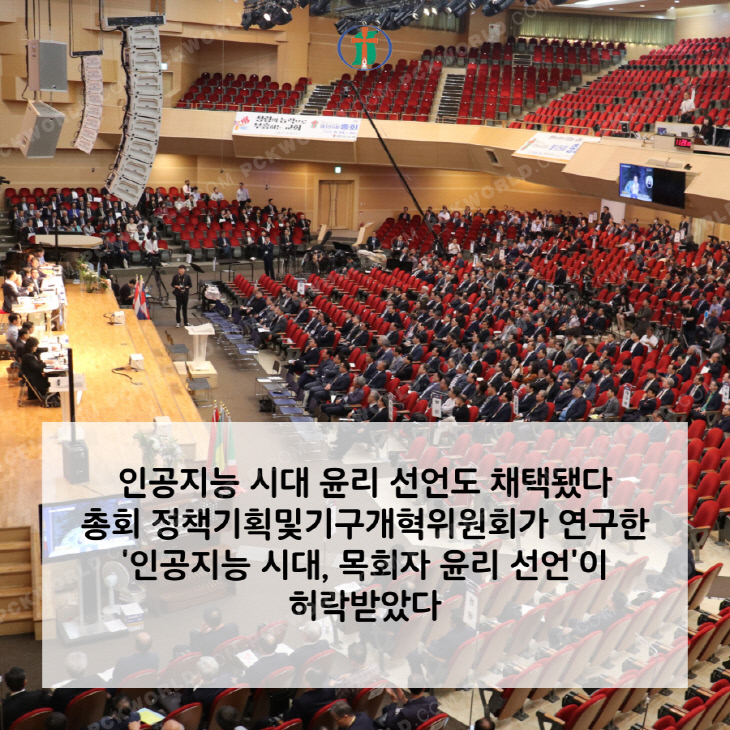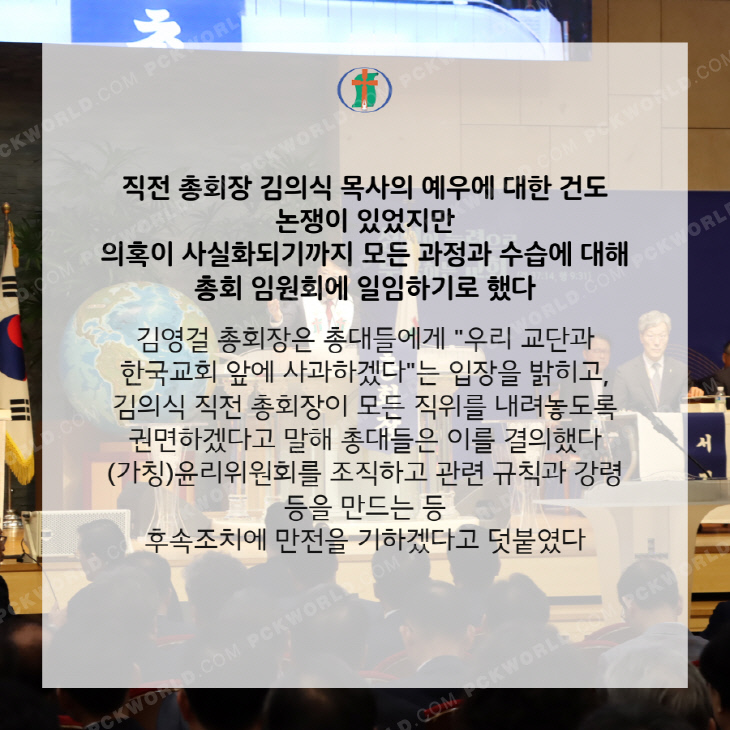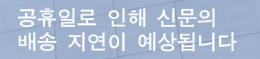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예화사전 ] < 18 >
초등학교 때 우리 가정은 지극히도 빈한했습니다. 점심 굶는 것은 보통이었고 종종 저녁밥도 건너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5학년이던 어느 날, 점심을 굶고 고픈 배를 움켜쥐며 20리 길을 걸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들일하러 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배고픈 나머지 사랑방 윗목에 다음해 종자씨앗으로 아껴두었던 고구마 두 개를 화롯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어머니가 그것을 확인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럽고 배고파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지나 잠든 나를 깨우신 분은 어머니셨습니다. 머리맡에는 삶은 고구마가 한 사발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어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언제 서운했던가 싶은 마음으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되돌아 앉아 저고리 고름으로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니를 본 것은 한 개를 다 먹고 난 후였습니다. 아직도 그 때 일이 잊혀 지지 않기에 5월이 되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어릴 때 쌀밥 달라고 졸라대던 어린 것 품에 안고 종갓집 마당에서 쌀 밥 한 그릇 얻어 들고 돌아와, 명태 두 마리 구워 한 숟갈 한 숟갈 입에 떠 넣어 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발에 종기가 나서 걸음을 걷지 못할 때 김치를 입에 빨아 종기에 대고 "엄마가 붙이는 모든 것은 명약이다"라며 입으로 후후 부시면서 다독거려 주시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설익은 풋풋한 사과를 먹고 배 아파 아랫목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내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하면서 배를 쓸어 문질러 주실 때 희한하게 아프지 않고 잠이 들게 하셨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설날이 되면 이웃 부잣집 아이들은 때때옷 입고 세배 다닐 때 묵은 헌옷 입고 세배하는 것이 속상해 정월 초하룻날 들판으로 연 날리러 갔다가 돌아온 어린 것을 치마로 감싸 안고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 돌아서서 눈물짓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나이 들어 목사가 되었을 때 잠 못 자는 것이 안쓰럽게 보이시고, 소견 좁은 교인들에게 이리 저리 시달리는 것 속상해 새벽까지 아들 머리맡에 앉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눈물로 적셨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5월이 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끝없이 베푸시는 어머니의 사랑, 퍼 올려도 퍼 올려도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어머니 사랑은 그랬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머니 같은 목사로 목양 해야지' 그러면서 벌써 강산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 앉아 묵상하다가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어머니를 불러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됩니다. "엄마. 엄마아…."
그래서 어머니는 고향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산입니다. 퍼 올려도 퍼 올려도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5월에 오늘도 모심(母心)으로 목양의 걸음을 옮깁니다.
서임중목사(포항중앙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