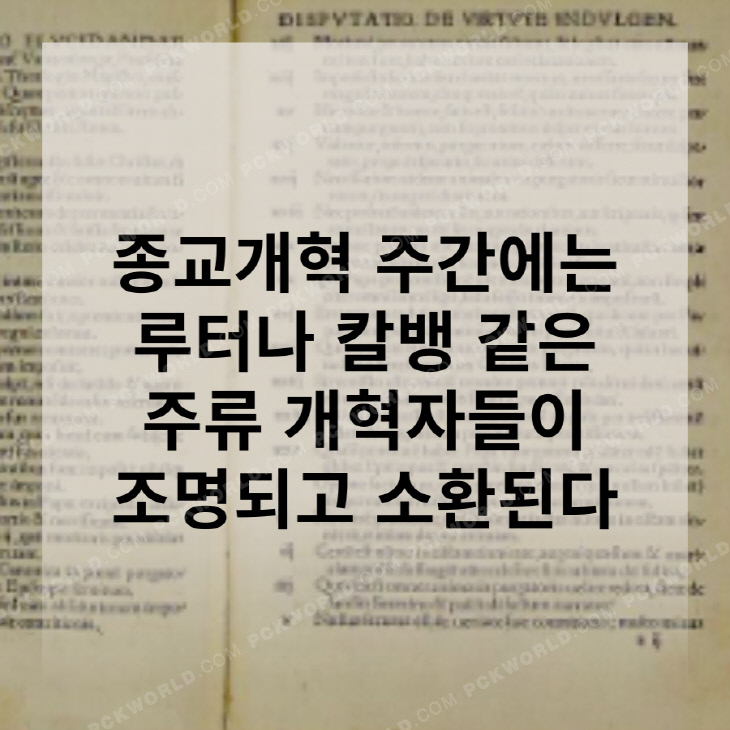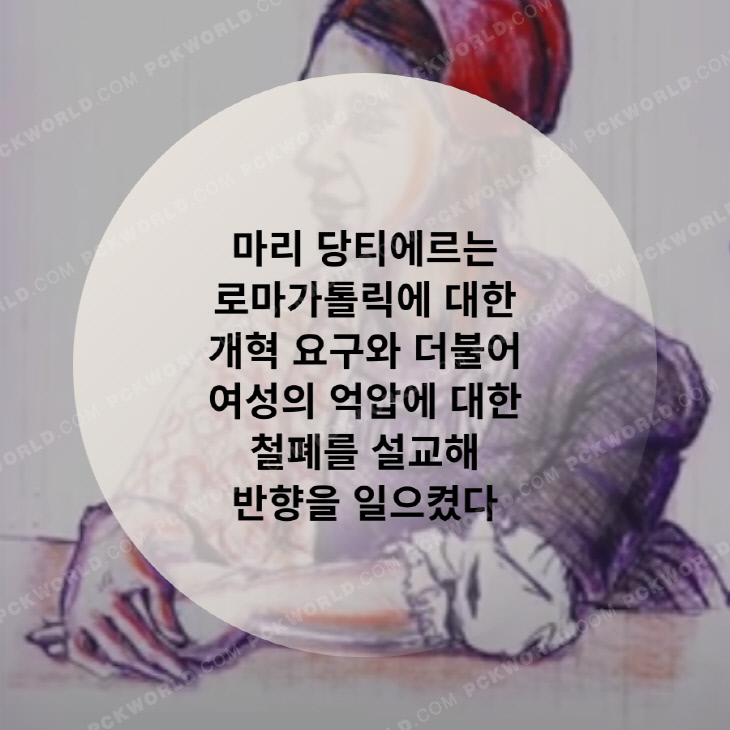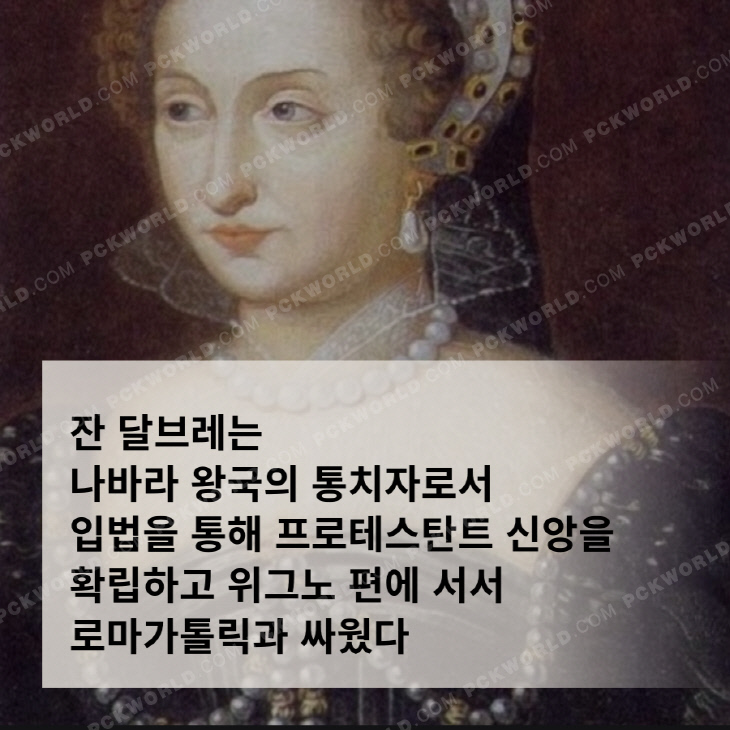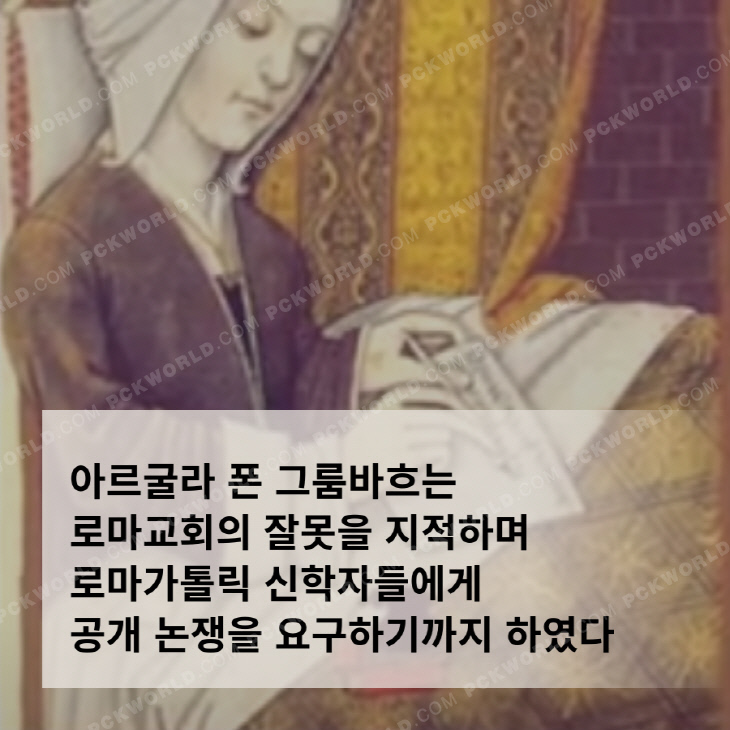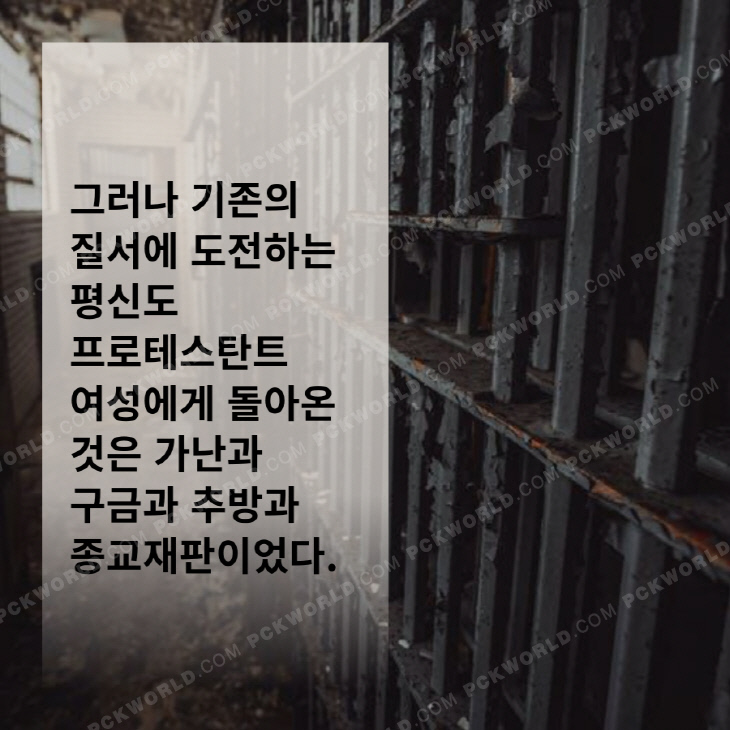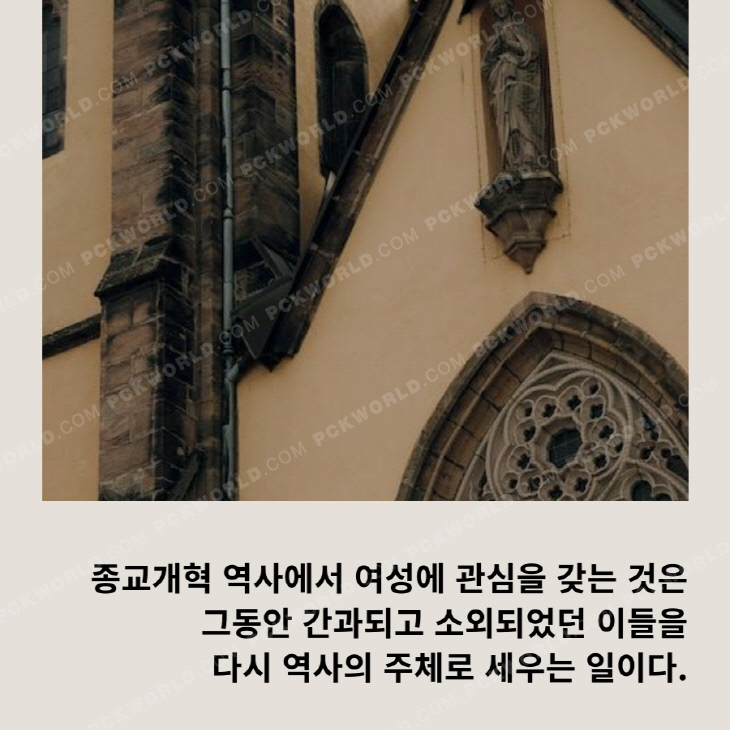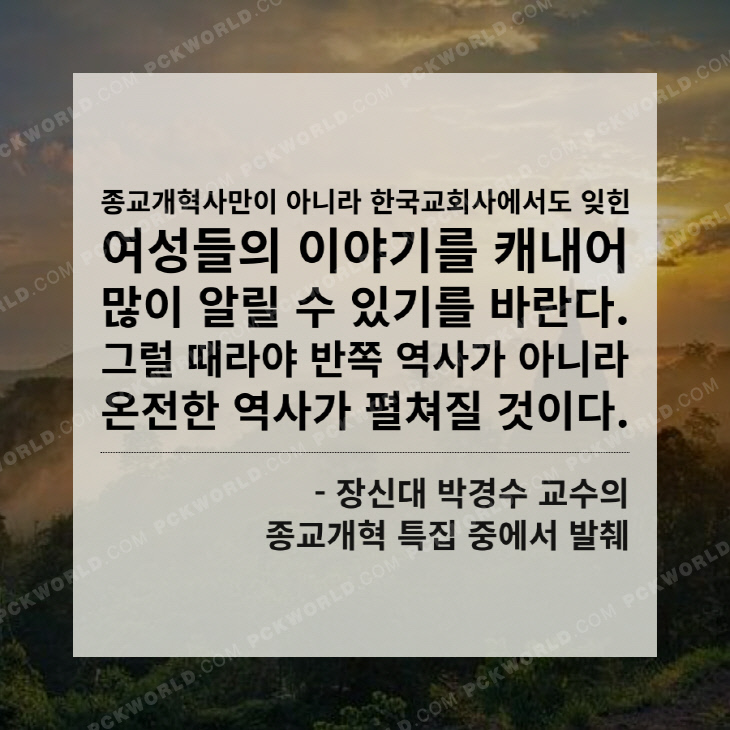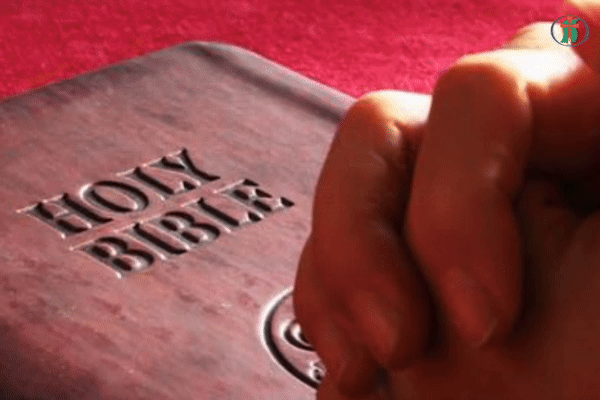[ 기고 ]
언젠가 사택 서재 창문밖에 있던 작은 틈에 새들이 집을 지었다. 그때는 새들이 매일 일찍 일어나 은행나무에 올라가 노래 부르는 통에 도무지 늦잠을 잘 수 없었다. 그 은행나무는 상당히 컸기에 이웃에 있는 친구새들까지 떼거리로 몰려와 잠을 깨웠던 기억이 있다. 나는 가끔씩 일하다 말고 새들의 행태를 살펴보면서 감동을 받곤 했다.
새들의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다. 아무 곳이나 후벼파면 먹을 것이 나온다. 어디나 식량이 있다. 그러니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다. 독수리같이 큰 새들은 먹이 구하느라 고생을 한다. 하루종일 창공을 뱅뱅 돌아도 먹이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새는 그럴 필요 없다. 나무에 척 앉아 노래 한곡조 부르다가 심심하면 부리로 땅을 몇 번 끄적이면 먹을 것이 나온다.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옷을 장롱에 저장하고도 걱정이 많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옷을 입으면 철 지난 것같고, 이것은 너무 유행 지난 것같고, 이 것은 조금 촌스럽고, 이것은 분위기에 안 맞은 것같고, 출근할 때마다 여성들은 옷을 걱정한다. 하지만 새들은 어떤가?
그들은 평생 한 벌 옷을 입는다. 싫증도 없다. 자기 옷 곱다고 자랑도 않는다. 남의 옷 곱다고 부러워도 않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멋있는 삶인가?
사람들은 무슨 재미있는 것 없는가를 찾아 늘 헤매인다. 각종 기분전환의 요소에 매여 산다. 파스칼은 말했다. 사람들이 기분전환의 요소에 몰입치 않는다면 견딜수 없다고. 하지만 새들은 예외다. 저렇게 밝고 발랄하게 교회 주변을 휘돌며 나무를 장난감삼아 노는 것을 보니 새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같다. 자유함이 있다. 청아하게 노래한다. 잘 곳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전혀 염려없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깊이 생각해서 깨달으라고 새들을 도처에 보내 주셨다. 가끔씩은 일상을 멈추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자. 새들처럼 자유함의 삶이 될 때까지 말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이나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 6:26)
정병운 / 목사ㆍ광양 옥곡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