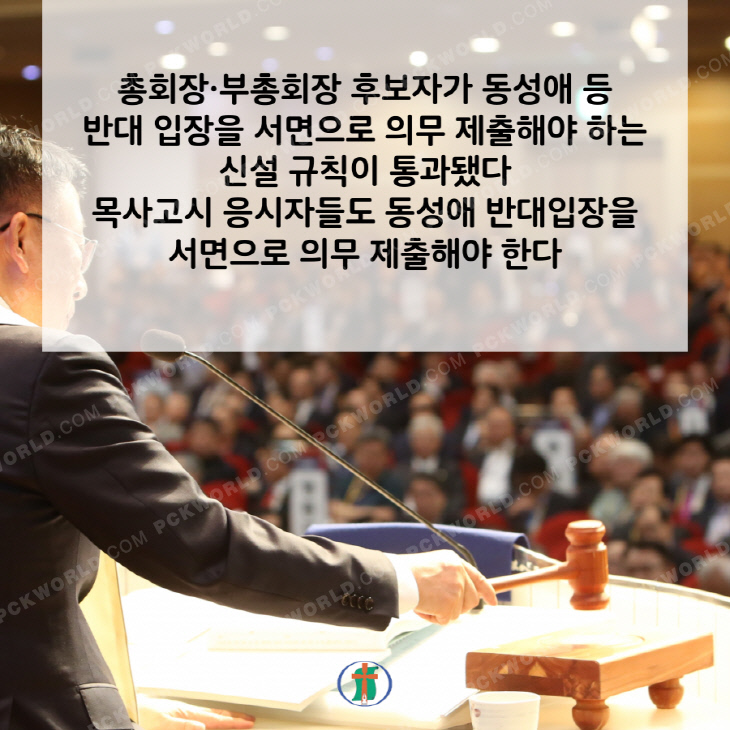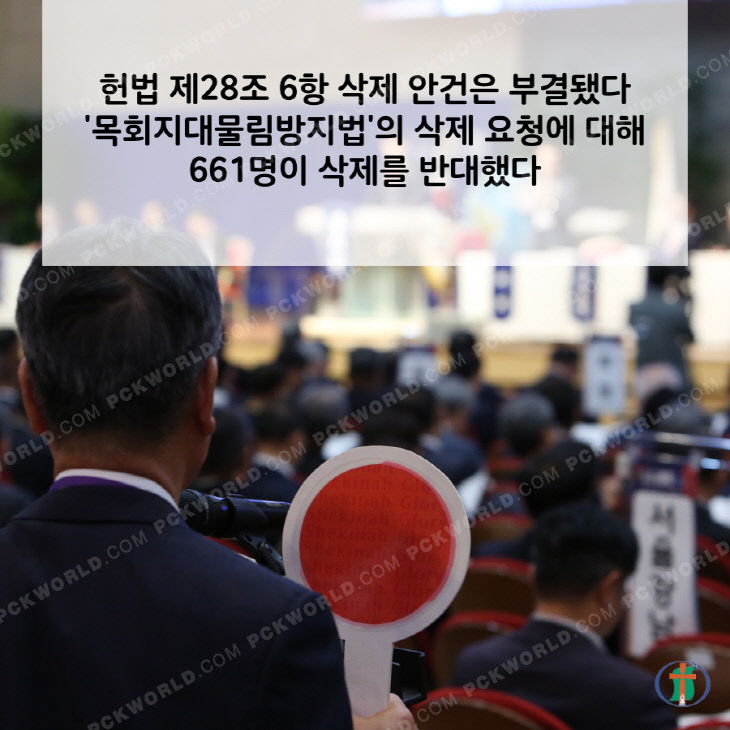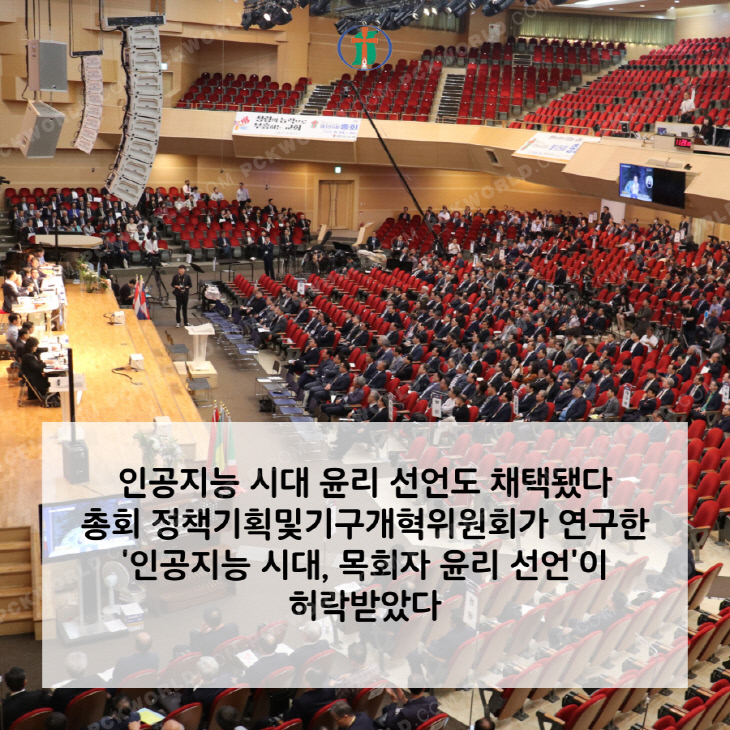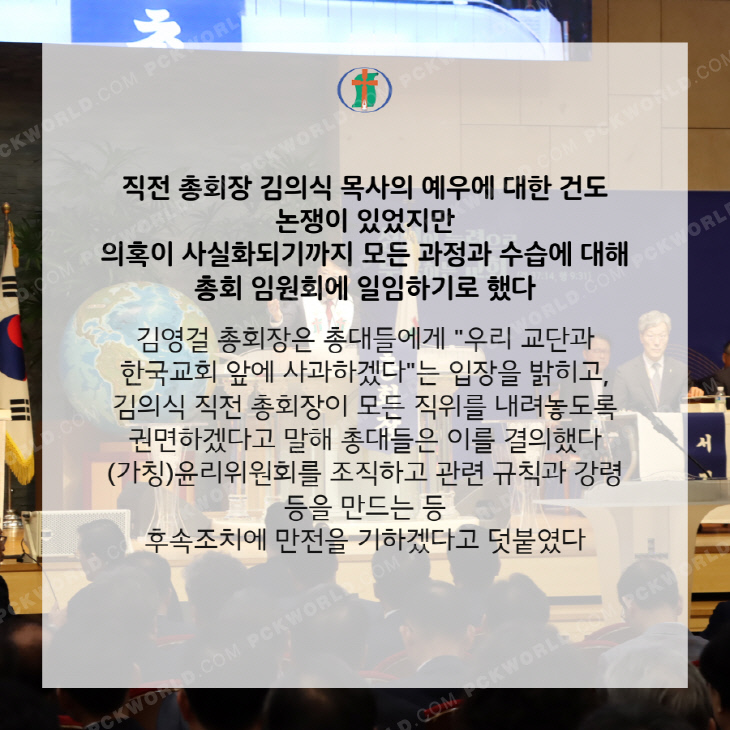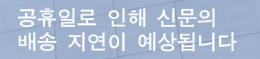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목양칼럼 ]
김종하 목사
2024년 10월 02일(수) 09:52
|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은 필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다. 그 시간,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진앙지인 흥해읍 남송리로부터 불과 2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큰 피해를 당했다. 당시 필자는 사택의 옥상에 올려놓은 컨테이너로 만든 사무실에서 수요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 '쿵' 소리가 한번 나더니 조금 지나 엄청난 지진이 찾아왔다. 책상 뒤편 벽에 고정해 둔 책장이 떨어지며 책이 정신없이 등으로 쏟아졌다. 얼마나 흔들렸던지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날아갈 것 같았다. 다행히 진동은 오래가지 않았고 진동이 멈추자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다. 교회를 가 보니 다행히 흔들림에 비해 데미지가 적은 것 같았다. 하지만 사택으로 와보니 사정은 달랐다. 많은 살림살이가 넘어지고 깨어져 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벽에 금이 너무 심하게 가 집 안에서 밖이 보였고, 주먹이 틈새로 들어갈 정도로 완파됐다.
이후 여진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살림살이는 건져야 하겠기에 온전한 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천막으로 덮어두었다. 이후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임시 거처를 구해서 이사하게 됐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분들이 오셨다. 필자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줄 아셨던 모양이었다. "왜 이사를 가느냐?"고 아쉬워하시는 마을 어르신들께 안심을 시켜 드렸다. "이곳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로 출근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목사님요, 매일 오가는 것 하고 같이 사는 것 하고 같응교?"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한 마디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래,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지. 목회는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지.' 농촌에 들어와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고 깨달았다.
목회는 함께 사는 것이다. 더구나 정주문화 속에 있는 농촌목회는 더더욱 그렇다. 그분들과 평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예수님의 제자훈련도 지식교육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단순했다. "나를 따라오라"와 "와 보라", 이 단순한 부르심으로 열두 제자가 탄생되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마을목회라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적 화두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단 총회가 마을목회를 중요한 주제로 잡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마을목회의 접근방식과 내용에 있어 조금 아쉬움을 가진다. 왜냐하면 마을목회가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이다.
마을이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군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마을목회라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마을목회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을 목회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마을목회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목회의 모습일 것이다.
옆집 할머니의 말씀처럼 함께 살아가는 목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마을목회자들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김종하 목사 / 곡강교회
이후 여진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살림살이는 건져야 하겠기에 온전한 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천막으로 덮어두었다. 이후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임시 거처를 구해서 이사하게 됐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분들이 오셨다. 필자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줄 아셨던 모양이었다. "왜 이사를 가느냐?"고 아쉬워하시는 마을 어르신들께 안심을 시켜 드렸다. "이곳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로 출근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목사님요, 매일 오가는 것 하고 같이 사는 것 하고 같응교?"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한 마디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래,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지. 목회는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지.' 농촌에 들어와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고 깨달았다.
목회는 함께 사는 것이다. 더구나 정주문화 속에 있는 농촌목회는 더더욱 그렇다. 그분들과 평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예수님의 제자훈련도 지식교육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단순했다. "나를 따라오라"와 "와 보라", 이 단순한 부르심으로 열두 제자가 탄생되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마을목회라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적 화두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단 총회가 마을목회를 중요한 주제로 잡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마을목회의 접근방식과 내용에 있어 조금 아쉬움을 가진다. 왜냐하면 마을목회가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이다.
마을이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군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마을목회라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마을목회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을 목회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마을목회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목회의 모습일 것이다.
옆집 할머니의 말씀처럼 함께 살아가는 목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마을목회자들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김종하 목사 / 곡강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