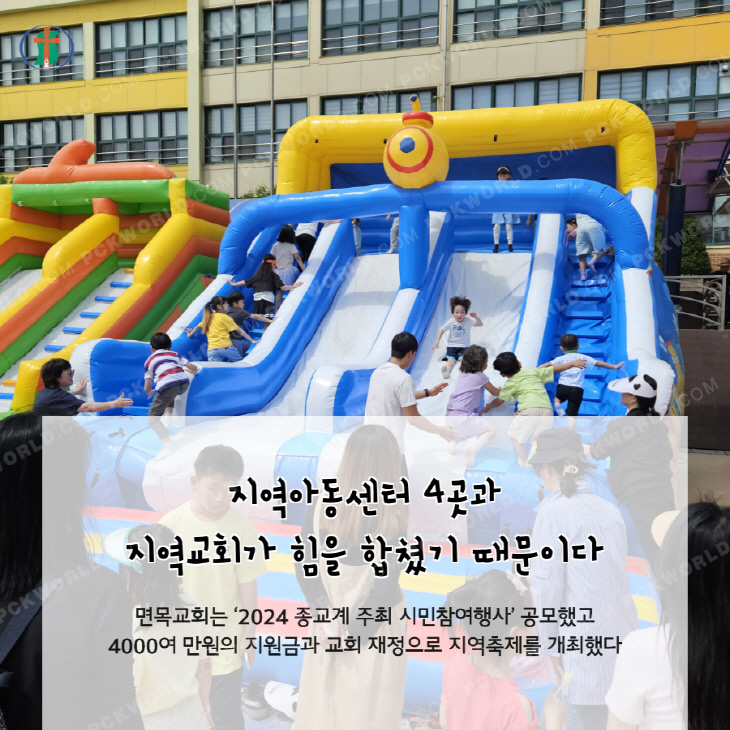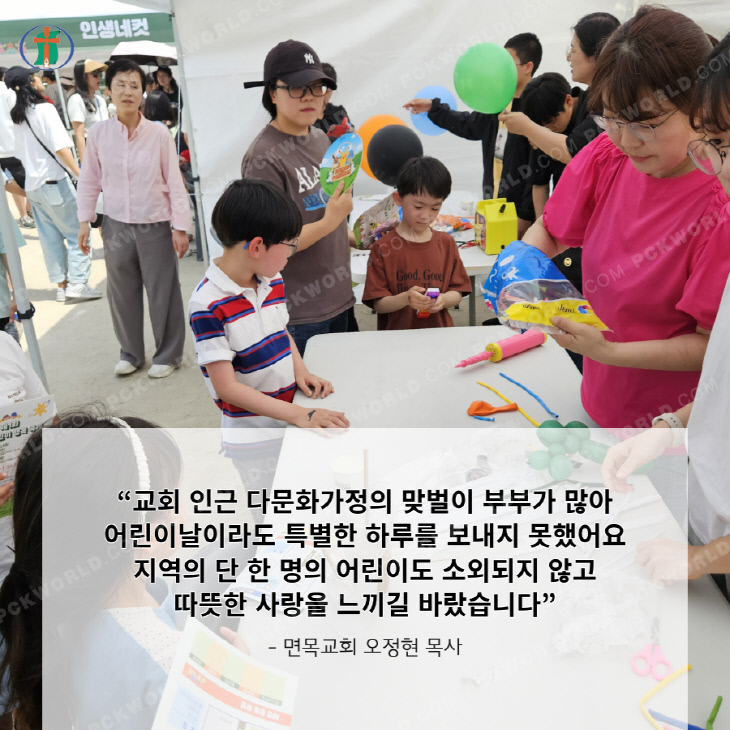[ 논설위원칼럼 ]
박재윤 장로
2022년 12월 05일(월) 08:10
|
코로나가 수습국면에 들면서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서울을 떠나 지난 10월 하순부터 11월 첫 주말까지 2주일 간 파리의 처제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국민들이 즐기는 가을 바캉스, 즉 '투쌍'(Toussaint, 만성절) 전후의 2주일 휴가기간과 겹쳐 있었다. 익히 알다시피 만성절은 개별적 축일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무명의 성인들을 한 해에 한 번 대우하여 모시는 절기이다. 성인 제도가 없는 우리 한국 개신교와는 물론 무관한 명절이다.
체류기간 내내 파리 시내의 온 대중교통과 주요 철도역들이 학령기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 할머니와 손녀 2인조 트렁크 여행객(지방에서 아이들에게 수도 파리를 구경시키려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들로 계속 붐비고 부산했다. 그랬던 것이 이 투쌍 바캉스 때문임을 안 것은, 귀국할 때가 거의 다 되어서의 일이었다.
독일에서도 가톨릭 지역과 루터교 지역 모두에서 11월 1일 만성절(Allerheiligen)은 지켜지지만, 그것은 성당이나 교회에서의 일이지, 프랑스처럼 온 나라가 작정하고 장기적 휴가를 즐기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독일(및 독일어권 타 국가)에서는 만성절 다음날을 '만령절(Allerseelen)'로 지키는 것이 특이하다. 만령절을 위한 연도(連禱, Litanei)의 시문이 오래 전부터 지어져 왔고 품격 있는 예술가곡(Lied)도 작곡되어 애호를 받아왔다. 이른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범주에 속하는 시문이거나 가곡들이라고 하겠다.
만성절이나 만령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전야제라 할 수 있는 핼러윈 만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그 축제의 내용이란 기실 어린이들이 유령, 괴물 등의 가면이나 가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과자선물을 얻어 모으는 놀이를 하는 정도이다. 이는 오래 전 아일랜드 등에 정착한 켈트족들이 그들의 이교도적 악령 쫓기 민속축제를 가톨릭교의 만성절 전날과 연결하여 계속 즐기면서 시작된 풍습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그런 놀이에는 흥미를 잃고 마는 것이 보통이며, 하물며 다 자란 성인들이 떼로 모여들어 놀이판을 벌이는 일은 없다고 들었다.
우리가 핼러윈이란 걸 알게 된 것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어 조기교육이 시작된 후 학원측에서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핼러윈 철에 맞춰 미국식 핼러윈 놀이를 가르치고 권장한 것도 한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니 젊은 부모들이 적극 호응하고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경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까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다.
프랑스의 투쌍 기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모하려고 성묘를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파리 처제로부터 들었다. 그들에게 투쌍은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처럼, 일면 즐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해야 하는 가을 명절인 셈이다.
돌아가신 선조, 친지, 은사들이나 수많은 불쌍한 죽음들을 안타까워하는 서양인들의 절기에, 하필 동양(도쿄 시부야의 환락가에도 인파가 몰려들었었다는 후문이다)의 젊은이들이 가면에 귀신변장을 하고 집단적 가무음곡의 놀이판을 벌임은 대체 어디로부터 본을 따온 일인가.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흥겨운 일에 목말라 했던 초 대규모의 군중 운집이 능히 예상되는 데도 사고 예방과 사고 직후의 적시 대처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책임자의 처벌과 국가배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사회 상황이나 전통과 전혀 무관한 이 타민족의 축제일을 과도히 즐기려 한 점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자발적 반성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도모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재윤 장로 / 전 대법관, 기독교화해중재원 명예원장
체류기간 내내 파리 시내의 온 대중교통과 주요 철도역들이 학령기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 할머니와 손녀 2인조 트렁크 여행객(지방에서 아이들에게 수도 파리를 구경시키려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들로 계속 붐비고 부산했다. 그랬던 것이 이 투쌍 바캉스 때문임을 안 것은, 귀국할 때가 거의 다 되어서의 일이었다.
독일에서도 가톨릭 지역과 루터교 지역 모두에서 11월 1일 만성절(Allerheiligen)은 지켜지지만, 그것은 성당이나 교회에서의 일이지, 프랑스처럼 온 나라가 작정하고 장기적 휴가를 즐기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독일(및 독일어권 타 국가)에서는 만성절 다음날을 '만령절(Allerseelen)'로 지키는 것이 특이하다. 만령절을 위한 연도(連禱, Litanei)의 시문이 오래 전부터 지어져 왔고 품격 있는 예술가곡(Lied)도 작곡되어 애호를 받아왔다. 이른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범주에 속하는 시문이거나 가곡들이라고 하겠다.
만성절이나 만령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전야제라 할 수 있는 핼러윈 만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그 축제의 내용이란 기실 어린이들이 유령, 괴물 등의 가면이나 가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과자선물을 얻어 모으는 놀이를 하는 정도이다. 이는 오래 전 아일랜드 등에 정착한 켈트족들이 그들의 이교도적 악령 쫓기 민속축제를 가톨릭교의 만성절 전날과 연결하여 계속 즐기면서 시작된 풍습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그런 놀이에는 흥미를 잃고 마는 것이 보통이며, 하물며 다 자란 성인들이 떼로 모여들어 놀이판을 벌이는 일은 없다고 들었다.
우리가 핼러윈이란 걸 알게 된 것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어 조기교육이 시작된 후 학원측에서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핼러윈 철에 맞춰 미국식 핼러윈 놀이를 가르치고 권장한 것도 한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니 젊은 부모들이 적극 호응하고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경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까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다.
프랑스의 투쌍 기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모하려고 성묘를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파리 처제로부터 들었다. 그들에게 투쌍은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처럼, 일면 즐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해야 하는 가을 명절인 셈이다.
돌아가신 선조, 친지, 은사들이나 수많은 불쌍한 죽음들을 안타까워하는 서양인들의 절기에, 하필 동양(도쿄 시부야의 환락가에도 인파가 몰려들었었다는 후문이다)의 젊은이들이 가면에 귀신변장을 하고 집단적 가무음곡의 놀이판을 벌임은 대체 어디로부터 본을 따온 일인가.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흥겨운 일에 목말라 했던 초 대규모의 군중 운집이 능히 예상되는 데도 사고 예방과 사고 직후의 적시 대처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책임자의 처벌과 국가배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사회 상황이나 전통과 전혀 무관한 이 타민족의 축제일을 과도히 즐기려 한 점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자발적 반성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도모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재윤 장로 / 전 대법관, 기독교화해중재원 명예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