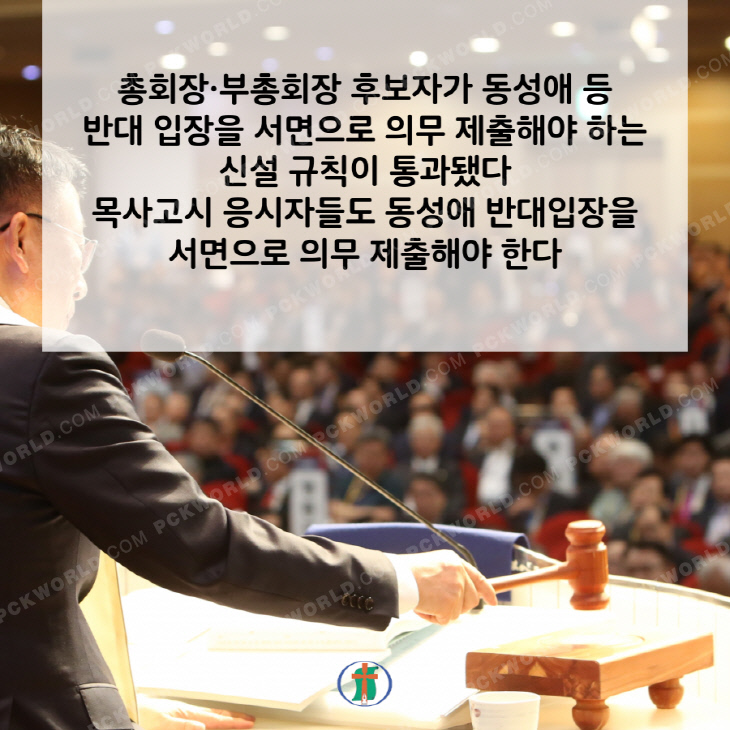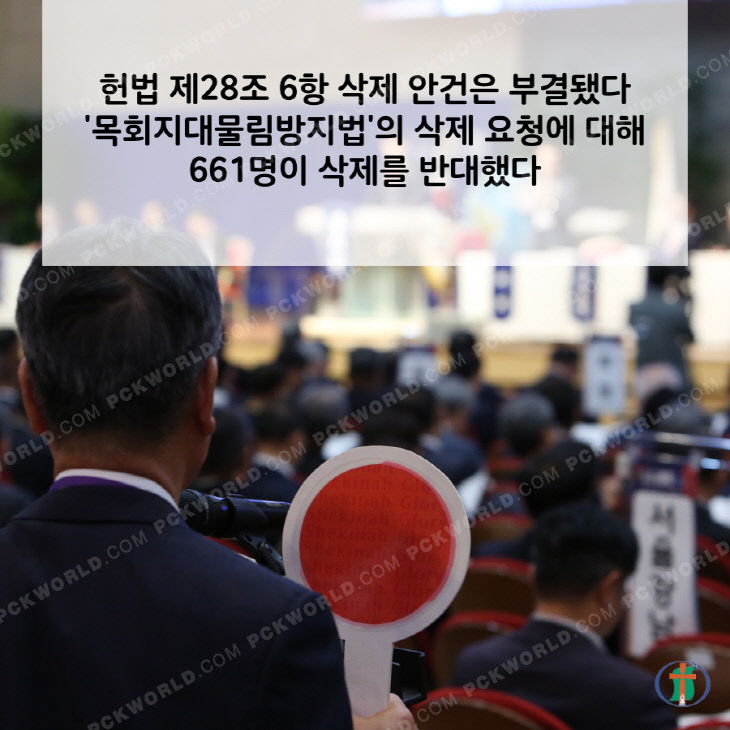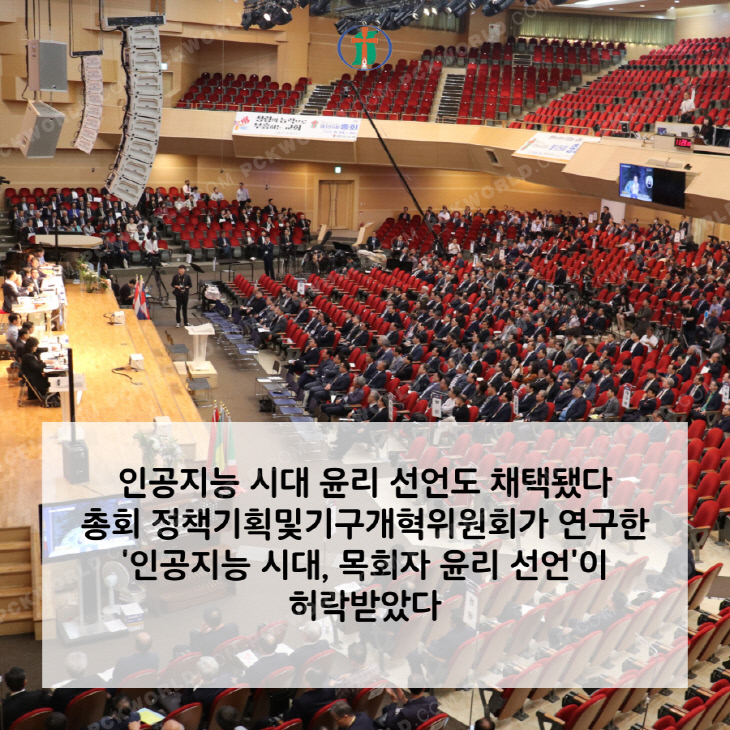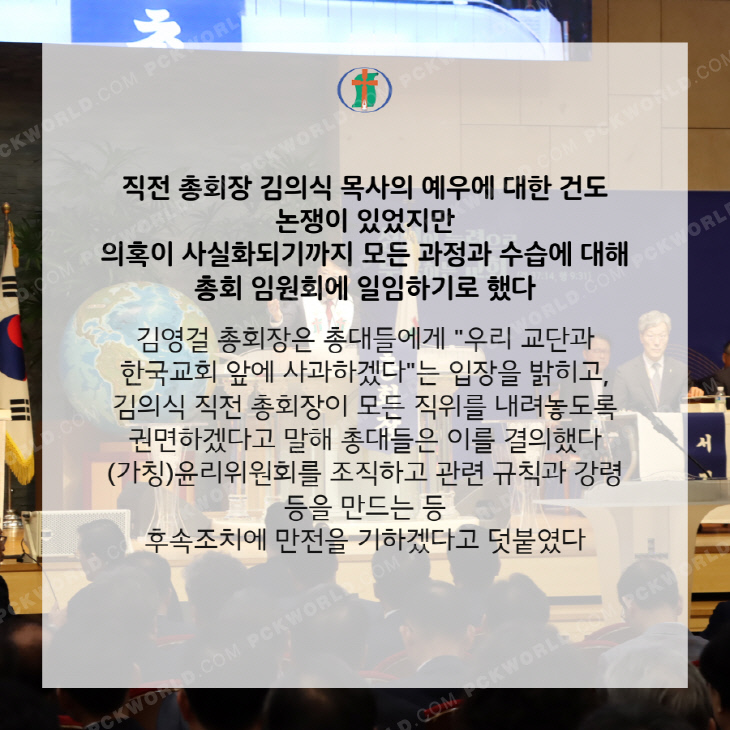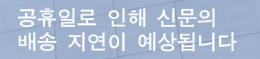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기고 ]
주일날 오후엔 난 개산(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산 이름)에 간다. 오후 예배드리고 곧장 개산에 간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이곳은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
예배당 입구를 나와서 여름철 장마가 들면 물이 찌곤 했던 새끼네 동네 옆길로 접어들면 개산이 거기 있다. 높은 산도 아니고 큰 산도 아니지만 나에겐 어느 산보다 귀하고 든든하고 정 깊은 산이다.
아름다워서 사랑 받기도 하지만 사랑하므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런 산이다. 고향땅은 새로운 길이 나고 집들이 들어서고 옛 그대로의 동네가 많이 변해 버렸다. 그러나 개산은 변함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의젓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나에겐 대단한 산이다.
개산이 계절을 바꿔 입으면 내가 그 때마다 자꾸 말을 거는 편이다. 난 말을 걸지만 산은 별로 말이 없고 침묵이 대화인 것처럼 그런다.
내가 개산 아래 서는 것은 나의 삶의 뒤안길에 돌아 서는 것이다. 뒤안은 영혼의 깊은 비밀처럼 안식을 주는 깊은 음지라고 그리고 어머님의 무명베 옷자락이 접어드는 아늑하고 한적한 곳이라는 생각을 떠 올리기도 한다.
잡목이 우거진 산길이 나 있고 그 어덕 아래로 작은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언젠가 산 노루가 목을 적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산자락 아래는 하얀 자작나무가 늘어서 있어 미풍이 스치는 날에 잎사귀가 햇살을 반사하면 매우 찬란하다.
거기 있으면 홀로인 것이 좋아서 나의 영혼과 관계가 소원했던 자신을 다시 만나보는 것이다. 그리고 산과 나무와 흙과 산짐승과 내가 살아 있음의 존재에 대해 감사가 있어 더 좋다.
나의 사는 곳과 저잣거리와 나 자신 그리고 어쩌면 시험에 들까봐 품어주는 울타리를 벗어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서보는 것이다. 내가 개산에 간다는 것은 몽롱해진 영혼과 이 세상 이웃에 소홀했던 자리에서, 순수치 못한 나의 기도문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나만의 정직한 묵상인지도 모른다.
더 진솔하고 진정어린 눈빛으로 저 하늘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뢰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인지 모른다.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가끔은 돌 던질 만큼의 자리에 던지어지고 싶은 것이다. 저 하늘 구름이 떠 있는 산 너머 영원한 곳의 그리움을 향해 머리를 숙이게 된다.
하염없이 능선을 올려다보면 텃굴로 넘어가는 산길에는 누군가 헤어짐의 슬픔이 연무처럼 서려있고 달빛 내리는 깊은 밤에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저 산 바위에서 허공을 향해 울부짖는, 어느 땐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나에게 여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가만히 산을 향하면 산이 흐른다. 능선이 흐르고 바람이 흐르고 진실이 흐른다. 흐름이 없이 어떻게 아픔을 얘기하며 어떻게 내일의 바른 일상을 기다리겠는가. 흐름이 없으면 사랑도 경건도 소유가 돼버리지 않는가.
삶의 여정도 내가 산을 찾아가는 길목도 정리해 보면 흐름이 있는 유목의 길이다. 그 길이란 소유보다는 존재를 위한 절실한 삶일 것이다. 광야 길의 여정을 다시 생각하며 나의 상상의 광야 길은 너무 안이하고 사치스러웠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사막에서의 나의 체험은 죽음과 생명이 너무나 가까운 경계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그 곳에는 오직 생의 감사와 사랑이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향한 찬양이 있을 뿐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면 시편 121편을 설렘과 떨리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싶다.
난 오는 주일 오후에도 나의 개산에 가서 바람처럼 흐르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희미한 나의 그리움을 일깨우고 깊은 산 숲처럼 늘 푸르기를 하늘 향해 기도 드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