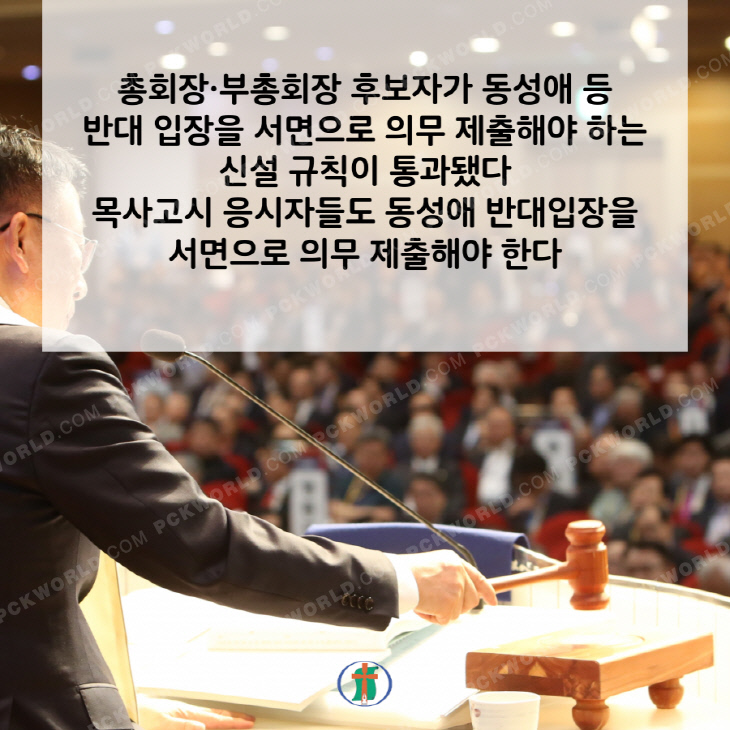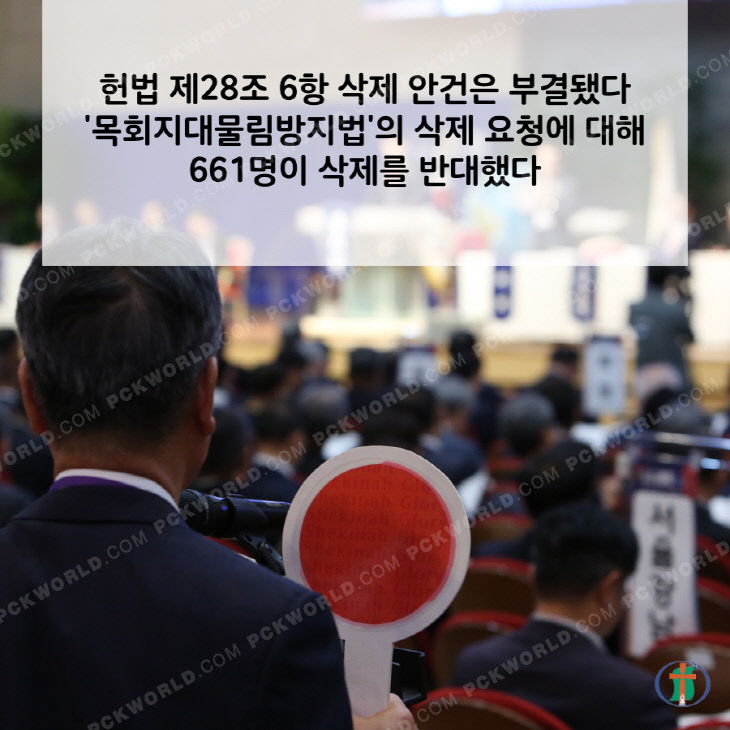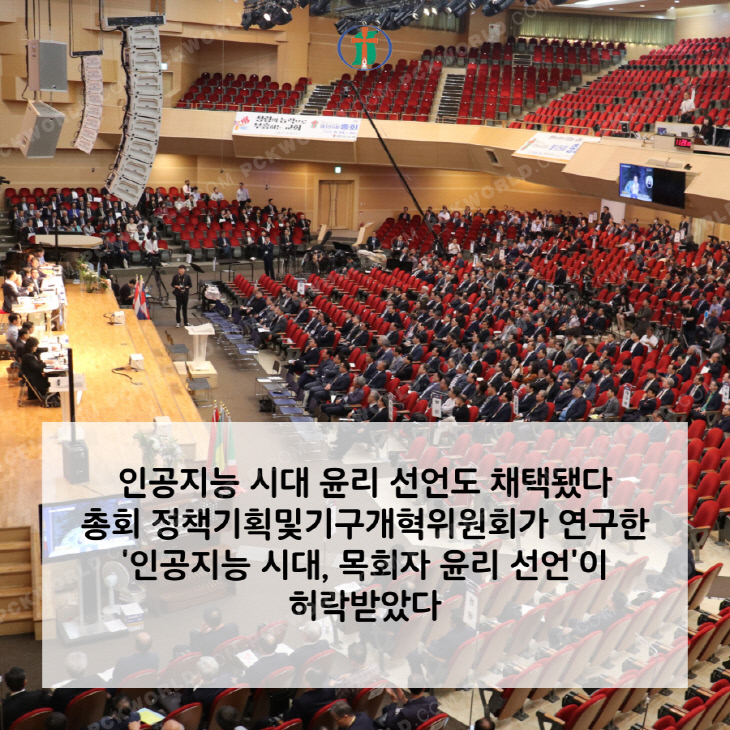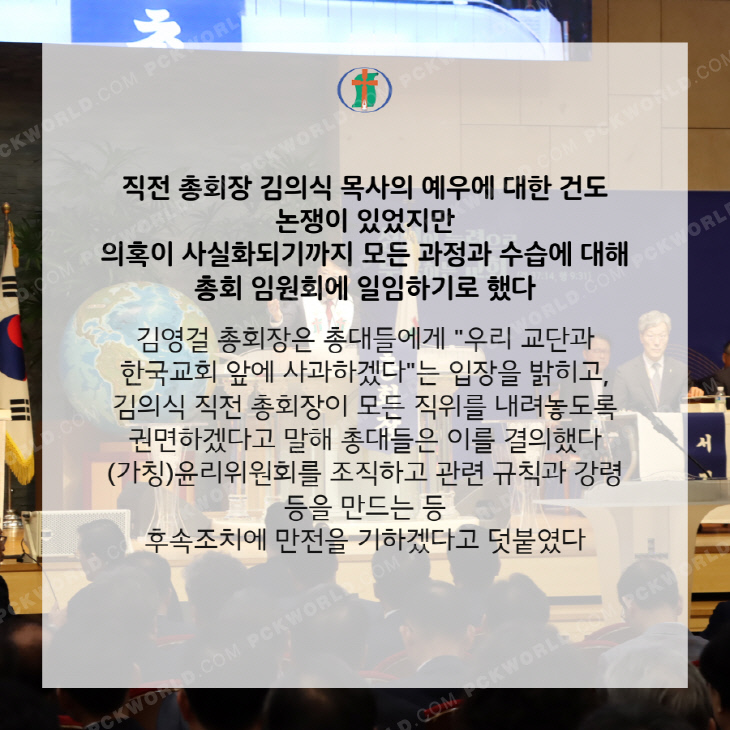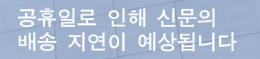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경제이야기 ]
박병관 대표
독일국제경영원ㆍ가나안교회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누가 독일인이고 누가 외국인인지 구별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식판을 비운 사람은 독일인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잔반이 남아있으면 외국인일 확률이 높다. 근대사에서 유난히도 잔혹했던 전쟁들을 겪어내야 했던 독일인들에게 배고픔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유학생 시절 한번은 독일인 친구에게 매번 접시를 싹싹 비울 정도로 구내식당의 음식이 맛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다 먹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심리적인 저항감에 음식을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의 힘이 과연 강하구나 그리고 참 답답한 친구라는 생각을 했었다. 접시를 다 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던 나는 자주 구내식당의 음식을 당당하게 남기곤 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음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효용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음식을 남기는 데 대한 효용이 남은 음식의 비용보다 클 경우 합리적인 개인은 음식을 남기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음식을 섭취하는 데 대한 개인적 효용은 처음에는 매우 크다가 배가 불러올수록 감소하기 시작한다. 음식의 맛이 없으면 효용의 감소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거기다 영양 섭취가 지나쳐 비만과 당뇨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먹기 싫은데도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속 먹는 것보다 음식을 남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음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전쟁이나 교육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언제부턴가 국내에서 남겨지는 음식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식사하러 식당에 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음식을 남긴다. 엄청난 양의 음식이 잔반으로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간혹 자기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청년을 보면 존경심마저 들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서 고리타분해진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음식도 자원인데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음식의 원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경제학은 단순히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소 신경이 더 쓰이더라도 먹을 만큼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효용극대화와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경제학 이론은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잘못된 정보 하에서의 효용극대화는 개인의 이익도 사회 전체의 후생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음식을 포함한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믿음이 전제될 때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음식이라는 자원을 선물하셨지만 그렇다고 무한대로 주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절약하면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제학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