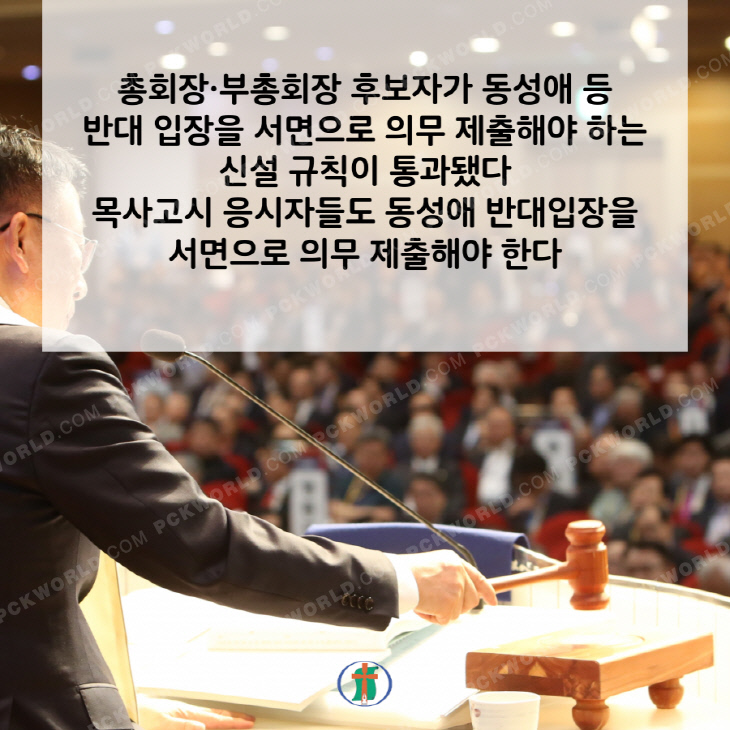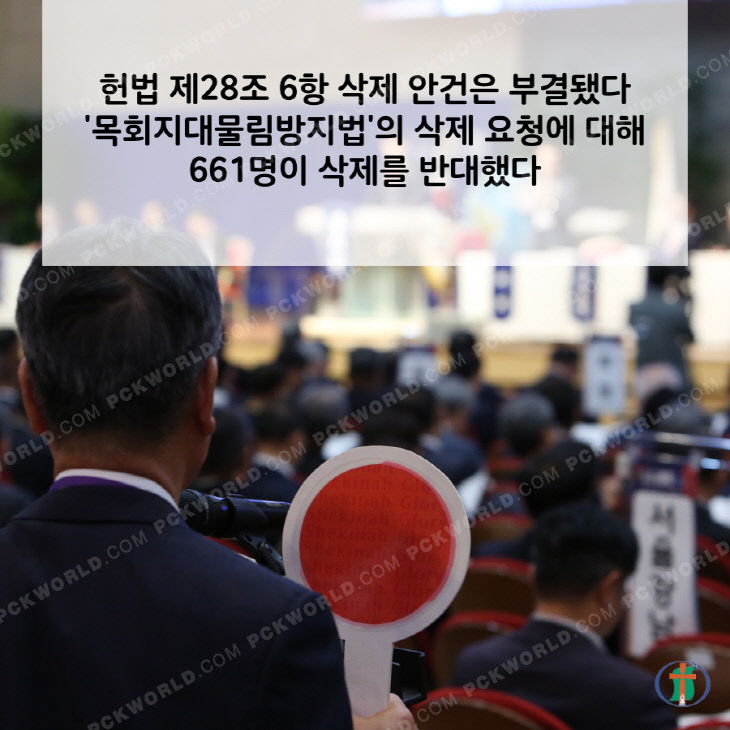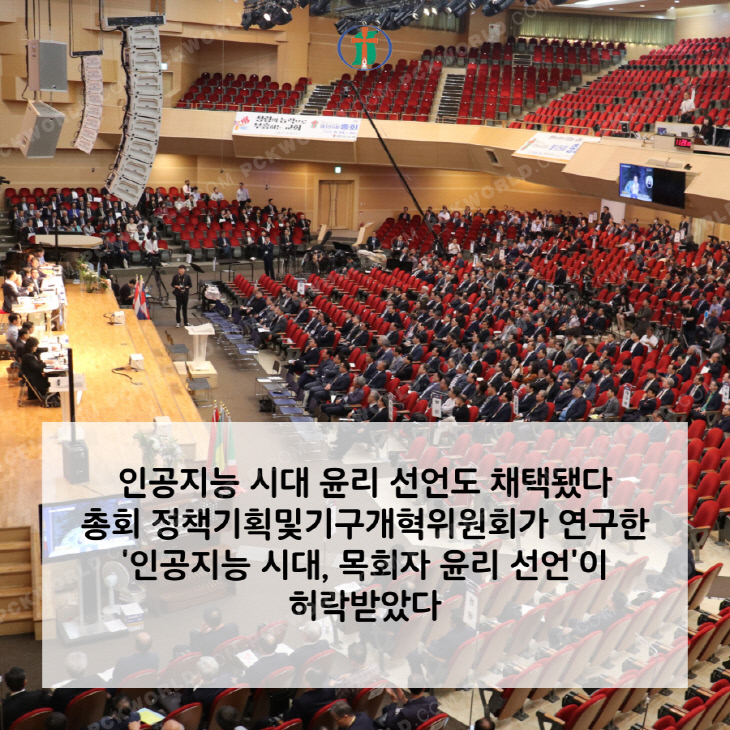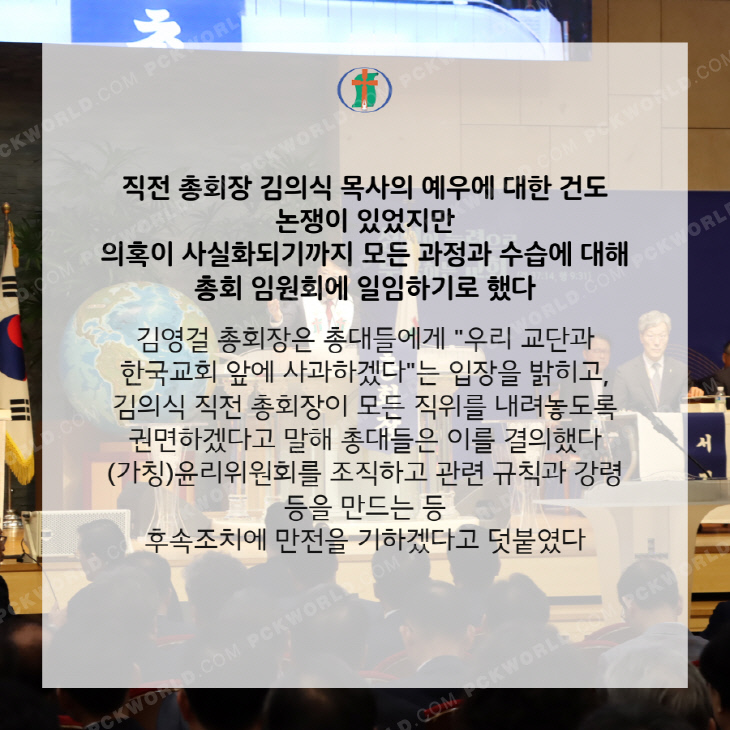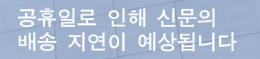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ฅ์ ์ ์ฅํฉ ] ํฅ์ ์ ์ฅํฉ
๊ฐ์๊ธธ
2013๋
04์ 24์ผ(์) 09:58
ํ์๋ ๋ฐ๋ ๋๋ ์์ด ์๋ ํํ๋ง์์ ์๋ ๊ตํ์ ๊ฐ๊ณ ์ถ์๋ค. ์ฐ๋ฆฌ๋๋ผ์ ์ ํต ๋ฌธํ๊ฐ ๊ฐ์ฅ ๊ฐํ๊ฒ ๋จ์ ๊ทธ ๊ตํ์๋ ๋ถ๋ช
ํ ๋จ๋ค๋ฅธ ํ๋๋์ ์ญ์ฌ๊ฐ ์์ ๊ฒ์ด๋ผ๊ณ ์๊ฐํ๊ธฐ ๋๋ฌธ์ด๋ค. ๋ฌด์์ ์ฐพ์๊ฐ ํํ๊ตํ์์ ๋ฐ์ง๋ฐํ ์ผ๊พผ ๊น๊ธฐ์ ์ง์ฌ(73)๋ฅผ ๋ง๋ฌ๋ค.
ใ
์๋ฆ๋ต๊ธฐ ๊ทธ์ง์๋ ์๋ ํํ๊ตํ๋ ํ์ฌ 92๋ ๋ ๊ตํ๋ก ์ด ํฐ๊ฐ ๊ณง 6.25 ์๊ต์ง๋ค. ์ ์ ๋ ํ๋ฆฐ ์๊ต์ ํผ ์์ ์ธ์์ง ๊ตํ๋ค. ํํ๋ง์์ ์ ๊ตญ๋ฏผ๋ง์ด ์๋๋ผ ์ธ๊ตญ์ธ๋ค๋ ์์์ฃผ๋ ์ ํต๋ง์์ด๋ค. ์ด ์์ ๋ง์์ ์ฌ๋น์ด 7๊ฐ, ์ ์ด 2๊ฐ, ์ ๋น์ด 3๊ฐ๊ฐ ์๋ค. ๊ท์ ์ ์์งํ ์ฅ์น๋ค๋ง ํด๋ ์์ญ ๊ฐ๊ฐ ๋๋๋ค. ๊ทธ๋ฌ๋ ์ ๋ก์ ์ ํต ์์์ด ๋ง๋ค. ๊ทธ์ผ๋ง๋ก ์จ๊ฐ ์ก์ ์ด ๋ชจ์ธ ๋๋ค๋ค. ์ด๋ฐ ์ด์ ๋ก ๋ด์์ธ ๊น๋ช ์ง ๋ชฉ์ฌ์ ์ ๊ต์ธ์ด ๋์์์ด ๋์ ๊ธฐ๋๋ฅผ ํ ์๋ฐ์ ์๋ ๊ตํ๋ค.
ใ
์๋ ์ ํํ๋ง์์ ๊ฐ๋ํ๊ณ ์ธ์ง ๊ณณ์ด์์ผ๋ฏ๋ก ๊ต์ญ์๊ฐ ์์๋ค. ์ฃผ์ผ ์๋ฐฐ๋ ๋ค์ํ ์ฌ๋์ด ์์ ์ธ๋๋ฅผ ํ๋๋ฐ ๋๋ก๋ ์ ๋์ฌ๋์ด ์ค์ จ๊ณ ๋๋ก๋ ์ ํ์์ด ์ค๊ธฐ๋ ํ๋ค. ์์์๋ฐฐ์ ์ฃผ์ผ ์ ๋ ์๋ฐฐ์ ์ค์ค ๋ชฉํ์๊ฐ ์์ผ๋ฉด ํ๊ต ๊ต์ฅ ์ ์๋ ํ ๋ถ์ ์ด๋นํ๋ค. ๊ทธ ๋ถ์ 60๋ฆฌ ๋ฐ, ํ๊ฐ์ฐ ๊ธฐ์ญ์ ์ด์๋ค. ๊ฑฐ๊ธฐ์ ๊ฐ๋ ์ฐจ๊ฐ ์์ผ๋ ๊ฑธ์ด์ ๊ทธ ๊ต์ฅ ์ ์๋๊ป ์๋ฐฐ ์ธ๋๋ฅผ ๋ถํํ๋ฌ ๊ฐ์ผํ๋ค. ์๋ฐฐ๋ฅผ ๋๋ฆฌ๋ฌ ๊ฐ๋ ๊ฒ ์๋๋ผ ๊ทธ๋ถ๊ณผ ์ฝ์์ ํ๋ฌ 60๋ฆฌ๋ฅผ ๊ฑธ์ด๊ฐ์ ๋ค์ ๋ชจ์๊ณ ๋์์ค๋ ๊ฒ์ด๋ค. ์์นจ ๋จน๊ณ ๊ฑธ์ด๊ฐ์ ๊ทธ ๋ถ๊ณผ ์๋ดํด์ ์ฝ์์ ์ก๊ณ ๋์์ค๋ฉด ๋ฐค์ค์ด ๋๋ค. ์ฐ ๋ฅ์ ์ ํ๊ณ ์ค์๊ธธ์ ๋ฐ๋ผ ๊ฑฐ๊ธฐ๊น์ง ์ค๊ฐ๋ ๋ฐ ์ด ์๊ฐ์ด ๋๊ฒ ๊ฑธ๋ ธ๋ค. ๋ด ๊ฐ์์๋ ์ข ๊ฑธ์ ๋ง ํ์ผ๋ ์ฌ๋ฆ๊ณผ ๊ฒจ์ธ์ ๊ฑท๊ธฐ์๋ ๋๋ฌด๋ ๋จผ ๊ธธ์ด์๋ค.
ใ
๋ ๊ต์ญ์๊ฐ ์ค์๋ฉด ์์ฌ๋ฅผ ๋ฐ๋ค์ด์ผ ํ๋ค. ๊น ์ง์ฌ๊ฐ ๋ฉ๋ฆฌ์ ์ฌ๋๊น ํ ์์ผ ์ ๋
์ ๋ค์ด์์ ๊ตํ์์ ์์ผ ์์นจ ์์ฌ๋ฅผ ํด ๋๋ฆด ์๊ฐ ์์๋ค. ๊ทธ๋ฌ๋ฉด ๊ฐ์กฑ๋ค์ ๋ด๋ฒ๋ ค๋๊ณ ๋ผ๋ ๊ตํ์์ ์๊ณ ์์นจ์ ์ฐจ๋ ค ๋๋ ธ๋ค. ๋ชฉํ์ ๋ชจ์๊ธฐ๊ฐ ์ ๋ง๋ก ์์์ฐฎ์ ์ผ์ด์๋ค. ์ด๋ฌํ ๋์ ๋นํ๋ฉด ์ค๋์ ๋ชฉํ์๊ฐ ๋ง์์ ๊ต์ธ๋ค์ด ์ฐธ ํธํด์ก๋ค. ํ์ง๋ง ๋ชธ์ด ํธํด์ง ๋์ ์ ์์ ๋ ๋์จํด์ก๋ค. ๋ณธ์ธ์ด 60๋ฆฌ ๊ธธ์ ์ค๊ฐ๋ ๊ทธ ์ค์ฒ๊ณผ ๋ฏฟ์์ ์์ด๊ฐ๋ค๊ณ ๊น๊ธฐ์ ์ง์ฌ๋ ์์ฌ์ํ๋ค.
ใ
๊น๊ธฐ์ ์ง์ฌ๊ฐ ์ฌ๋ ์ง์ ๊ตํ์์ 2km ๊ฐ๋ ๋จ์ด์ง ํํ2๋ฆฌ๋ค. ๋งค์ผ ์๋ฒฝ๊ธฐ๋๋ฅผ ๊ฑธ์ด์ ๋ค๋๋ค๊ฐ ์์ฃผ ํฐ ์ผ์ ๋ง๋ ์ ์ด ์๋ค. ๋ฌ์ด ์๋ ๋ ์ ๊ทธ๋๋ง ์ฌ๋ฐฉ์ ๋ณผ ์ ์๋๋ฐ ๋ฌ ์๋ ๋ฐค์ ๊ทธ์ผ๋ง๋ก ์น ํ ๊ฐ์ ์ด๋ ์ด๋ค. ์ฐ๋ชจํ์ด๋ฅผ ๋ฐ๋ผ ๋ ๋๋ก๋ฅผ ๊ผฌ๋ถ๊ผฌ๋ถ ๊ฑธ์ด์จ๋ค. 2์๋ง์ฏค ๋๋ฉด ์ผ์์ด ๋ น์ ๋๋ค. ๊ทธ ๊ณ ์ํ ์ด๋ ์์์ ๋คํ ์ ์ฒด๋ฅผ ์ชผ๊ฐ๋ ๋ฏ์ด ๊ฑฐ๋ํ ์๋ฆฌ๊ฐ '์ง์' ์ธ๋ฆฐ๋ค. ๊ทธ ์๋ฆฌ์ ๋ฑ๊ณจ์ด ์ค์นํด์ง๊ณ ์จ๋ชธ์ ์๋ฆ์ด ๋๋๋ค. ์ด๋ ์์์ ๋๊ตฐ๊ฐ ๋ท๋๋ฏธ๋ฅผ ๋์์ฑ ๊ฒ ๊ฐ์์ ์์ ๋์ด ๋ค ๋๋ค.
ใ
๊ทธ ์๋ฒฝ ๊น ์ง์ฌ๋ ์ฑ๊ฒฝ์ฑ ๊ฐ๋ฐฉ์ ๋ค๊ณ ๊ตํ๋ก ๊ฐ๊ณ ์์๋ค. ํํ ๋ง์๋ก ๋์๋ค์ด์ค๋ ์ด๊ท์์ ์ธ๊ธฐ์ฒ์ด ๋ค๋ ธ์ผ๋ ๊ทธ๊ฒ์ ์ง์น์ ์๋ฆฌ๊ฑฐ๋ ํ๋ค. ๊ทธ๋ฐ๋ฐ ์ ์ ํ ๋ ๊ฐ์ ์ด๋ ์ด ์์ง์ด๋๋ ํ์ผ๋ก ๊น ์ง์ฌ๋ฅผ ๋์ด๋จ๋ ธ๋ค. ์ด๋ ์์ด๋ผ ์ผ๊ตด์ ๋ณผ ์๋ ์์์ผ๋ ๊นกํจ ๋ ๋ช ์ด์๋ค. ๊น ์ง์ฌ๊ฐ ๋์ด์ง์ ๊นกํจ ํ ๋ช ์ด ๋ฐ๋ก ๊ฐ์ด์ ์ง๋๋ ๋ค.
ใ
"์์ฃผ๋ฉ์. ๋ ๋ด ๋์ผ์ด์."
ใ
์ฅ์ ์ ๋ฐ์ ๊ฐ์ด์ด ๋๋ ค ์จ๋ ์ด ์๊ฐ ์์๋ค. ๊ฐ๋๋ค์ด ๊น ์ง์ฌ๋ฅผ ๋๋ฆฌ๊ณ ๋ฐ๋ก ๊ฑท์ด์ฐจ๊ธฐ๊น์ง ํ๋ค. ๋๋ฌด๋ ๊ณ ํต์ค๋ฌ์ด๋ฐ ๊น ์ง์ฌ๋ ๊ทธ ๊นกํจ๋ค์ ์ํด ๊ธฐ๋ํ๋ค. ์ค์ฃฝํ๋ฉด ์ด๋ฐ ์ง์ ํ ๊น? ๊ตฌ์ฌ์ผ์, ํ์ ๊ธฐ์ฌ์ ๋์์ผ๋ก ์๊ธฐ๋ฅผ ๋ฒ์ด๋ฌ๋ค.
ใ
๊น ์ง์ฌ๋ ๊ทธ ๋ค์๋ ์๋ ๊ทธ ๋ค์๋ ์๋ ๋๊ฐ์ด ์๋ฒฝ๊ธฐ๋๋ฅผ ๋ค๋ ๋ค. ์์ง๋ ๊ทธ๋ ๋ง์ ์๋ฆฌ๊ฐ ๊ณ ํต์ค๋ฌ์ธ ๋๊ฐ ์๋จ๋ค.
ใ
 |
||
์๋ฆ๋ต๊ธฐ ๊ทธ์ง์๋ ์๋ ํํ๊ตํ๋ ํ์ฌ 92๋ ๋ ๊ตํ๋ก ์ด ํฐ๊ฐ ๊ณง 6.25 ์๊ต์ง๋ค. ์ ์ ๋ ํ๋ฆฐ ์๊ต์ ํผ ์์ ์ธ์์ง ๊ตํ๋ค. ํํ๋ง์์ ์ ๊ตญ๋ฏผ๋ง์ด ์๋๋ผ ์ธ๊ตญ์ธ๋ค๋ ์์์ฃผ๋ ์ ํต๋ง์์ด๋ค. ์ด ์์ ๋ง์์ ์ฌ๋น์ด 7๊ฐ, ์ ์ด 2๊ฐ, ์ ๋น์ด 3๊ฐ๊ฐ ์๋ค. ๊ท์ ์ ์์งํ ์ฅ์น๋ค๋ง ํด๋ ์์ญ ๊ฐ๊ฐ ๋๋๋ค. ๊ทธ๋ฌ๋ ์ ๋ก์ ์ ํต ์์์ด ๋ง๋ค. ๊ทธ์ผ๋ง๋ก ์จ๊ฐ ์ก์ ์ด ๋ชจ์ธ ๋๋ค๋ค. ์ด๋ฐ ์ด์ ๋ก ๋ด์์ธ ๊น๋ช ์ง ๋ชฉ์ฌ์ ์ ๊ต์ธ์ด ๋์์์ด ๋์ ๊ธฐ๋๋ฅผ ํ ์๋ฐ์ ์๋ ๊ตํ๋ค.
ใ
์๋ ์ ํํ๋ง์์ ๊ฐ๋ํ๊ณ ์ธ์ง ๊ณณ์ด์์ผ๋ฏ๋ก ๊ต์ญ์๊ฐ ์์๋ค. ์ฃผ์ผ ์๋ฐฐ๋ ๋ค์ํ ์ฌ๋์ด ์์ ์ธ๋๋ฅผ ํ๋๋ฐ ๋๋ก๋ ์ ๋์ฌ๋์ด ์ค์ จ๊ณ ๋๋ก๋ ์ ํ์์ด ์ค๊ธฐ๋ ํ๋ค. ์์์๋ฐฐ์ ์ฃผ์ผ ์ ๋ ์๋ฐฐ์ ์ค์ค ๋ชฉํ์๊ฐ ์์ผ๋ฉด ํ๊ต ๊ต์ฅ ์ ์๋ ํ ๋ถ์ ์ด๋นํ๋ค. ๊ทธ ๋ถ์ 60๋ฆฌ ๋ฐ, ํ๊ฐ์ฐ ๊ธฐ์ญ์ ์ด์๋ค. ๊ฑฐ๊ธฐ์ ๊ฐ๋ ์ฐจ๊ฐ ์์ผ๋ ๊ฑธ์ด์ ๊ทธ ๊ต์ฅ ์ ์๋๊ป ์๋ฐฐ ์ธ๋๋ฅผ ๋ถํํ๋ฌ ๊ฐ์ผํ๋ค. ์๋ฐฐ๋ฅผ ๋๋ฆฌ๋ฌ ๊ฐ๋ ๊ฒ ์๋๋ผ ๊ทธ๋ถ๊ณผ ์ฝ์์ ํ๋ฌ 60๋ฆฌ๋ฅผ ๊ฑธ์ด๊ฐ์ ๋ค์ ๋ชจ์๊ณ ๋์์ค๋ ๊ฒ์ด๋ค. ์์นจ ๋จน๊ณ ๊ฑธ์ด๊ฐ์ ๊ทธ ๋ถ๊ณผ ์๋ดํด์ ์ฝ์์ ์ก๊ณ ๋์์ค๋ฉด ๋ฐค์ค์ด ๋๋ค. ์ฐ ๋ฅ์ ์ ํ๊ณ ์ค์๊ธธ์ ๋ฐ๋ผ ๊ฑฐ๊ธฐ๊น์ง ์ค๊ฐ๋ ๋ฐ ์ด ์๊ฐ์ด ๋๊ฒ ๊ฑธ๋ ธ๋ค. ๋ด ๊ฐ์์๋ ์ข ๊ฑธ์ ๋ง ํ์ผ๋ ์ฌ๋ฆ๊ณผ ๊ฒจ์ธ์ ๊ฑท๊ธฐ์๋ ๋๋ฌด๋ ๋จผ ๊ธธ์ด์๋ค.
ใ
 |
||
ใ
๊น๊ธฐ์ ์ง์ฌ๊ฐ ์ฌ๋ ์ง์ ๊ตํ์์ 2km ๊ฐ๋ ๋จ์ด์ง ํํ2๋ฆฌ๋ค. ๋งค์ผ ์๋ฒฝ๊ธฐ๋๋ฅผ ๊ฑธ์ด์ ๋ค๋๋ค๊ฐ ์์ฃผ ํฐ ์ผ์ ๋ง๋ ์ ์ด ์๋ค. ๋ฌ์ด ์๋ ๋ ์ ๊ทธ๋๋ง ์ฌ๋ฐฉ์ ๋ณผ ์ ์๋๋ฐ ๋ฌ ์๋ ๋ฐค์ ๊ทธ์ผ๋ง๋ก ์น ํ ๊ฐ์ ์ด๋ ์ด๋ค. ์ฐ๋ชจํ์ด๋ฅผ ๋ฐ๋ผ ๋ ๋๋ก๋ฅผ ๊ผฌ๋ถ๊ผฌ๋ถ ๊ฑธ์ด์จ๋ค. 2์๋ง์ฏค ๋๋ฉด ์ผ์์ด ๋ น์ ๋๋ค. ๊ทธ ๊ณ ์ํ ์ด๋ ์์์ ๋คํ ์ ์ฒด๋ฅผ ์ชผ๊ฐ๋ ๋ฏ์ด ๊ฑฐ๋ํ ์๋ฆฌ๊ฐ '์ง์' ์ธ๋ฆฐ๋ค. ๊ทธ ์๋ฆฌ์ ๋ฑ๊ณจ์ด ์ค์นํด์ง๊ณ ์จ๋ชธ์ ์๋ฆ์ด ๋๋๋ค. ์ด๋ ์์์ ๋๊ตฐ๊ฐ ๋ท๋๋ฏธ๋ฅผ ๋์์ฑ ๊ฒ ๊ฐ์์ ์์ ๋์ด ๋ค ๋๋ค.
ใ
๊ทธ ์๋ฒฝ ๊น ์ง์ฌ๋ ์ฑ๊ฒฝ์ฑ ๊ฐ๋ฐฉ์ ๋ค๊ณ ๊ตํ๋ก ๊ฐ๊ณ ์์๋ค. ํํ ๋ง์๋ก ๋์๋ค์ด์ค๋ ์ด๊ท์์ ์ธ๊ธฐ์ฒ์ด ๋ค๋ ธ์ผ๋ ๊ทธ๊ฒ์ ์ง์น์ ์๋ฆฌ๊ฑฐ๋ ํ๋ค. ๊ทธ๋ฐ๋ฐ ์ ์ ํ ๋ ๊ฐ์ ์ด๋ ์ด ์์ง์ด๋๋ ํ์ผ๋ก ๊น ์ง์ฌ๋ฅผ ๋์ด๋จ๋ ธ๋ค. ์ด๋ ์์ด๋ผ ์ผ๊ตด์ ๋ณผ ์๋ ์์์ผ๋ ๊นกํจ ๋ ๋ช ์ด์๋ค. ๊น ์ง์ฌ๊ฐ ๋์ด์ง์ ๊นกํจ ํ ๋ช ์ด ๋ฐ๋ก ๊ฐ์ด์ ์ง๋๋ ๋ค.
ใ
"์์ฃผ๋ฉ์. ๋ ๋ด ๋์ผ์ด์."
ใ
์ฅ์ ์ ๋ฐ์ ๊ฐ์ด์ด ๋๋ ค ์จ๋ ์ด ์๊ฐ ์์๋ค. ๊ฐ๋๋ค์ด ๊น ์ง์ฌ๋ฅผ ๋๋ฆฌ๊ณ ๋ฐ๋ก ๊ฑท์ด์ฐจ๊ธฐ๊น์ง ํ๋ค. ๋๋ฌด๋ ๊ณ ํต์ค๋ฌ์ด๋ฐ ๊น ์ง์ฌ๋ ๊ทธ ๊นกํจ๋ค์ ์ํด ๊ธฐ๋ํ๋ค. ์ค์ฃฝํ๋ฉด ์ด๋ฐ ์ง์ ํ ๊น? ๊ตฌ์ฌ์ผ์, ํ์ ๊ธฐ์ฌ์ ๋์์ผ๋ก ์๊ธฐ๋ฅผ ๋ฒ์ด๋ฌ๋ค.
ใ
๊น ์ง์ฌ๋ ๊ทธ ๋ค์๋ ์๋ ๊ทธ ๋ค์๋ ์๋ ๋๊ฐ์ด ์๋ฒฝ๊ธฐ๋๋ฅผ ๋ค๋ ๋ค. ์์ง๋ ๊ทธ๋ ๋ง์ ์๋ฆฌ๊ฐ ๊ณ ํต์ค๋ฌ์ธ ๋๊ฐ ์๋จ๋ค.
๊ฐ์๊ธธ/์จ๋๋ฆฌ๊ตํ, ์์ค๊ฐ, ๋ด์ธ์์ฐ๊ธฐ ํ๊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