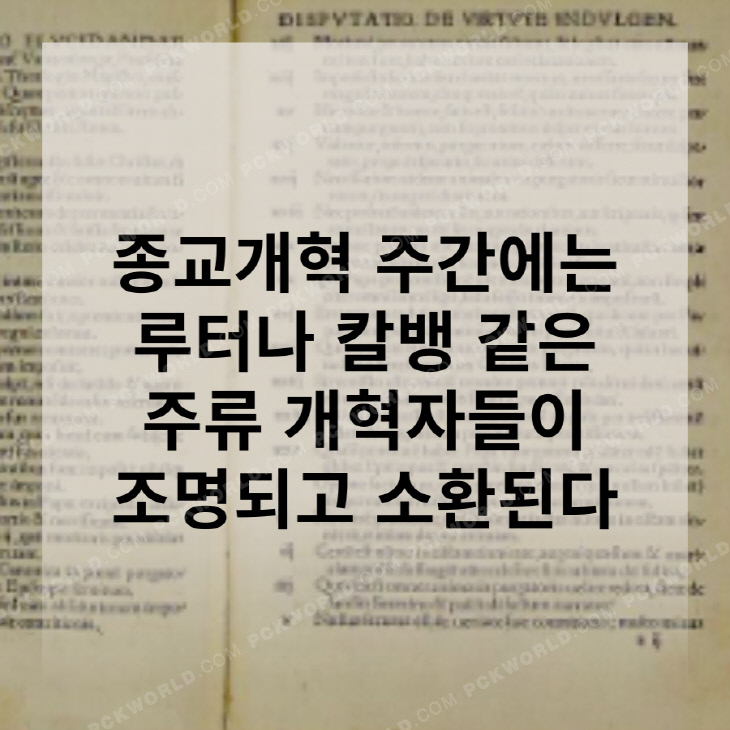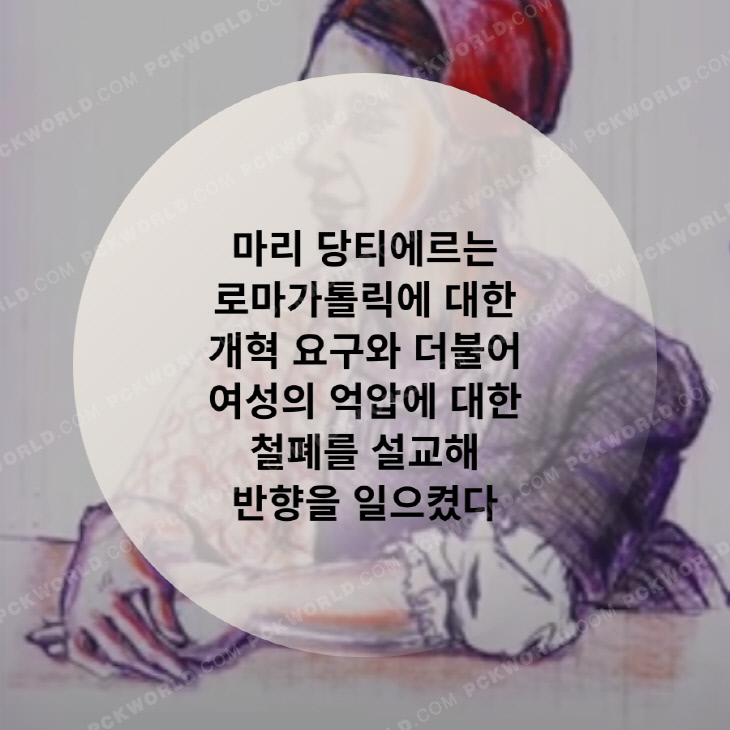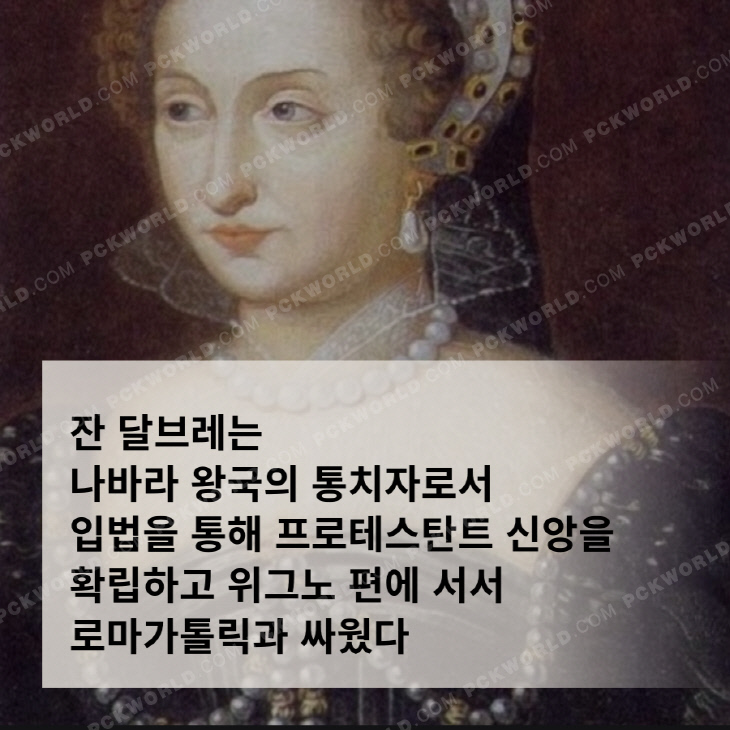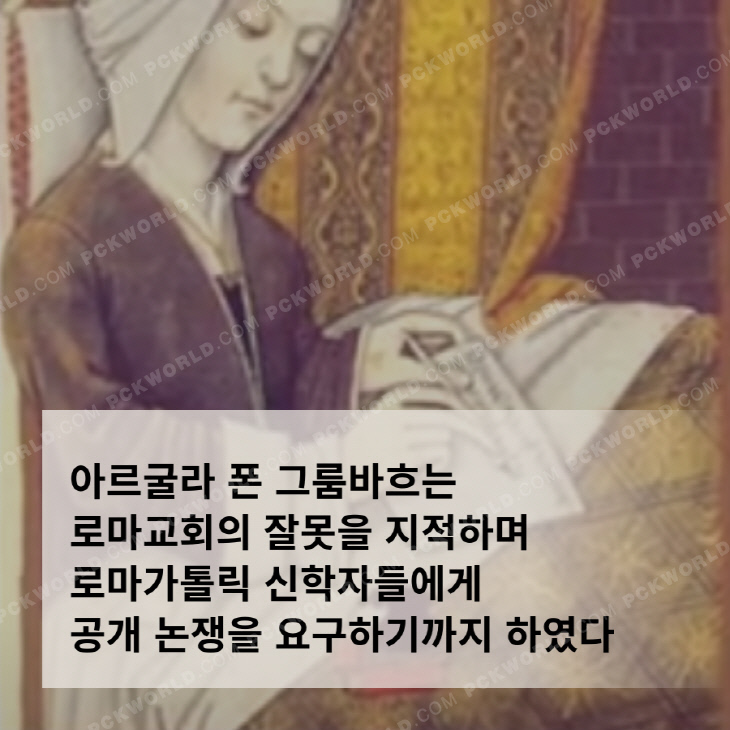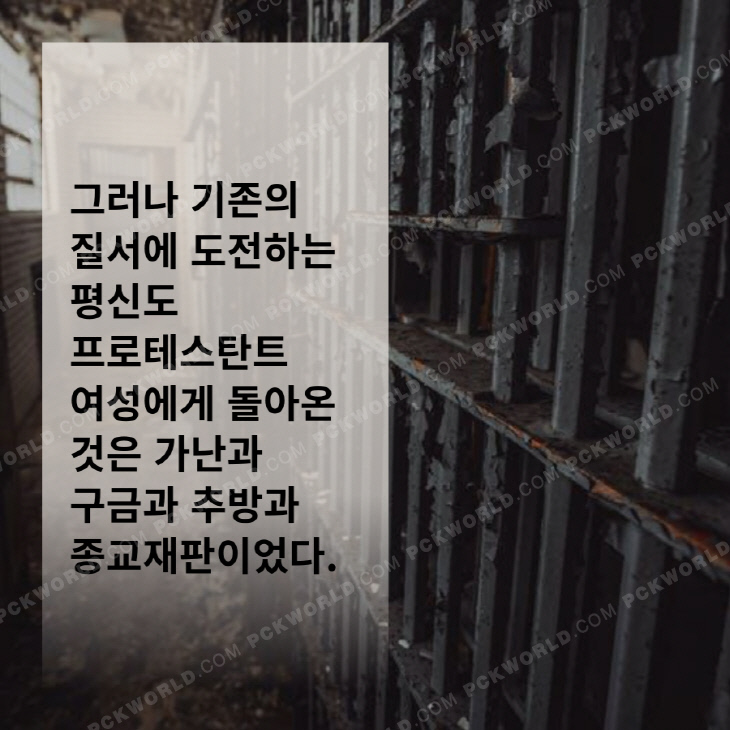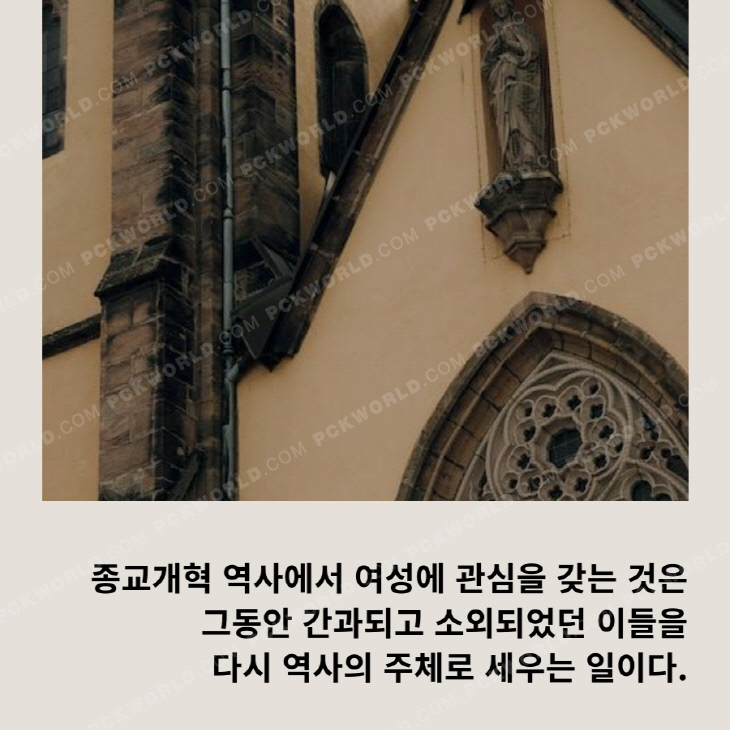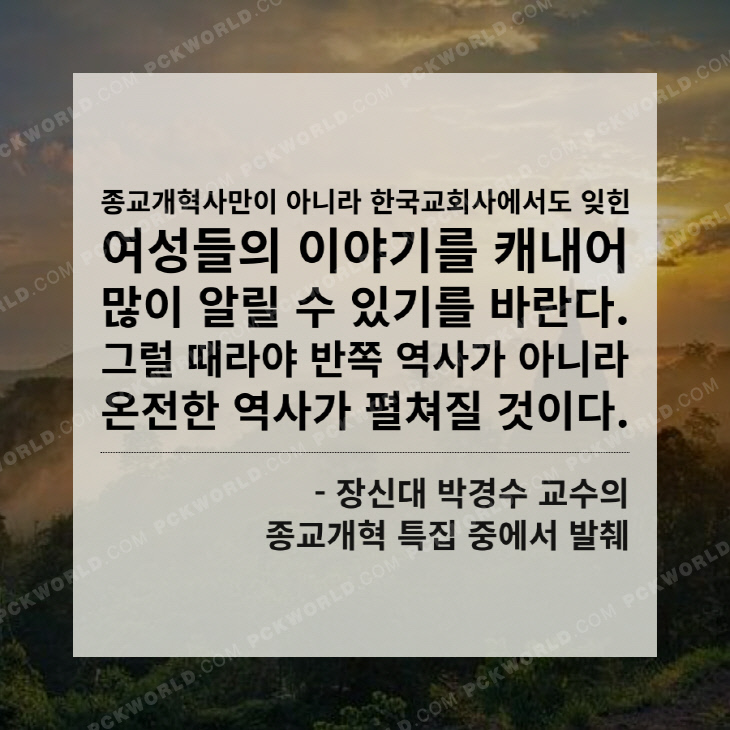[ 기고 ]
정병운/목사ㆍ옥곡교회
어느날 아침, 봉고차 백미러 위에 작은새 한마리가 앉아 있었다. 온 몸이 밤색 무늬 빛깔로 덮여 무척 고운, 작고 앙증맞은 새였다.
나는 그 새를 잠깐 쳐다보았을 뿐 별로 관심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어도 그 새는 떠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새를 관찰하기로 마음먹고 멀리서 숨어 새를 바라보았다.
묘한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무슨 조류관찰자나 된 듯한 기분이었다.
새는 차 주위를 맴돌았다. 새의 목표는 거울이다. 거울 앞에서 계속 푸드득 거리다 힘이 부치면 내려 앉았다. 잠시후 다시 날아올라 백미러에 부딪쳐 푸드득 거렸다. 새는 그 속으로 들어갈 모양이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가만히 보니 거울속 친구새가 목표였다. 우연히 백미러를 지나가다가 거울속 친구새를 발견했다. 그 새를 만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것이다.
자기와 모든 것이 똑같고, 외로움을 덜어줄 한 마리 새, 어떻게 하면 저 새를 만날 수 있을까, 내내 시도하고 시도하지만 번번히 알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쳤을 것이다. 이내 쓴 좌절을 맛보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다. 아마 외로움이 무척 진했나 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만큼은 꼭 만나 이야기해 보리라는 굳은 결심만큼이나 벽은 너무 두텁다. 그 새는 이렇게 사흘을 시도했다. 아무런 결실도 없었지만 나 역시 차를 써야 했기에 밤색 새의 친구새 동행작전은 아쉽게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탕자비유가 생각났다. 탕자는 저 먼 환상의 세계를 그리워했다. 새는 갈 수 없어 포기했을 그 세계이지만 둘째아들은 실제로 갈 수 있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새는 친구새를 만나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은 한동안 굉장히 친한 것같은 친구들을 만났다. 잠시이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온 몸에 밤색 무늬처럼 묻어 있는 외로움을 털어내었다.
하지만 쾌락도 잠시, 순간의 환상이 끝나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감사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저곳에 있다하여도 만족이 없다. 그곳에 분명하게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진리가 아닐때 허상이 된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일이다. 세상의 여러 유혹 역시 우리 눈을 속일때가 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을 말씀의 빗자루로 쓸어 내리고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진리로 채워나가자. 행여나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절기로 삼자. 그리스도인이 술로, 각종 잘못된 오락으로 외로움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실 때 우릴 외롭게 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더 적고 풀이 더 많이 나 있는 길로 걸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한 로버트 프로스트처럼 좁은 길로 걸어가자.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