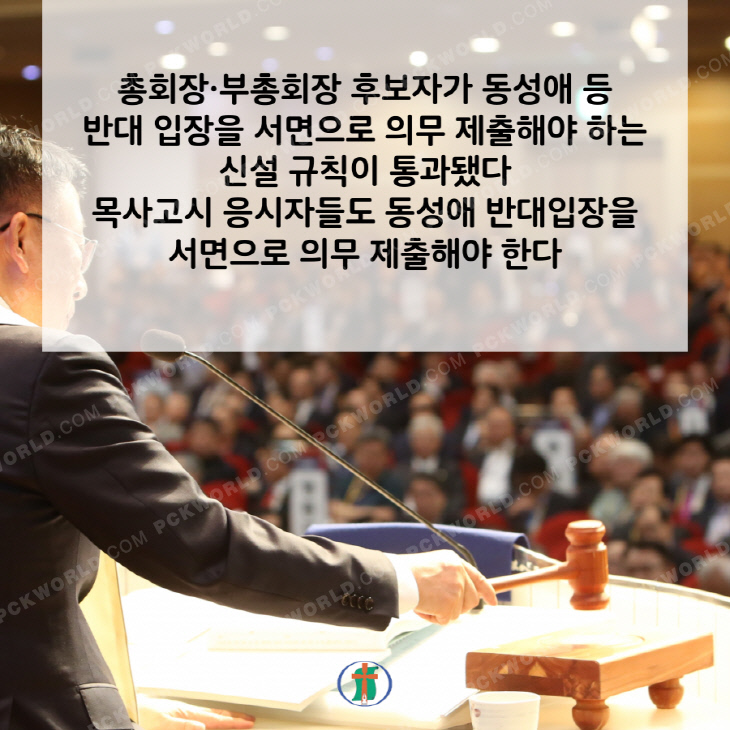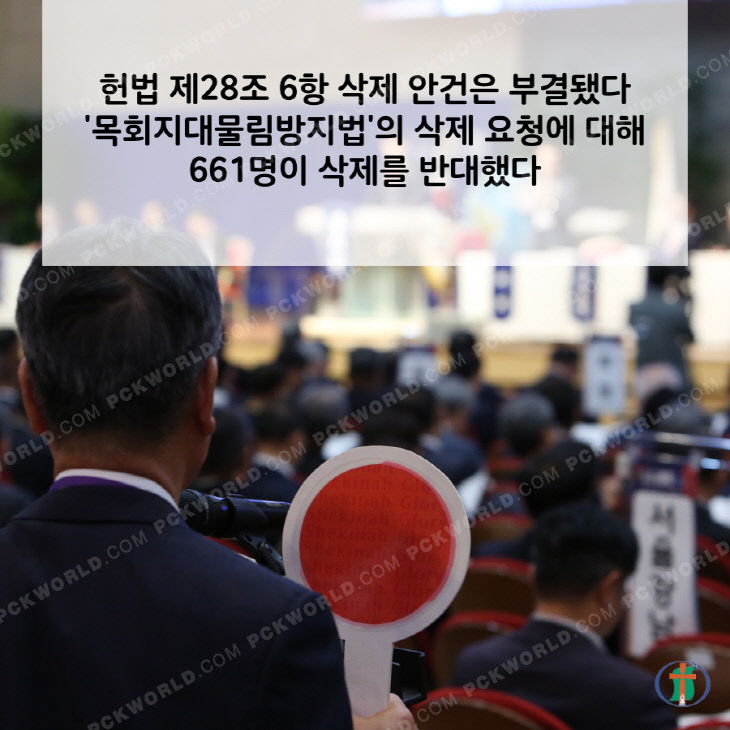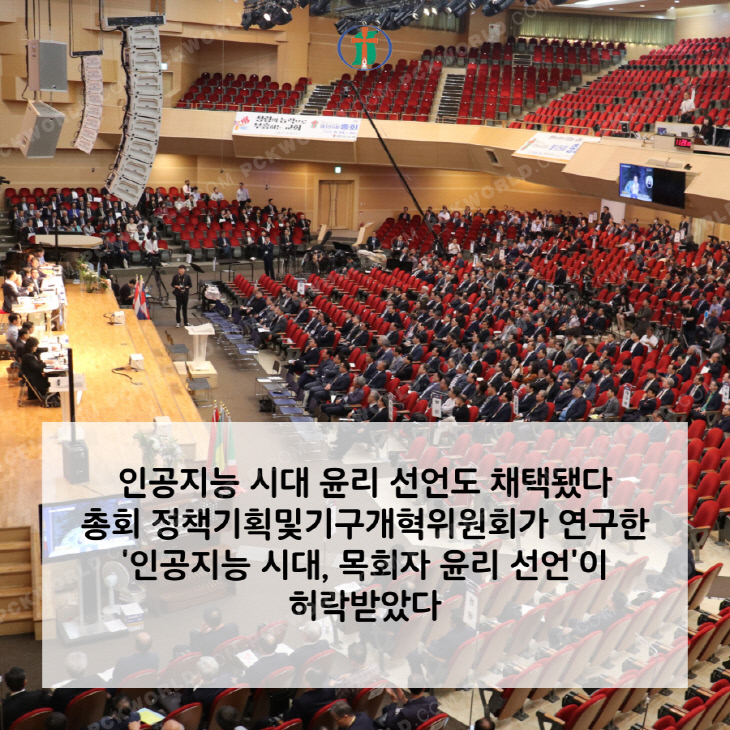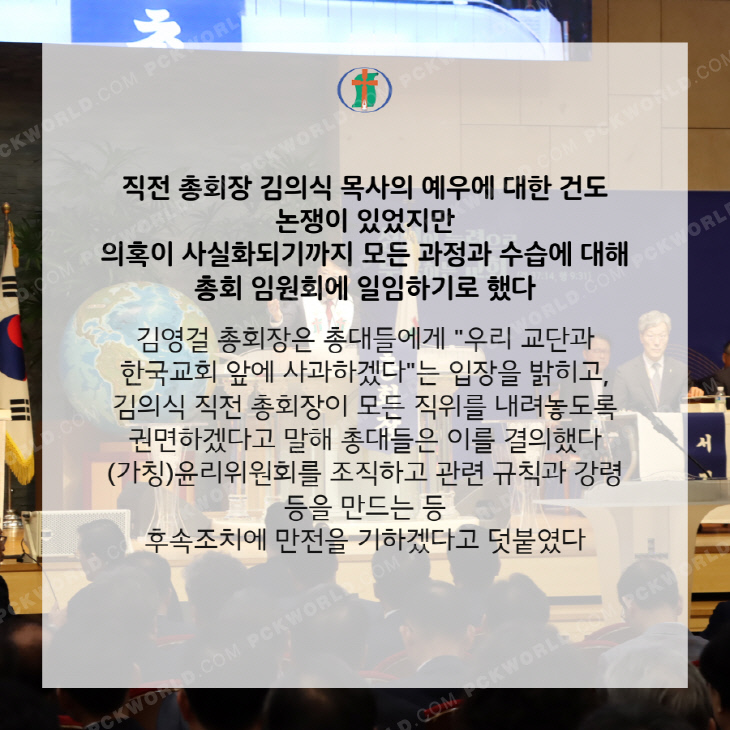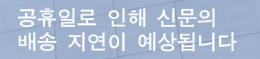[ 포토뉴스 ] 성탄절에 만난 사람 '노숙인들의 의료 천사' 최영아 과장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의사 최영아 씨.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거리의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그녀의 삶은 이 땅에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한다.
성탄절, '노숙인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의사다. 좋은 대학에서 남들보다 더 오래 공부했고 그래서 누구라도 부러워 할 만한 직업을 갖게 됐다. 대학병원의 고액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기에 가진 것 누리면서 평범한 '의사'로 살아 갈 수도 있었다. 더구나 요즘처럼 '돈'이 인생의 성공 잣대가 되는 시대에 더더욱 그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가장' 돈이 안되는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들이었다.
내과의 최영아(도티기념병원 과장). "평생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사가 안정되고 편한 직업일 수 있냐?"고 반문하는 그는 "나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약하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 일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의사면허증만으로 쉽게 돈 벌수 있는 일을 한 두번 해봤지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다.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병원에서의 일들은 내게 더 큰 인내를 필요로 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2001년 전문의가 된 후 15년 동안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서울역다시서기진료소 그리고 지금의 도티기념병원까지 삶의 끝에서 힘겹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잡은 이유다. 단 한푼의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의사도 좋았고, 100만원 안되는 월급이라도 싫지 않았다. 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떤 특별한 사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냥 의사라면 '가장 병이 많은 곳'에 가야한다는 신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노숙자들과의 첫 만남은 예과 2학년 때였다. 동아리 선배를 따라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의 무료급식소에서 설겆이 봉사를 하면서 빗물에 밥을 말아먹는 노숙자를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아픈 곳이 많겠다 였다"는 그는 "누군가는 저들을 돌봐야 할텐데 내가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본과 이후부터 다일공동체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했고 전문의가 된 후에는 다일천사병원 개원부터 참여해 2004년까지 일했다.
"어차피 누구는 해야 할 일"이라는 그는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만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이왕이면 나는 환자와의 만남을 즐기고 싶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 깨닫고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무슨 일이든 '말'처럼 쉬운 일은 없다. 진료하다가 욕을 먹거나 멱살을 잡히는 일도 있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무시를 받고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삶을 포기하고 자해하는 모습이나 매번 반복되는 질병,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5-6배나 병이 많고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웠다. 환자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여부와 병의 심각성을 사이에 두고 동역자들과의 갈등을 겪을 때면 그 어느 때보다 괴롭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영원히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그들의 삶이다. 그는 "무료진료 한번 받았다고 벌떡 일어서지 못하고 밥 한번 먹여준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같은 환자를 어느 때는 거리에서 또 어느날은 시설에서 다른날은 병원에서 만날 때가 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이들의 삶은 언제나 같을 것"이라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다"고 말했다.
"노숙인 환자들의 공통점은 가족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것이 망가진 분들이다. 가난하더라도 가족관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오히려 쉬었다"는 그는 무료진료를 넘어서서 만성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활성화를 많은 단체들에 협력을 구하고 있다. 군대나 수용소 같은 집이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소규모의 사회다.
사람의 상처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지도 모른다. 그는 치료를 받고 사회에 나가 다시 병에 걸리거나, 사람에 걷어차이고 교도소 가고 다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는 그들의 일상이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해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이 "스스로 선택했던 환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그의 마음이 올 겨울 참 따뜻하게 전해온다. 그것만으로 그가 '노숙인들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데 어떤 이유도 달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