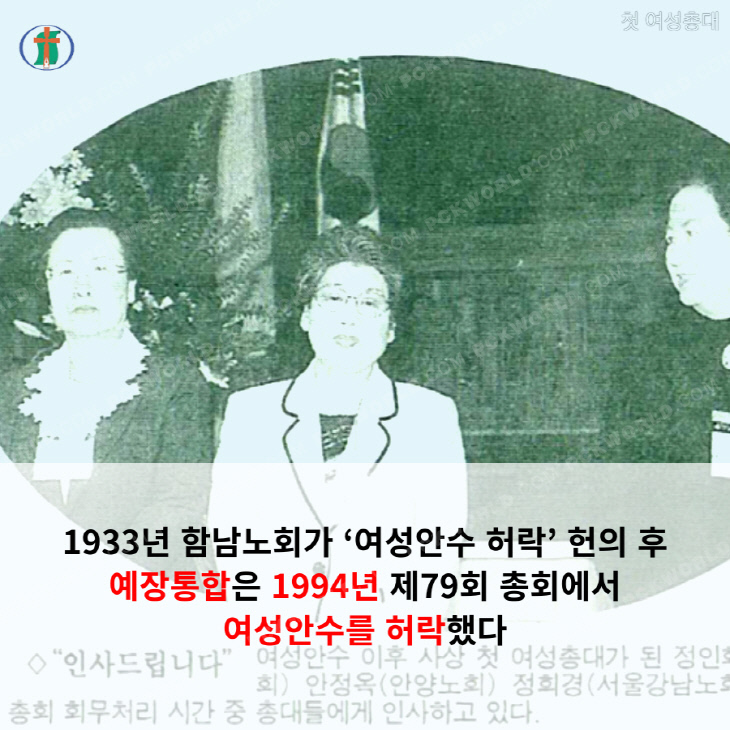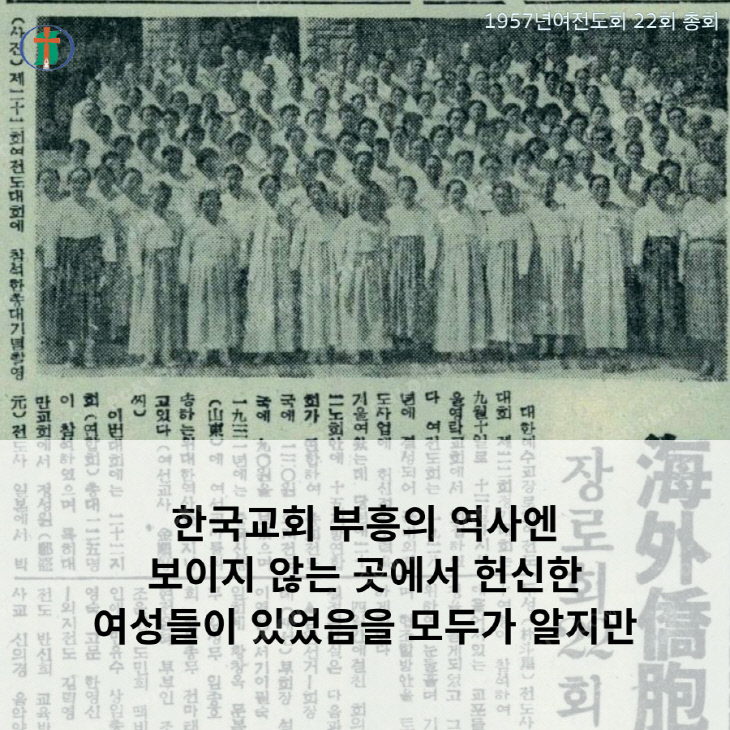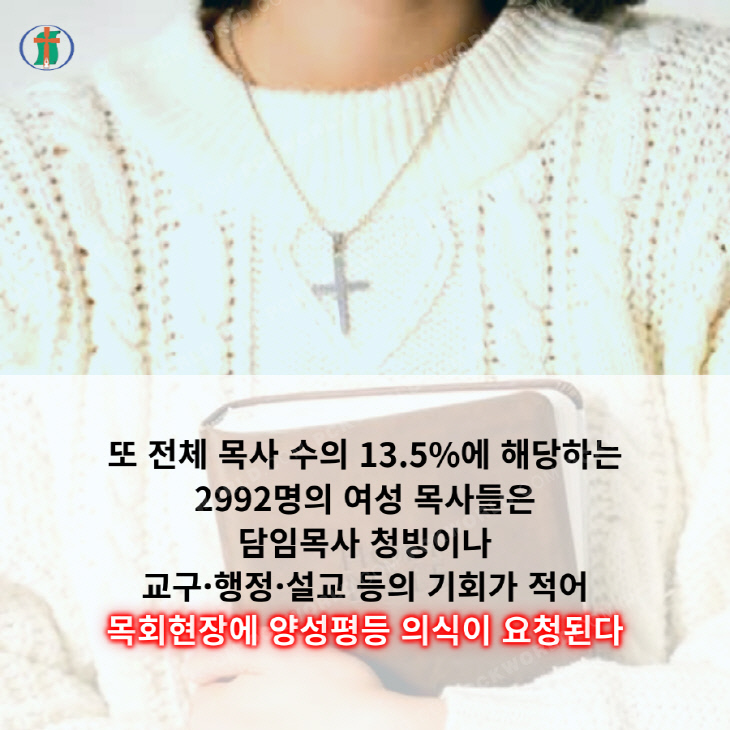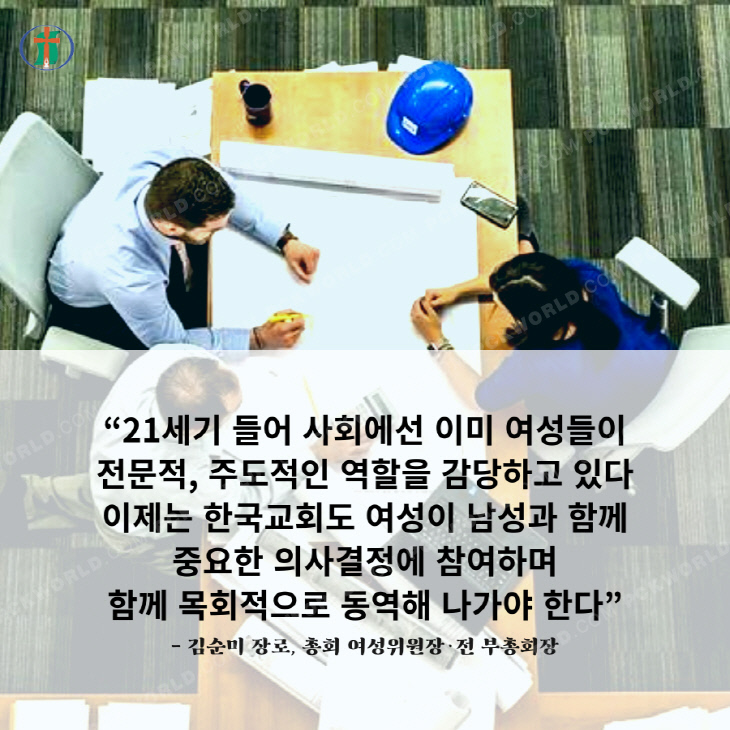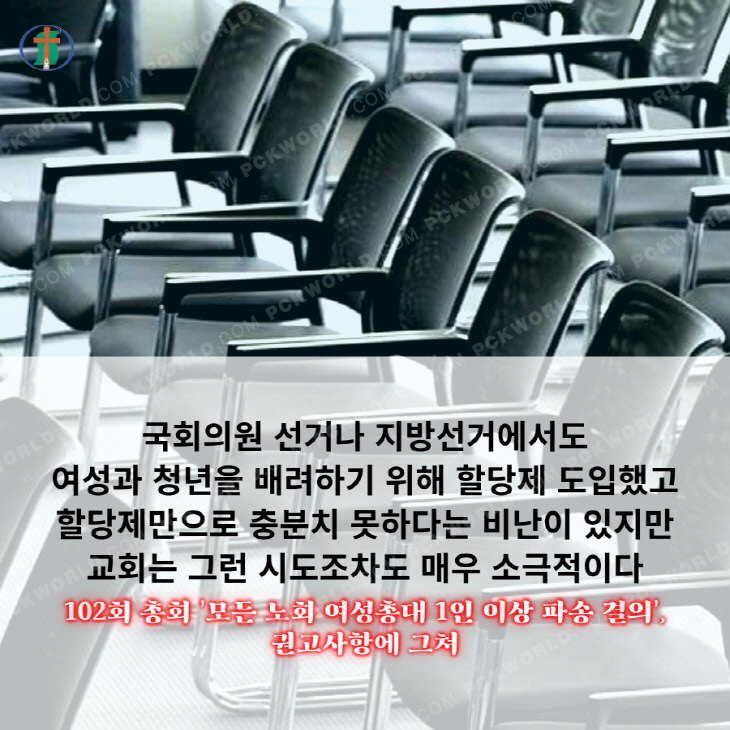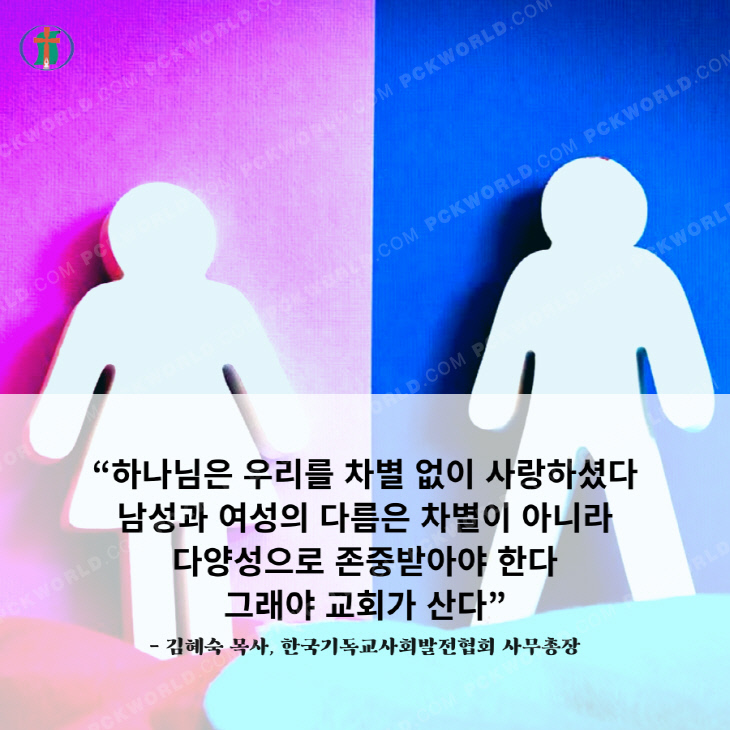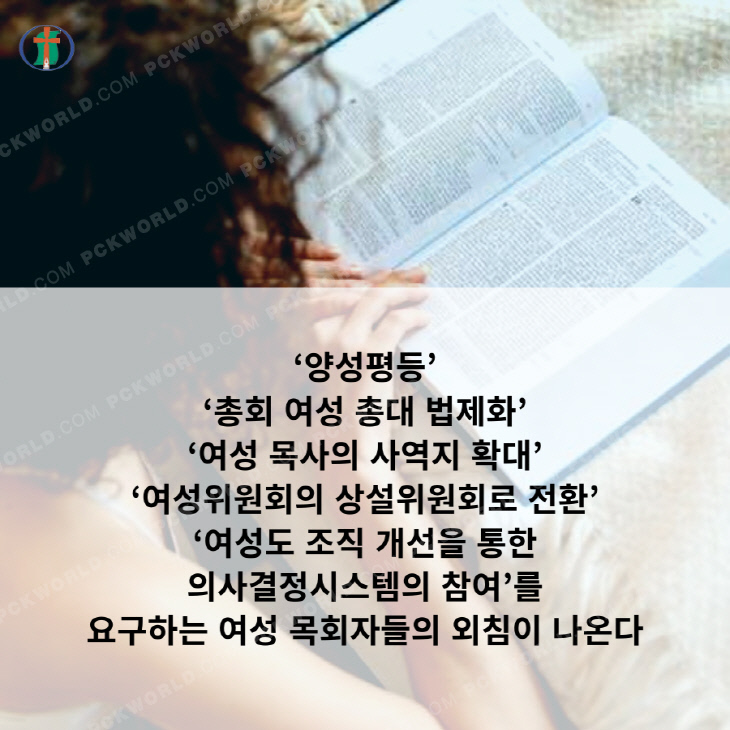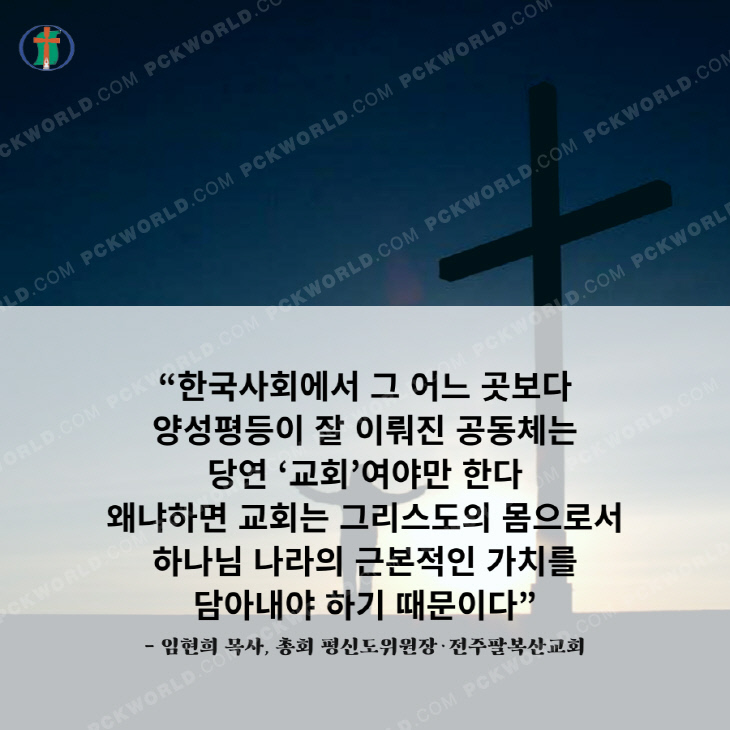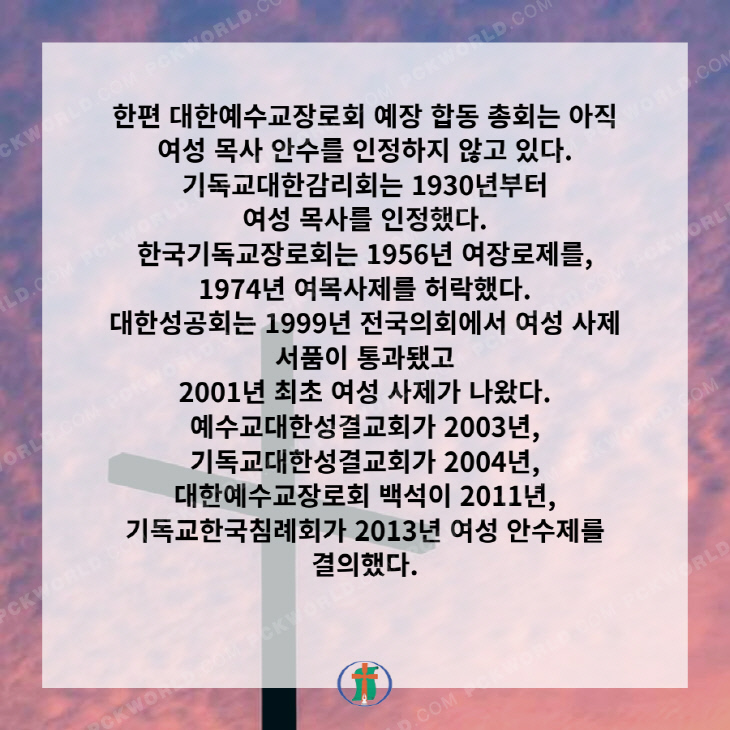[ 목양칼럼 ]
홍순영 목사
2024년 03월 28일(목) 12:52
|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교회에 부임하고 심방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음이 간절해 전화로 심방을 했다. 구역별, 가정별로 미리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가정에서 하는 심방 형식 그대로 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교회로 오게 해서 심방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니 훨씬 나았다. 올 수 없는 가정에는 문고리 심방을 했다.
모이는 인원 제한이 완화된 후에는 교회에서 구역별 심방을 했다. 그렇게 심방하며 메모한 각 가정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100페이지를 훌쩍 넘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각 가정별 심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가정 심방이 없었던 터라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목사님이 빗자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심방을 받는 집은 대청소에 돌입한다. 어느 가정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까지 닦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노 권사님은 건물 계단 난간도 닦았단다. 심방 받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안 왔다고도 했다. 심방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 분도 있다.
그런데 필자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 갔다. 그 집 계단의 높이도 눈에 밟혔다. 저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며 교회로 올 모습이 그려졌다.
멀리 떨어진 집을 향할 때는 교회에서 그 집까지의 거리가 그대로 가슴에 남았다. 이 먼 거리에서 예배를 참석하려면 도대체 몇 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볼 때면 다 목사의 탓인 것 같았다.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12월 30일이 되었다. 그날로 대심방의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맞이한 송구영신예배. 자리를 채운 성도들의 얼굴이, 눈동자가 그대로 다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사는 집과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넘실대는 듯했다.
교역자,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려는 순간 부목사님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담임목사님 부부를 위해 축복합시다"라고 말했다.
졸지에 앞으로 불려나갔다. 두 팔을 뻗어 축복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카메라를 들고 찍는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부족한 목사 가정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가슴 벅차게 와 닿았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심방(尋訪). 한자로는 찾을 심, 찾을 방이다.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 중.
홍순영 목사 / 오정교회
교회에 부임하고 심방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음이 간절해 전화로 심방을 했다. 구역별, 가정별로 미리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가정에서 하는 심방 형식 그대로 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교회로 오게 해서 심방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니 훨씬 나았다. 올 수 없는 가정에는 문고리 심방을 했다.
모이는 인원 제한이 완화된 후에는 교회에서 구역별 심방을 했다. 그렇게 심방하며 메모한 각 가정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100페이지를 훌쩍 넘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각 가정별 심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가정 심방이 없었던 터라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목사님이 빗자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심방을 받는 집은 대청소에 돌입한다. 어느 가정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까지 닦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노 권사님은 건물 계단 난간도 닦았단다. 심방 받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안 왔다고도 했다. 심방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 분도 있다.
그런데 필자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 갔다. 그 집 계단의 높이도 눈에 밟혔다. 저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며 교회로 올 모습이 그려졌다.
멀리 떨어진 집을 향할 때는 교회에서 그 집까지의 거리가 그대로 가슴에 남았다. 이 먼 거리에서 예배를 참석하려면 도대체 몇 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볼 때면 다 목사의 탓인 것 같았다.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12월 30일이 되었다. 그날로 대심방의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맞이한 송구영신예배. 자리를 채운 성도들의 얼굴이, 눈동자가 그대로 다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사는 집과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넘실대는 듯했다.
교역자,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려는 순간 부목사님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담임목사님 부부를 위해 축복합시다"라고 말했다.
졸지에 앞으로 불려나갔다. 두 팔을 뻗어 축복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카메라를 들고 찍는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부족한 목사 가정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가슴 벅차게 와 닿았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심방(尋訪). 한자로는 찾을 심, 찾을 방이다.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 중.
홍순영 목사 / 오정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