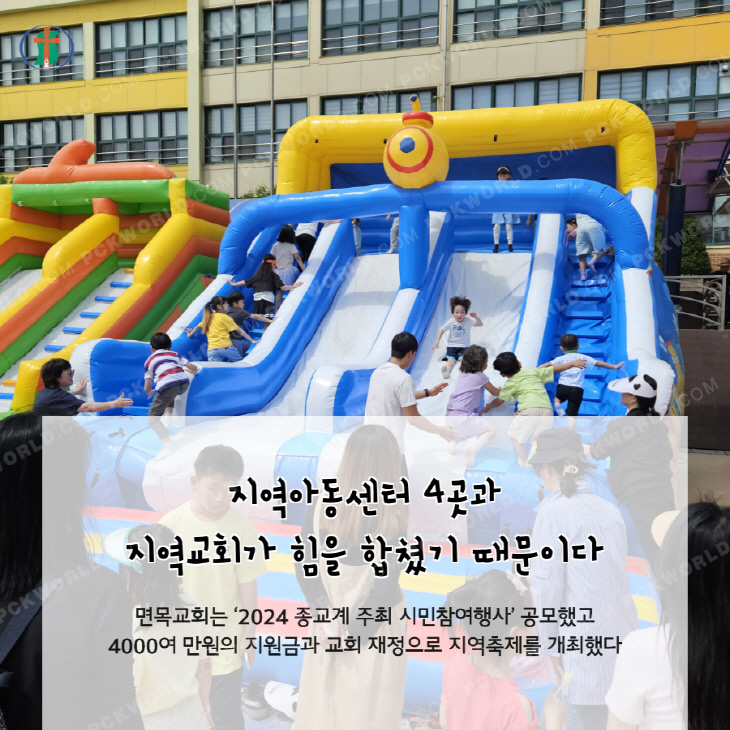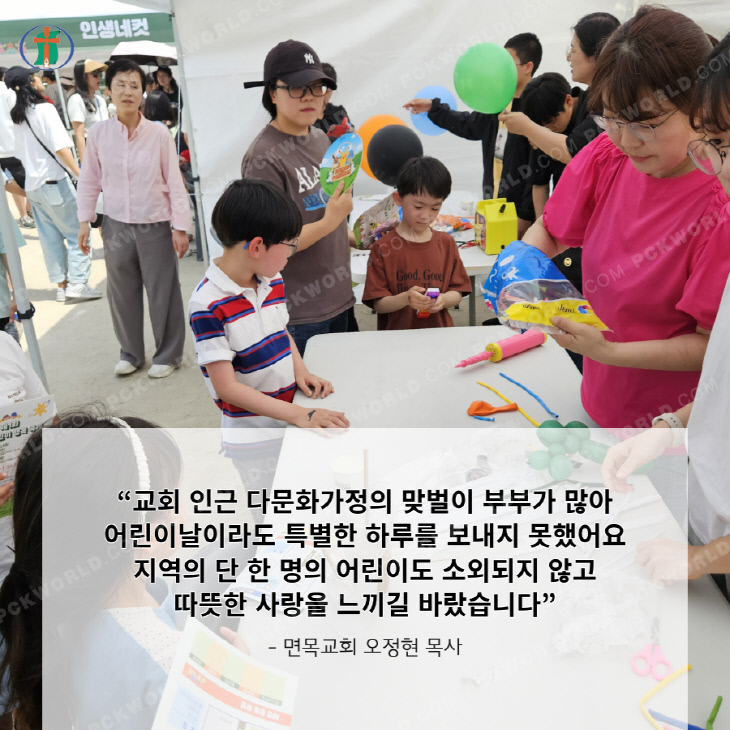[ 현장칼럼 ]
김자경 사무국장
2021년 11월 26일(금) 08:15
|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다. 우리는 때로 언어가 주는 감옥 안에 갇혀 산다. '비행(非行)' 또한 그렇다.
비행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이다. 즉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를 한 청소년'이다. 뜻이 이러하다 보니 아이들을 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언론에 비쳐진 '행위들'에 혀를 내두른다. 여파는 사회복지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게 적다. 채용공고를 냈을 때 비행청소년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이도 드물다.
"힘든 일 하시네요." "아이들이 무섭지 않으세요?"
비행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에 근무한다고 하면 으레 듣는 말들과 무관하지 않다.
1993년 이전의 나도 마찬가지였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고 멈칫했다. 멀찍이 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존재였다.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허물어졌다.
열다섯 살의 예진이는 얼굴도 모르는 낳아 준 엄마, 입양한 엄마를 거쳐 새 엄마의 학대로 집을 나왔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술 취한 아저씨의 지갑을 훔쳐 입소했다.
열네 살의 은아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았다. 언니의 자살로 엄마와 아이 모두 우울에 갇혔고, 아이는 집을 나왔다. 이내 알았다. 거리를 헤매다 보면 아저씨들이 와서 말을 걸고 술을 사주고, 본인들의 집에 데려가서 재워준다는 것을. 성매매로 입소했다.
열여섯 살의 민경이는 거리를 헤매 우범으로 시설에 들어왔다. 아빠는 새로 결혼한 상대를 위해 여덟 살의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아이는 바로 보육원을 나와 거리와 쉼터를 전전하며 살았다. 아이는 어른이라면 무조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비행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고단한 역사는 양파 같았다. 껍질만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는데, 그 껍질을 벗기니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에 화가 났다. 양파 속 하나하나가 상처요 아픔이었다. 속을 다 펼쳐놓고 보니,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감사했다.
1993년 봄을 시작으로 내게 '비행청소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라졌다. '나쁜 짓을 한 아이'가 아니라, '겪으면 안 될 경험을 당한 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아이'이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을 언어의 한계를 비로소 조금 넘어선 것이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상처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이기 전,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삶도 간과할 수 없다. 만나봐야 한다. 들여다봐야 한다. 알면, 달리 보일 것이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와 보라." 두 제자가 전해 들었던 언어의 한계를 아셨나 보다.
김자경 사무국장 / 나사로청소년의집
비행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이다. 즉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를 한 청소년'이다. 뜻이 이러하다 보니 아이들을 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언론에 비쳐진 '행위들'에 혀를 내두른다. 여파는 사회복지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게 적다. 채용공고를 냈을 때 비행청소년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이도 드물다.
"힘든 일 하시네요." "아이들이 무섭지 않으세요?"
비행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에 근무한다고 하면 으레 듣는 말들과 무관하지 않다.
1993년 이전의 나도 마찬가지였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고 멈칫했다. 멀찍이 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존재였다.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허물어졌다.
열다섯 살의 예진이는 얼굴도 모르는 낳아 준 엄마, 입양한 엄마를 거쳐 새 엄마의 학대로 집을 나왔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술 취한 아저씨의 지갑을 훔쳐 입소했다.
열네 살의 은아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았다. 언니의 자살로 엄마와 아이 모두 우울에 갇혔고, 아이는 집을 나왔다. 이내 알았다. 거리를 헤매다 보면 아저씨들이 와서 말을 걸고 술을 사주고, 본인들의 집에 데려가서 재워준다는 것을. 성매매로 입소했다.
열여섯 살의 민경이는 거리를 헤매 우범으로 시설에 들어왔다. 아빠는 새로 결혼한 상대를 위해 여덟 살의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아이는 바로 보육원을 나와 거리와 쉼터를 전전하며 살았다. 아이는 어른이라면 무조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비행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고단한 역사는 양파 같았다. 껍질만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는데, 그 껍질을 벗기니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에 화가 났다. 양파 속 하나하나가 상처요 아픔이었다. 속을 다 펼쳐놓고 보니,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감사했다.
1993년 봄을 시작으로 내게 '비행청소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라졌다. '나쁜 짓을 한 아이'가 아니라, '겪으면 안 될 경험을 당한 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아이'이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을 언어의 한계를 비로소 조금 넘어선 것이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상처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이기 전,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삶도 간과할 수 없다. 만나봐야 한다. 들여다봐야 한다. 알면, 달리 보일 것이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와 보라." 두 제자가 전해 들었던 언어의 한계를 아셨나 보다.
김자경 사무국장 / 나사로청소년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