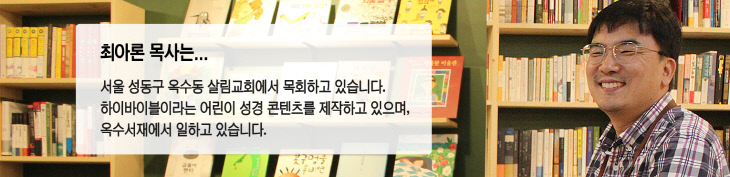[ кіөк°җмұ…л°© ] мқҖмң мқҳ 'м“°кё°мқҳ л§җл“Ө'
мөңм•„лЎ лӘ©мӮ¬
2020л…„ 09мӣ” 11мқј(кёҲ) 12:21
|
# мЎҙмһ¬лҘј м°ҫкё° мң„н•ң кёҖм“°кё°
н•ҳмқҙлҚ°кұ°лҠ” м–ём–ҙк°Җ мЎҙмһ¬мқҳ 집мқҙлқјкі н–ҲлҠ”лҚ°, мҡ°лҰ¬лҠ” мӮ¬мҡ©н•ҳлҠ” м–ём–ҙк°Җ мһҗмӢ мқҳ мЎҙмһ¬лҘј л“ңлҹ¬лӮёлӢӨлҠ” кІғмқ„ м•Ңкі мһҲлӢӨ. нҶөмғҒ лӘЁм–ҙлҘј мқөнҳҖк°ҖлҠ” кіјм •, нҳ№мқҖ л°°мҡ°лҠ” кіјм •мқҖ л“Јкё° л§җн•ҳкё° мқҪкё° м“°кё°мқҳ мҲңмқҙлӢӨ. мҷёкөӯм–ҙк°Җ м–ҙл Өмҡҙ мқҙмң лҠ” м Җ мҲңм„ңм—җ л”°лҘҙкё° м–ҙл ө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 ҮлӢӨл©ҙ мҡ°лҰ¬мқҳ лӘЁм–ҙ мӮ¬мҡ©мқҖ м–ҙл– н•ңк°Җ? м•һмқҳ м„ё лӢЁкі„ мҰү л“Јкі л§җн•ҳкі мқҪлҠ” мқјкіј л„Ө лІҲм§ё м“°лҠ” мқј мӮ¬мқҙм—җлҠ” кұҙл„җ мҲҳ м—ҶлҠ” к°•мқҙ мһҲлӢӨ. лҢҖл¶Җ분мқҳ мӮ¬лһҢл“Өм—җкІҢ м“°кё°лҠ” лӮҜм„ кІҪн—ҳмқҙлӢӨ. л§ҢлӮЁмқ„ мң„н•ҙ м№ҙнҶЎм—җ м“°лҠ” кёҖм”ЁлҘј м“ё мӨ„ м•„лҠ” кІғкіј кёҖмқ„ м“°лҠ” мқјмқҖ м „нҳҖ лӢӨлҘё мқјмқҙлӢӨ.
ліҙнҶө мҙҲл“ұн•ҷкөҗ кіјм •мӨ‘м—җ мқјкё°лқјлҠ” нҳ•мӢқмқҳ м“°кё°лҘј л°°мҡ°м§Җл§Ң, к·ё мқјкё°м—җ лҢҖн•ҙ мқҖмң мқҳ мұ…м—җм„ң мқёмҡ©н•ҳмһҗл©ҙ мӣғн”„кІҢлҸ„ мҡ°лҰ¬мқҳ мқјкё°лҠ” мҲҳ м—ҶлҠ” 'мҷңлғҗн•ҳл©ҙ'кіј 'л•Ңл¬ёмқҙлӢӨ'мқҳ м—°мҶҚмқҙм—Ҳмқ„ кІғмқҙлӢӨ. лҚ”кө°лӢӨлӮҳ к·ё мқјкё°лҘј к°ҖлҘҙм№ҳлҠ” м„ мғқлӢҳл“ӨмЎ°м°Ё мқјкё°лҘј м“°м§Җ м•Ҡкі мһҲмқ„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 м–ҙм°Ңліҙл©ҙ мҡ°лҰ¬к°Җ л°°мҡё мҲҳ мһҲм—ҲлҚҳ мң мқјн•ң кёҖм“°кё°лҠ” мқјкё°лқјлҠ” мІ« лІҲм§ё лӢЁкі„м—җм„ң мў…л§җмқ„ л§һмқҙн•ңлӢӨ. мҡ°лҰ¬мқҳ м–ём–ҙлҠ”, мЎҙмһ¬лҠ” м“°кё°к°Җ м—ҶмңјлҜҖлЎң к№Җкҙ‘м„қмқҳ л…ёлһҳмІҳлҹј 'л‘җ л°”нҖҙлЎң к°ҖлҠ” мһҗлҸҷм°Ё'лӮҳ, 'л„Ө л°”нҖҙлЎң к°ҖлҠ” мһҗм „кұ°'к°Җ лҗңлӢӨ.
мҡ°лҰ¬к°Җ мҳЁм „н•ң м–ём–ҙлҘј, мЎҙмһ¬лҘј м°ҫкё° мң„н•ҙ м“°кё°лҘј мӢңмһ‘н•ңлӢӨл©ҙ м–ҙл””м—җм„ң мӢңмһ‘н•ҙм•ј н• к№Ң? мҳҲмқҳ м ҖлӘ…н•ң м„ мғқлӢҳл“Өмқҳ мҲҳм—…кіј мІЁмӮӯ м§ҖлҸ„лҘј нҶөн•ҙ л°°мҡё мҲҳ м—ҶлӢӨл©ҙ, лЁјм Җ "лӮҳлҠ” кёҖм“°кё°лҘј лҸ…н•ҷмңјлЎң л°°мӣ лӢӨ"лқјкі л§җн•ҳл©ҙм„ң, "м“°лҠ” кі нҶөмқҙ нҒ¬л©ҙ м•Ҳ м“ҙлӢӨ. м•Ҳ м“°лҠ” кі нҶөмқҙ лҚ” нҒ° мӮ¬лһҢмқҖ м“ҙлӢӨ"лқјкі мӮ¶ мҶҚмқҳ кёҖм“°кё°лҘј к°ҖлҘҙміҗ мЈјлҠ” мқҖмң мқҳ мұ…л“Өмқ„ 추мІңн•ңлӢӨ.
лӘҮ л…„м „ м ҲнҢҗлҗҳм—ҲлӢӨк°Җ мөңк·ј лӢӨмӢң м¶ңк°„лҗң мқҖмң мһ‘к°Җмқҳ мІ« мұ… 'мҳ¬л“ңкұёмқҳ мӢң집'м—җм„ң м—„л§Ҳм—җ лҢҖн•ҙм„ң л§җн•ҳлҠ” л¶Җ분мқ„ ліҙмһҗ.
"мӮ¶мқҙлқјлҠ” кІғмқҖ к·ёлғҘ мӮҙм•„к°ҖлҠ” м •лҸ„мҳҖлҠ”лҚ°, м—„л§ҲлҘј нҶөн•ҙ мЈҪмқҢмқ„ к°Җк№Ңмқҙм„ң ліҙкі лӮҳлӢҲк№Ң 'мӮ¶'мқҙлқјлҠ” 추мғҒлӘ…мӮ¬к°Җ л§Ңм ём§ҖлҠ” лҠҗлӮҢмқҙм—ҲлӢӨ." мқҙм–ҙм„ң мқҖмң лҠ” к№ҖкІҪмЈјмқҳ мӢңмқҳ мқјл¶ҖмҷҖ л§ҢлӮңлӢӨ. "м–ҙлЁёлӢҲмҷҖ лӮҳлҠ” к°ҷмқҖ н”јлҘј лӮҳлҲ„м–ҙ к°Җ진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ҳ‘к°ҷмқҖ мҡёмқҢмҶҢлҰ¬лҘј к°Җ진 кІғ к°ҷлӢӨкі мғқк°Ғн•ң м Ғмқҙ мһҲлӢӨ."
# көім–ҙ мһҲлҚҳ мғқк°Ғ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лҠ” 'м“°кё°'
'м“°кё°мқҳ л§җл“Ө'м—җм„ңлҠ” мӮ¬лһ‘кіј мқҙлі„мқҳ л§җл“Өмқ„ м“°лҠ” мқјм—җ лҢҖн•ҙ нҸҙ мҳӨмҠӨн„°мқҳ л§җмқ„ мқёмҡ©н•ңлӢӨ. 'л§җмқҙ лӘём—җм„ң нқҳлҹ¬лӮҳмҳӨкі , к·ё л§җл“Өмқ„ мў…мқҙм—җ мғҲкІЁ л„ЈлҠ” кіјм •мқ„ лҠҗлҒјлҠ” кІғмқҙлӢӨ. кёҖм“°кё°лҠ” мҙүк°Ғм Ғмқё л©ҙмқ„ к°–кі мһҲлӢӨ. мңЎмІҙм Ғмқё кІҪн—ҳмқҙлӢӨ. к·ёлҰ¬кі мқҙм–ҙм§ҖлҠ” мқҖмң мқҳ л§җ, "мўӢмқҖ кёҖмқҖ мһҗкё° лӘёмқ„ лҡ«кі лӮҳмҳӨкі лӮЁмқҳ лӘём—җ мҠӨлҜјлӢӨ."
мқҖмң мқҳ м“°кё°лҠ” нқ¬л…ём• лқҪмқҳ мӮ¶мқҳ мқҙм•јкё°м—җм„ң мӢңмһ‘н•ҙм„ң, м •м ңлҗң мӢңмқёмқҳ м–ём–ҙл“Өкіј л§ҢлӮҳ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Ұ¬кі мқҖмң мқҳ мғҲлЎңмҡҙ м“°кё°лҠ” л¬ёмһҘл“ӨлЎң мӢңмһ‘н•ҙм„ң мһҗмӢ мқҳ мӮ¶мқҳ мқҙм•јкё°мҷҖ л§ҢлӮңлӢӨ. мқҖмң к°Җ мғқк°Ғн•ҳлҠ” м“°кё°лҠ” мӮ¶кіј м—°кІ°лҗң мқҙм•јкё°л“Өмқ„ нғҖмқёмқҳ мӢңмҷҖ л¬ёмһҘкіј л§ҢлӮҳкІҢ н•ҳлҠ” кІғмқҙлӢӨ. мқјмғҒкіј л§ҢлӮҳлҠ” мӢңл“Өмқҙ кІҪмқҙлЎӯкі , л¬ёмһҘл“Өкіј л§ҢлӮҳлҠ” мқјмғҒл“Өмқҙ л№ӣмқ„ л°ңн•ңлӢӨ.
мқҖмң лҠ” к·ё лӣ°м–ҙлӮң кёҖм“°кё°л“Ө мқҙнӣ„м—җ лӢӨмӢң л“Јкё°мқҳ мӮ¶мңјлЎң л“Өм–ҙк°”лӢӨ. нқЎмӮ¬ м–ём–ҙлҘј лӢӨмӢң л°°мҡ°л“Ҝмқҙ л§җмқҙлӢӨ. лӢӨмӢң л“Јкё° мӢңмһ‘н•ҳмһҗ к·ёмқҳ л§җмқҙ лӢ¬лқјмЎҢлӢӨ. к·ёлҰ¬кі лӢӨмӢң м„ёмғҒмқ„ мқҪкё° мӢңмһ‘н•ҳкі , лӢӨмӢң м“ё мҲҳ мһҲкІҢ лҗҳм—ҲлӢӨ. мқҖмң лҠ” мһҗмӢ мқҳ м“°кё°м—җм„ң мӢңмһ‘н•ҙм„ң, нғҖмқёл“Өмқҳ мӮ¶мқ„ мқҪм–ҙлӮёлӢӨ. кі нҶөлӢ№н•ң мӮ¬лһҢл“Өмқҳ мқҙм•јкё°лҘј л“Јкі к·ёл“Өмқҳ л§җмқ„ лҢҖмӢ м“°лҠ” мқјмқ„ н•ңлӢӨ. к·ёмқҳ мөңк·ј мһ‘мқҖ мҡ°лҰ¬ мӮ¬нҡҢмқҳ нҺёкІ¬кіј нғҖмқём—җ лҢҖн•ң л¬ҙкҙҖмӢ¬мқ„ л„ҳм–ҙм„ңлҸ„лЎқ мқҙлҒ„лҠ” 'м•Ңм§Җ лӘ»н•ҳлҠ” м•„мқҙмқҳ мЈҪмқҢ'мқҙлӢӨ.
мҲҳм „ мҶҗнғқмқҖ "мһ‘к°Җк°Җ н•ҳлҠ” мқјмқҖ мӮ¬лһҢл“Ө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кі , мӮ¬лһҢл“Өмқ„ нқ”л“Өм–ҙ лҶ“лҠ” мқјмһ…лӢҲлӢӨ"лқјкі н–ҲлӢӨ. л§ӨмЈјмқј мқјм •мқҳ кёҖмқ„ л°ңн‘ңн•ҳкі мһҲлҠ” лӘ©нҡҢмһҗл“Өмқҳ л§җл“Өмқҙ лӘЁнҳён•ң кІғмқ„ 분лӘ…н•ҳкІҢ н•ҳкі , көім–ҙ мһҲлҚҳ мғқк°Ғл“Ө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лҠ” м“°кё°к°Җ лҗҳм—Ҳмңјл©ҙ мўӢкІ лӢӨ.
мөңм•„лЎ лӘ©мӮ¬ / мҳҘмҲҳм„ңмһ¬
н•ҳмқҙлҚ°кұ°лҠ” м–ём–ҙк°Җ мЎҙмһ¬мқҳ 집мқҙлқјкі н–ҲлҠ”лҚ°, мҡ°лҰ¬лҠ” мӮ¬мҡ©н•ҳлҠ” м–ём–ҙк°Җ мһҗмӢ мқҳ мЎҙмһ¬лҘј л“ңлҹ¬лӮёлӢӨлҠ” кІғмқ„ м•Ңкі мһҲлӢӨ. нҶөмғҒ лӘЁм–ҙлҘј мқөнҳҖк°ҖлҠ” кіјм •, нҳ№мқҖ л°°мҡ°лҠ” кіјм •мқҖ л“Јкё° л§җн•ҳкё° мқҪкё° м“°кё°мқҳ мҲңмқҙлӢӨ. мҷёкөӯм–ҙк°Җ м–ҙл Өмҡҙ мқҙмң лҠ” м Җ мҲңм„ңм—җ л”°лҘҙкё° м–ҙл ө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 ҮлӢӨл©ҙ мҡ°лҰ¬мқҳ лӘЁм–ҙ мӮ¬мҡ©мқҖ м–ҙл– н•ңк°Җ? м•һмқҳ м„ё лӢЁкі„ мҰү л“Јкі л§җн•ҳкі мқҪлҠ” мқјкіј л„Ө лІҲм§ё м“°лҠ” мқј мӮ¬мқҙм—җлҠ” кұҙл„җ мҲҳ м—ҶлҠ” к°•мқҙ мһҲлӢӨ. лҢҖл¶Җ분мқҳ мӮ¬лһҢл“Өм—җкІҢ м“°кё°лҠ” лӮҜм„ кІҪн—ҳмқҙлӢӨ. л§ҢлӮЁмқ„ мң„н•ҙ м№ҙнҶЎм—җ м“°лҠ” кёҖм”ЁлҘј м“ё мӨ„ м•„лҠ” кІғкіј кёҖмқ„ м“°лҠ” мқјмқҖ м „нҳҖ лӢӨлҘё мқјмқҙлӢӨ.
ліҙнҶө мҙҲл“ұн•ҷкөҗ кіјм •мӨ‘м—җ мқјкё°лқјлҠ” нҳ•мӢқмқҳ м“°кё°лҘј л°°мҡ°м§Җл§Ң, к·ё мқјкё°м—җ лҢҖн•ҙ мқҖмң мқҳ мұ…м—җм„ң мқёмҡ©н•ҳмһҗл©ҙ мӣғн”„кІҢлҸ„ мҡ°лҰ¬мқҳ мқјкё°лҠ” мҲҳ м—ҶлҠ” 'мҷңлғҗн•ҳл©ҙ'кіј 'л•Ңл¬ёмқҙлӢӨ'мқҳ м—°мҶҚмқҙм—Ҳмқ„ кІғмқҙлӢӨ. лҚ”кө°лӢӨлӮҳ к·ё мқјкё°лҘј к°ҖлҘҙм№ҳлҠ” м„ мғқлӢҳл“ӨмЎ°м°Ё мқјкё°лҘј м“°м§Җ м•Ҡкі мһҲмқ„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 м–ҙм°Ңліҙл©ҙ мҡ°лҰ¬к°Җ л°°мҡё мҲҳ мһҲм—ҲлҚҳ мң мқјн•ң кёҖм“°кё°лҠ” мқјкё°лқјлҠ” мІ« лІҲм§ё лӢЁкі„м—җм„ң мў…л§җмқ„ л§һмқҙн•ңлӢӨ. мҡ°лҰ¬мқҳ м–ём–ҙлҠ”, мЎҙмһ¬лҠ” м“°кё°к°Җ м—ҶмңјлҜҖлЎң к№Җкҙ‘м„қмқҳ л…ёлһҳмІҳлҹј 'л‘җ л°”нҖҙлЎң к°ҖлҠ” мһҗлҸҷм°Ё'лӮҳ, 'л„Ө л°”нҖҙлЎң к°ҖлҠ” мһҗм „кұ°'к°Җ лҗңлӢӨ.
мҡ°лҰ¬к°Җ мҳЁм „н•ң м–ём–ҙлҘј, мЎҙмһ¬лҘј м°ҫкё° мң„н•ҙ м“°кё°лҘј мӢңмһ‘н•ңлӢӨл©ҙ м–ҙл””м—җм„ң мӢңмһ‘н•ҙм•ј н• к№Ң? мҳҲмқҳ м ҖлӘ…н•ң м„ мғқлӢҳл“Өмқҳ мҲҳм—…кіј мІЁмӮӯ м§ҖлҸ„лҘј нҶөн•ҙ л°°мҡё мҲҳ м—ҶлӢӨл©ҙ, лЁјм Җ "лӮҳлҠ” кёҖм“°кё°лҘј лҸ…н•ҷмңјлЎң л°°мӣ лӢӨ"лқјкі л§җн•ҳл©ҙм„ң, "м“°лҠ” кі нҶөмқҙ нҒ¬л©ҙ м•Ҳ м“ҙлӢӨ. м•Ҳ м“°лҠ” кі нҶөмқҙ лҚ” нҒ° мӮ¬лһҢмқҖ м“ҙлӢӨ"лқјкі мӮ¶ мҶҚмқҳ кёҖм“°кё°лҘј к°ҖлҘҙміҗ мЈјлҠ” мқҖмң мқҳ мұ…л“Өмқ„ 추мІңн•ңлӢӨ.
лӘҮ л…„м „ м ҲнҢҗлҗҳм—ҲлӢӨк°Җ мөңк·ј лӢӨмӢң м¶ңк°„лҗң мқҖмң мһ‘к°Җмқҳ мІ« мұ… 'мҳ¬л“ңкұёмқҳ мӢң집'м—җм„ң м—„л§Ҳм—җ лҢҖн•ҙм„ң л§җн•ҳлҠ” л¶Җ분мқ„ ліҙмһҗ.
"мӮ¶мқҙлқјлҠ” кІғмқҖ к·ёлғҘ мӮҙм•„к°ҖлҠ” м •лҸ„мҳҖлҠ”лҚ°, м—„л§ҲлҘј нҶөн•ҙ мЈҪмқҢмқ„ к°Җк№Ңмқҙм„ң ліҙкі лӮҳлӢҲк№Ң 'мӮ¶'мқҙлқјлҠ” 추мғҒлӘ…мӮ¬к°Җ л§Ңм ём§ҖлҠ” лҠҗлӮҢмқҙм—ҲлӢӨ." мқҙм–ҙм„ң мқҖмң лҠ” к№ҖкІҪмЈјмқҳ мӢңмқҳ мқјл¶ҖмҷҖ л§ҢлӮңлӢӨ. "м–ҙлЁёлӢҲмҷҖ лӮҳлҠ” к°ҷмқҖ н”јлҘј лӮҳлҲ„м–ҙ к°Җ진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ҳ‘к°ҷмқҖ мҡёмқҢмҶҢлҰ¬лҘј к°Җ진 кІғ к°ҷлӢӨкі мғқк°Ғн•ң м Ғмқҙ мһҲлӢӨ."
# көім–ҙ мһҲлҚҳ мғқк°Ғ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лҠ” 'м“°кё°'
'м“°кё°мқҳ л§җл“Ө'м—җм„ңлҠ” мӮ¬лһ‘кіј мқҙлі„мқҳ л§җл“Өмқ„ м“°лҠ” мқјм—җ лҢҖн•ҙ нҸҙ мҳӨмҠӨн„°мқҳ л§җмқ„ мқёмҡ©н•ңлӢӨ. 'л§җмқҙ лӘём—җм„ң нқҳлҹ¬лӮҳмҳӨкі , к·ё л§җл“Өмқ„ мў…мқҙм—җ мғҲкІЁ л„ЈлҠ” кіјм •мқ„ лҠҗлҒјлҠ” кІғмқҙлӢӨ. кёҖм“°кё°лҠ” мҙүк°Ғм Ғмқё л©ҙмқ„ к°–кі мһҲлӢӨ. мңЎмІҙм Ғмқё кІҪн—ҳмқҙлӢӨ. к·ёлҰ¬кі мқҙм–ҙм§ҖлҠ” мқҖмң мқҳ л§җ, "мўӢмқҖ кёҖмқҖ мһҗкё° лӘёмқ„ лҡ«кі лӮҳмҳӨкі лӮЁмқҳ лӘём—җ мҠӨлҜјлӢӨ."
мқҖмң мқҳ м“°кё°лҠ” нқ¬л…ём• лқҪмқҳ мӮ¶мқҳ мқҙм•јкё°м—җм„ң мӢңмһ‘н•ҙм„ң, м •м ңлҗң мӢңмқёмқҳ м–ём–ҙл“Өкіј л§ҢлӮҳ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Ұ¬кі мқҖмң мқҳ мғҲлЎңмҡҙ м“°кё°лҠ” л¬ёмһҘл“ӨлЎң мӢңмһ‘н•ҙм„ң мһҗмӢ мқҳ мӮ¶мқҳ мқҙм•јкё°мҷҖ л§ҢлӮңлӢӨ. мқҖмң к°Җ мғқк°Ғн•ҳлҠ” м“°кё°лҠ” мӮ¶кіј м—°кІ°лҗң мқҙм•јкё°л“Өмқ„ нғҖмқёмқҳ мӢңмҷҖ л¬ёмһҘкіј л§ҢлӮҳкІҢ н•ҳлҠ” кІғмқҙлӢӨ. мқјмғҒкіј л§ҢлӮҳлҠ” мӢңл“Өмқҙ кІҪмқҙлЎӯкі , л¬ёмһҘл“Өкіј л§ҢлӮҳлҠ” мқјмғҒл“Өмқҙ л№ӣмқ„ л°ңн•ңлӢӨ.
мқҖмң лҠ” к·ё лӣ°м–ҙлӮң кёҖм“°кё°л“Ө мқҙнӣ„м—җ лӢӨмӢң л“Јкё°мқҳ мӮ¶мңјлЎң л“Өм–ҙк°”лӢӨ. нқЎмӮ¬ м–ём–ҙлҘј лӢӨмӢң л°°мҡ°л“Ҝмқҙ л§җмқҙлӢӨ. лӢӨмӢң л“Јкё° мӢңмһ‘н•ҳмһҗ к·ёмқҳ л§җмқҙ лӢ¬лқјмЎҢлӢӨ. к·ёлҰ¬кі лӢӨмӢң м„ёмғҒмқ„ мқҪкё° мӢңмһ‘н•ҳкі , лӢӨмӢң м“ё мҲҳ мһҲкІҢ лҗҳм—ҲлӢӨ. мқҖмң лҠ” мһҗмӢ мқҳ м“°кё°м—җм„ң мӢңмһ‘н•ҙм„ң, нғҖмқёл“Өмқҳ мӮ¶мқ„ мқҪм–ҙлӮёлӢӨ. кі нҶөлӢ№н•ң мӮ¬лһҢл“Өмқҳ мқҙм•јкё°лҘј л“Јкі к·ёл“Өмқҳ л§җмқ„ лҢҖмӢ м“°лҠ” мқјмқ„ н•ңлӢӨ. к·ёмқҳ мөңк·ј мһ‘мқҖ мҡ°лҰ¬ мӮ¬нҡҢмқҳ нҺёкІ¬кіј нғҖмқём—җ лҢҖн•ң л¬ҙкҙҖмӢ¬мқ„ л„ҳм–ҙм„ңлҸ„лЎқ мқҙлҒ„лҠ” 'м•Ңм§Җ лӘ»н•ҳлҠ” м•„мқҙмқҳ мЈҪмқҢ'мқҙлӢӨ.
мҲҳм „ мҶҗнғқмқҖ "мһ‘к°Җк°Җ н•ҳлҠ” мқјмқҖ мӮ¬лһҢл“Ө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кі , мӮ¬лһҢл“Өмқ„ нқ”л“Өм–ҙ лҶ“лҠ” мқјмһ…лӢҲлӢӨ"лқјкі н–ҲлӢӨ. л§ӨмЈјмқј мқјм •мқҳ кёҖмқ„ л°ңн‘ңн•ҳкі мһҲлҠ” лӘ©нҡҢмһҗл“Өмқҳ л§җл“Өмқҙ лӘЁнҳён•ң кІғмқ„ 분лӘ…н•ҳкІҢ н•ҳкі , көім–ҙ мһҲлҚҳ мғқк°Ғл“Өмқ„ мһҗмң лЎӯкІҢ н•ҳлҠ” м“°кё°к°Җ лҗҳм—Ҳмңјл©ҙ мўӢкІ лӢӨ.
мөңм•„лЎ лӘ©мӮ¬ / мҳҘмҲҳм„ңмһ¬
|